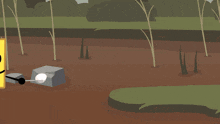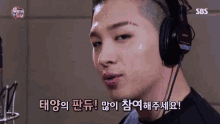" 아파요. " 오현민이다. 비에 흠뻑 젖어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하곤, 결국 들른 곳이 여긴가보다. 한때 제집처럼 드나들던 장동민의 집이다. 문을 열던 동작 그대로 돌이 된 듯 했던 장동민의 눈빛이 엷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 뿐, 둘 사이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는다. 현민은 제 발치를 내려다보다가, 괜히 위를 한 번 쳐다봤다가, 다시 동민을 바라본다. " 들어가도 돼요? " 장동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적막을 채우는 빗소리는 어딘가 음울하고, 무겁다. 이윽고 움직일 것 같지 않던 그의 고개가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인다. 현민은 조심스레 동민의 뒤를 따라 들어간다. 장동민은 곱게 개어진 옷과 수건을 건넸다. 씻고 와. 현민은 건네받은 옷을 물끄러미 보다가 웃음기어린 말투로, " 이거, 제 옷... 아직 있네요. " 새삼스러운 듯 그렇게 말한다. 동민이 대꾸하지 않자, 오현민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욕실로 들어간다. 물소리를 들으며 장동민은, 후회했다. 어쩌자고 저 녀석을 집에 들였는지 모를 일이었다. 둘은 끝난 사이였으니까. 그에게 아직 정리하지 못한 그의 물건을, 그에 대한 감정을 보이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새 씻고 나온 현민은 쇼파에 앉아있는 동민을 보고는 쪼르르 달려와 냉큼 그 옆에 주저앉았다. 정적. 빗소리가 코끼리 발재간 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린다. " 자고 가도 돼요? " 장동민의 눈썹이 순간 일그러졌다. 와장창창, 쨍그랑. 정적을 깨기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다. 현민은 눈치를 살피다가, 제 이마에 손을 갖다대며 너스레를 떤다. 아,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콜록. 기침도 나고. 비를 너무 많이 맞았나, 현기증이... " 뭐하냐. " " ... " " 끝났잖아, 우리. " 덤덤하면서도, 가시돋힌 말이었다. 선을 넘으면 찔릴듯한. 그리고 오현민은, 찔려도 상관없다는 듯 불쑥 들어왔다. " 보고 싶었어요. 많이요. " " ... " " 형도 저 보고 싶었잖아요. " 동민은, 비로소 현민을 마주한다. 그러다 자신이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충동적으로 현민에게 손을 뻗었다. 이마에, 뺨에, 그리고 목에. 장동민은 현민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부여잡는다. " -형. " 목덜미를 부여잡은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간다. 꺾으려는 듯, 두 손으로 힘껏 짓누른다. 동민을 올려다보는 현민의 눈이 커진다. " ...뭐, 하는... " " 너 죽었잖아. " 그랬다. 1년 전 그 날, 너는. " 내가 죽였잖아, 너. " 둘 곳이 없습니다. 너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를 죽일 나에게 웃어주었나.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또, " 내가 다시 만든 거잖아. " 현민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꺽, 꺽.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몸을 비튼다. 온 힘을 다해 찍어누르는 동민의 팔을 떼내려 안간힘 써보지만 역부족이다. 눈동자가 사납게 뒤집힌다. " 사라져. " 신기루는 사라졌다. 장동민은 가쁜 숨을 내쉬며 쇼파에 기댄다. 그러다, 두 손에 얼굴을 파묻는다. 너를 또 죽였구나, 내가. 미치도록 슬픈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는다. 잿빛 하늘은 그를 대신해 우는 듯 더 많은 비를 쏟아낸다. 쏴아아. 장동민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자 빗방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 형. 사라지지 않아요. 형이 절 죽인 그 날부터, 전 형 안에 살게 된 거죠. 함께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장동민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죽을 때까지. 기어코, 네가 나를 죽일 때까지. 비가 온다.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그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비가.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