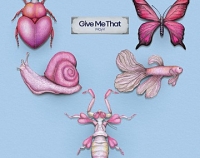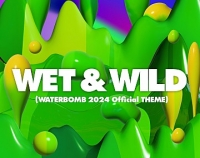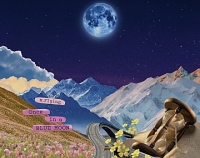P{margin-top:2px;margin-bottom:2px;}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던 도쿠가와 막부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일파를 밀어내조선과 국교를 정상화한후 조선 통신사를 엄청난 국고를 소비해가며 극진히 접대하고 이를막부의 위신을 세우는데 이용하지만 100년이 지난 18세기 초가 되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 전형적인 예를 6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노부(徳川家宣, 1662~1712)의 장군 습직을 축하하기 위한 1711년의 辛卯사절을 대하는 일본측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바쿠후(幕府)의 실력자로서 대조선 외교업무도 담당하고 있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대조선 외교의 의례를 전면적으로 바꿨는데, 여기에는 조선의 문화적 우월주의에 대한 하쿠세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조선이 일본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침략에 대한 원한, 특히 임진왜란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언제나 일본에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도저히 일본에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자 文으로 일본에 복수하려고 생각하여, 일본을 倭賊이니 蛮酋니 하고 부르며 문화적으로 야만시하고 있다고 했다1)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18세기에 조선의 지식인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여기서는 申維翰(1681~1752)의 눈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그가 당시 일본을 직접 체험한 얼마 되지 않는 조선 지식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일본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일본을 판단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1684~1751)의 8대 쇼군 습직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인 1719년의 己亥사절단의 제술관으로 방일하여 1년여에 걸쳐 일본을 여행한 다음 ꡔ海游録ꡕ이라는 일본여행기를 썼는데, 이 책은 치밀한 관찰과 유려한 문장으로 인해 일본 기행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둘째는 그가 당시의 조선 정부를 대표하는 사절단의 일원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그의 판단이 단순히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2) 따라서 신유한의 일본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일본관을 살펴본다는 의미를 넘어 당시 조선 정부의 입장과, 더 나아가서는 당시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던 보편적인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부국강병의 나라, 일본
1) 빼어난 산천경개
원래 제술관이란 사절단의 典礼와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직위는 비록 三使 다음이었지만 그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다. 왕명을 받들어 자국의 문화를 선양해야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누구나 꺼려하는 직책이었고, 신유한도 어머니가 늙고 집이 가난하며 재주가 둔하고 겁이 많아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양했다. 그렇지만 왕명이 지엄하여 결국 승낙하게 되자, “바다 밖의 오랑캐 땅(Ⅰ-379)”3)으로 가 그들을 회유시켜 조정의 위엄을 떨치겠다고 각오를 새로이 한다.
이처럼 왕명을 받은 사절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부산을 출발한 신유한이 일본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산천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는 사절단이 가장 먼저 밟게되는 일본땅인 쓰시마(対馬)의 고후나고시(小船越, 해유록의 船頭港)4) 주변 경치를 보고, 이것이 만약 중국 장안 근처에 있었다면 장안의 귀공자들이 너도나도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글을 지어 천하의 명소가 되었을 것인데 불행히도 이렇게 외딴 곳에 있어 이무기의 소굴이 되었다고 한탄하며, 그렇지만 다행히도 임금의 성덕으로 자기가 이 절경을 보게 되었으니 산수가 비로소 사람을 제대로 만난 것이라며 호기를 부렸다. 그리고는 당나라의 柳宗元이 「永州八記」에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 鈷鉧潭이나 小邱도 이곳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며 그 빼어난 경관에 감탄했다. 또한 쓰시마에서 이키(壱岐)를 거쳐 시모노세키(下関, 신유한의 赤間関)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아이노시마(相島, 해유록의 藍島)에서는 배를 탄 이후 처음으로 보는 신선경이라 감탄하면서, 동행하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에게 조선 관동지방 최고의 명승지인 삼일포보다 이곳 경치가 더 뛰어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도모노우라(革 丙 浦, 해유록의 韜浦)를 보고는 “해안산(海岸山)이 높이 솟아 바다에 임하여 3면의 모든 산과 더불어 서로 당겨서 만(湾)이 되었고, 산밑이 바다에 침식된 곳에는 돌을 깎아 제방을 만들었는데 평평하고 정돈되어서 끊어놓은 것과 같았다. 소나무․삼목(杉木)․귤․유자 등 온갖 나무의 숲이 양쪽을 끼고 푸른 것이 사방에 둘러 있으면서 그림자가 물 속에 거꾸로 비추고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이르러서는 제일의 경치라고 감탄한다(Ⅰ-466)”고 적고 있다.
사실 도모노우라는 일본 제일의 해상국립공원인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에서도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곳으로 조선사절에게도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1655년 乙未사절의 종사관이었던 南龍翼이 “勝地를 찾으매 徐巿이 왔던 것을 알겠고/너른 것을 비교하면 마땅히 동정호와 함께 논하리(探勝定知徐巿到/較雄当与洞庭論) ”라며 이곳 경치의 아름다움을 동정호에 비유한 시를 지은 이래, 이곳은 사절단이 반드시 거치는 코스가 되었다. 신유한 일행의 바로 직전 사절이었던 辛卯사절도 이곳에 들러 그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으며, 종사관인 李邦彦은 사절단의 숙소였던 후쿠젠사(福禅寺) 対潮楼에 ‘日東第一形勝’이란 예서 편액을 써서 선물하기도 했다. 그리고 1748년 戊辰사절의 정사였던 洪啓禧의 아들 洪景海도 이 절에 대조루란 현판을 써 주었는데, 이 편액과 현판은 지금도 후쿠젠사의 대조루에 걸려있다고 한다5) 신유한도 또한 「도모노우라의 경치를 그리는 6언 절구」를 8수 지어 그 절경을 찬미했는데, 그 중에는 “높디높은 백 척의 겹 언덕이요/역력히 일천 숲 속에 맑은 시내로다/어찌하면 그림 잘 그리는 묘한 솜씨 얻어서/오랑캐 개(浦)의 그윽한 경치 묘사할꼬?(高高百尺畳堤/歷歷千林浄谿/安得龍眠妙手/写来蛮浦幽棲)(Ⅰ-467~8)”와 같이 도모노우라의 절경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자기의 재주를 아쉬워하는 시도 들어 있다.
이처럼 일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쓰시마에서부터 수려한 경관에 취한 신유한은 ꡔ해유록ꡕ의 곳곳에서 일본 산수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상의 절승한 땅이 그릇되어 푸른 수건 쓴 아이와 이빨에 검정물 들인 계집이 짝지어 앉은 자리가 되는 데에 짓밟히고 말았으니, 이것이 조물주(造物主)의 무슨 뜻인가?(Ⅰ-452~3)” 라며,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이 일본에 있는 것에 대해 조물주를 원망하기도 했다.
2) 경제적 번영
일본 자연의 수려함에 감탄하며, 또 그것이 일본에 있는 것을 아쉬워하던 신유한은 일본의 물질적 풍요에도 놀랐다.
이에 이르자 여러 왜인이 배를 가지고 왔는데 배의 제작이 찬란하고 교묘하였다. 배 위 에는 층루(層楼)를 세웠으되 나무로 기와의 형상을 조각(雕刻)하여 푸른 칠을 하였고, 지 붕 이하는 전체가 검은 색인데 미끄럽고 밝아서 사람의 얼굴을 비쳐볼 수 있을 정도였고, 추녀․난간․기둥은 황금을 입혔고, 창과 문도 또한 그와 같아서 사람이 앉고 누우면 의복에 금빛이 빛났다. 붉은 비단으로 장막을 만들어 사면을 두르고 장막의 귀퉁이마다 큰 붉은 유소(流蘇, 기나 교자(轎子) 등에 다는 술)를 달아서 길이가 45척이나 되는데 봉황의 꼬리를 만들었다. 난간 위에는 붉은 발(簾)을 설치하였는데 가늘기가 실과 같았고, 그 빛깔이 찬란하였으며 아래로 강물에서 한 자쯤 위에까지 드리웠다. 배의 꼬리에는 색이 아롱진 끈이 한 발 남짓한 데다 황금방울 두 개를 달아서 그 소리로서 배의 키를 돌리는 완급을 삼았다. 선복(船腹)이 물에 잠기는 부분에도 또한 금을 칠해서 금과 물결이 서로 그림자를 지어 일렁거렸다(Ⅰ-474).
사신들이 오사카(大坂)에 들어가려면 요도(淀, 신유한의 浪華)강의 지류인 시리나시(尻無)강 하구 앞 바다에서 바닥이 평평한 일본의 平底船으로 갈아타야 한다. 오사카까지 연결된 요도강은 수심이 얕아 사신들이 타고 온 배로는 거슬러 올라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절단이 오사카 앞 바다에 도착하면 일본 배들이 사절단을 태우러 마중 나오는데, 위에 인용한 것이 바로 마중 나온 일본 배를 묘사한 부분이다. 배의 호화로운 모습에 놀란 정사 홍치중이 이 배가 만약 쇼우군(将軍, 신유한의 関白)의 배라면 감히 탈 수 없다고 하자, 쓰시마 도주가 당황하여 통신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배라고 하며 승선하기를 권한다. 이에 사신들이 배에 오르고 배는 요도강을 거슬러 오르는데, 강 양쪽에 늘어선 집들을 보고는 그 화려함과 정결함에 다시 한 번 놀란다. 뿐만 아니라 오사카에 도착하여 사신들이 묵을 미도스지(御堂筋)에 있는 니시혼간사(西本願寺)를 향해 가면서 길 양쪽에 있는 집들을 보고는 “길 양쪽의 장랑(長廊)이 층계집 아닌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백화(百貨)의 점포였다. 구경하는 사람이 (길을) 가득 메웠고 화려함이 강 언덕을 볼 때마다 배나 눈이 부셨다. 이에 이르러 정신이 또 현란하여 몇 거리와 시가를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Ⅰ-478)”고 하며, 오사카의 화려한 모습에 넋을 잃었다6)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말 그대로 일본의 중심이 된 오사카는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였다. 문화의 중심이 가미가타(上方)에서 에도(江戸)로 이동하는 것은 교호(享保, 1716~1735)년간이지만, 에도 문화가 꽃을 피우는 것은 분카․분세이(文化․文政, 1804~1829)년간이므로, 신유한이 오사카를 방문한 1719년에는 아직 교(京)와 오사카가 일본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을 때였다. 신유한도 오사카에 온갖 서적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천하의 장관이라 했으며, 쓰시마에서 필담․창화한 시편이 귀로의 오사카에서 이미 출판된 것을 보고는 그 신속함에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당시 사무라이 계급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견직물이나 도검류를 비롯한 금속제품들도 가미가타에서 생산된 것을 최고급으로 치고 있었다. 가미가타에서 온 물건이란 뜻의 ‘구다리모노(下り物)’란 말이 ‘고도의 기술로 만든 진짜나 고급품’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가미가타에서 오지 않은 물건이란 뜻의 ‘구다라누모노(下らぬ物)’가 ‘조악하고 싼 물건’이란 뜻으로 쓰이게 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7) 이처럼 신유한이 방문한 오사카는 그 때까지도 ‘덴카노 다이도코로(天下の台所)’란 말처럼 전국의 물류를 관장하는 일본 제일의 항구도시로서 그 경제적 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실질적 수도였던 에도의 경우는 더욱 화려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에도 바쿠후를 창설한 이래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온 에도는 17세기 후반에 인구가 이미 80만을 넘어섰고, 18세기 전반인 1733년에는 100만을 넘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전하였다8) 18세기 후반인 정조 말년의 한양 인구가 20만 내외9)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당시 에도가 얼마나 큰 도시였던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721년 일본이 인구 조사를 했을때 인구가 3100만명에 달했음. 당시 조선은 1200만 안팎으로 추정됨)게다가 그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만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라이였으니, 에도는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온갖 물산들이 소비되는 거대한 소비도시였다. 일례를 들면 1801년 한 해 동안 에도에서 소비된 청주가 4말들이 통으로 90만 통 이상이나 되었다고 한다10) 4말들이 통이란 지금도 국회의원의 당선을 축하할 때 사용하는 대형의 통을 가리키는데, 한 통에 72리터니까 이것을 리터로 환산하면, 무려 64억 8천만 리터나 된다. 당시 에도인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알 수 있는 한편 에도가 얼마나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도시였는지도 알게 해 준다.
신유한도 에도성으로 들어가는 연도의 풍경을 보고는 “길옆에 있는 장랑(長廊)은 모두 상점이었다. 시(市)에는 정(町)이 있고 정에는 문이 있고 거리는 사면으로 통하여 편편하고 곧기가 활줄과 같았다. 분칠한 다락과 아로새긴 담장은 3층과 2층이 되었고, 서로 연한 지붕은 비단을 짜놓은 것 같았다. 구경하는 남녀가 거리를 메웠는데 수놓은 듯한 집들의 마루와 창을 우러러보매, 여러 사람의 눈이 빽빽하여 한 치의 빈틈도 없고 옷자락에는 꽃이 넘치고 주렴 장막은 해에 빛남(Ⅰ-522)”이 오사카보다 3배나 더하다고 했다. 그리고 나가사키(長崎)나 오사카 등 바쿠후의 직할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인해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창고가 가득 찼다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도시였다. 신유한이 바라본 일본은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곳이었다.
3) 강력한 군사력
이처럼 일본의 경제적 번영에 놀란 신유한이 이번에는 일본군의 용맹함을 보고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쓰시마의 이즈하라(厳原, 해유록의 府中)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사신 일행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배를 나누어 타고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간 일이 있었다. 하루 종일 즐겁게 놀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올 때 우연히 신유한이 어느 배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냐고 묻자 배들이 서로 경쟁을 하여 눈 깜빡할 사이에 항구에 도착했다. 이에 조선 사절들이 천천히 구경하면서 돌아오고 싶었는데 뱃사공들이 서둘러 좋은 놀이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고 웃으며 말하자, 일본인 통역이 그들이 본래 배를 빨리 모는 것을 재주로 삼는데 어느 배가 제일 빠르냐는 말을 듣자 서로 경쟁심이 생겨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렇지만 신유한은 “일본 풍속은 대개 남 이기기를 힘써 이기지 못하면 죽엄이 있을 뿐이다. 우연히 물은 것도 오히려 이러하였거늘, 하물며 큰 군함을 가지고 성낸 이무기나 달리는 고래가 되는 것이겠는가? 노량 싸움에서 우리 군사가 한 번 이긴 것은 요행한 일(Ⅰ-419)”이라며, 일본 수군의 용맹함에 놀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승리한 것도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쓰시마에서 이키의 가쓰모토(勝本, 해유록의 風本)까지 반나절만에 도착한 것을 보고는 “대마도에서 여기까지가 4백 80리로서 부산에서 좌포(佐浦)까지의 거리와 같은데 4시간을 소비하는데 불과하였으니, 생각하면 아슬아슬(Ⅰ-424)”하다고 하여, 일본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용맹한 일본군이 반나절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존재하는데도 조선 수군의 노 젓는 소리는 느릿느릿하여 도무지 용맹을 자랑하려는 뜻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 통사도 조선 사람들의 노 젖는 소리가 왜 이렇게 느리냐며 비웃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문견잡록」에서 일본의 제도 중 군제가 가장 精強하다고 쓰고 있다. 각 지역의 다이묘(大名, 해유록의 太守)가 모두 무관인데다 세금을 전부 군사 양성에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백성들이 모두 군인이 되려 하고, 또 한 번 비겁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배척을 당하게 되므로, 적병을 보면 등불에 달려드는 불나방같이 덤벼드니 비록 장수가 용렬해도 그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군이 이처럼 용감한 것은 주군에 대한 의리를 지키거나 천성이 용감해서가 아니고, 단지 먹고살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라 하여 대의의 그늘에 감추어져 있는 무가사회의 심층심리를 지적11)하는 한편으로, 그렇지만 바로 그 때문에 유사시에 적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신유한은 일본군의 용맹함을 목격하고 조선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움을 걱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일은 없을 것이라 했다. 다음의 인용을 보기로 하자.
그들이 가강(家康) 이후로 국토가 완전하고 군사가 정강(精強)하여 국중에 변란이 없어 인구의 많음과 국고의 풍부함이 근일보다 더 융성한 적이 없으므로 비록 젖내나는 작은아이라도 태연히 높은 지위에 있어 높고 화려한 궁궐과 비단 장막, 좋은 음식의 안일함을 대대로 전하여 끊이지 아니하여 그 마음이 안락한 생활에 익어서 혹 사변이 있을 것만 두려워하는데, 무슨 다른 계책을 도모하랴? 나로서 추측하건대, 인간에 액운이 닥쳐서 수길․청정과 같은 적이 다시 그 땅에 나지 아니한다면 우리 국가의 변방의 걱정은 만(万)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Ⅱ-102).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서 조선정부는 ‘경계하면서 사귄다’는 외교방침을 정했다12) 신유한이 일본 수군의 용맹함을 보고 바로 임진왜란의 기억을 떠올린 것처럼, 7년간에 걸쳐 일본과 전쟁을 치른 조선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절단의 임무에는 일본이 다시 침략할 의사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사절단의 보고서에는 반드시 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신유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는 경제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본의 침략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경제 또한 사상 유래 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락함에 젖어 조선을 다시 침략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당시 대다수의 조선 지식인들이 일본의 침략 여부를 학문의 발달로 가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수려한 자연과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에 놀란 신유한은 이 밖에도 일본의 장점이라 생각되는 것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리가 매우 청결하여 여름에도 파리나 모기가 드물고, 집을 지을 때의 척도가 정확하여 초가집도 4~50년은 유지되며, 서적의 간행과 수입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장점을 관찰하고 그것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일본이 이처럼 부국강병의 장구한 낙을 누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그것은 왜일까?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알 수 없는 나라, 일본
1) 세습제의 문제
궁중에서 연회할 때에, 좌우의 청벽(庁壁)에 발을 드리우고 보는 자와 구멍 틈으로 엿보는 자가 있었으니 이들은 반드시 관백의 희첩(姫妾)의 무리일 것이며 들으니 관백도 또한 그 가운데에 있었다 한다. 규모가 이와 같고 사람을 등용함이 이와 같고 의식(儀式)과 제도가 이와 같은데도, 능히 부국강병(富国強兵)의 장구한 낙을 누리니 실로 알 수 없는 일이다(Ⅰ-534).
에도성에서 국서 전달 의식이 끝나면 쇼군이 베푸는 연회가 열리는데, 1719년 사절의 경우도 에도성 혼마루(本丸)의 마츠노마(松の間)에서 베푸는 연회가 열렸다. 이 연회는 물론 쇼군을 대신하여 고산케(御三家, 쇼군의 문중인 紀伊․水戸․尾張의 세 집안)가 주재하는데, 그 연회 중에 보고 느낀 것을 적은 글이다. 연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쇼군이나 처첩들이 발 사이로 연회를 엿보는 모습을 묘사한 다음, 일본의 인재 등용 방식이나 제도 등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부국강병을 누리니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제부터 신유한이 지적한 일본의 문제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신유한은 먼저 세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에도에서 당시 大学頭로서 바쿠후의 학문을 관장하고 있던 하야시 노부아츠(林信篤)와 필담을 한 다음, 용모는 長者의 풍모가 있고 담화의 내용도 謹厚하고 老成하지만 문필은 졸하고 소박하여 모양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 가소로운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처럼 재주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일본이 과거로 인재를 뽑지 않고 벼슬을 세습하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뛰어난 재주를 가졌어도 일생을 불우하게 보낸 사람이 많다고 하며 야나가와 신타쿠(柳川震沢 ?~1690, 해유록의 柳鋼)의 예를 들고있다. 신타쿠는 기노시타 쥰안(木下順庵)의 제자로 하쿠세키나 호슈와 동문이었는데, 특히 시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1682년의 임술사절단이 방일했을 때 스승인 쥰앙과 함께 조선 사절을 방문하여 筆談․唱和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신유한은 이 때의 창화집인 ꡔ壬戌使華集ꡕ을 서기 成汝弼(임술사절단의 제술관이었던 成琬의 조카)을 통해 구해 보았는데, 신타쿠의 시를 보고 그를 문장이 호한하고 웅건하여 일본인 중에서 가장 걸물이라고 평한 다음, 그렇지만 신분이 낮아 한(藩)의 서기도 되지 못하고 하인으로 일생을 마쳤다고 하며 애석해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과거제도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조선 지식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불공평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사실 과거제도는, 조선의 경우는 양반에게만 허용되었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개인의 능력을 위주로 하여 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민주적인 인재 선발 방식이었다. 민주주의의 원산지라 할 수 있는 서양에서도 관리를 시험으로 뽑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인데, 이것도 과거제도의 영향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13) 오늘날 우리들이 서양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제도도, 그 원류는 과거제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제도에는 폐해도 있었는데, 신유한도 이러한 폐단을 알고 있었다. 일본인들과 필담․창화를 하면서 그들이 고전에 정통한 것을 발견한 신유한은, 일본은 산수가 수려하여 사람들이 총명한 데다가 과거를 보기 위해 표절하는 폐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견이 정확하다고 지적하여, 과거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신유한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 꽤 흥미로운데, 그가 승진이 엄격히 제한된 서얼출신이었기 때문일까? 실제로 그는 당대의 대학자인 金昌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시문에 능했는데도 불구하고 ‘限品敍用’ 이란 규정 때문에 벼슬이 종4품인 奉尚寺 僉正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며, ꡔ해유록ꡕ에도 그가 이러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온다. 그가 벼슬을 한 적도 없고, 더구나 만나본 적도 없는 신타쿠에게 관심을 보인 것도 이러한 자기 처지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과거제도의 보다 큰 폐해는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있을 것이다. 과거 답안지에 쓸 모범답안만을 공부하던 머리는 이내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게 되어, 양명학 같은 다른 학파의 설은 이단시되었고, 주자학 중에서도 자기들과 해석이 다르면 ‘斯文亂賊’으로 매도했다. 과거를 보기 위한 공부 때문에 선비들이 참다운 학문을 하지 못한다는 실학자들의 지적은 이런 점에서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주자학이 관학이었지만 과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지방분권적인 봉건제도 덕분에 자기 지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도 부드럽게 근대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14) 그러나 신유한은 과거가 표절하는 폐단을 낳는다고 하면서도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2) 의식과 제도의 문제
신유한은 일본의 의식이나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복제도나 의전 문제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문견잡록」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나름대로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리나 승려들은 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식 때에만 쓰고 평소에는 쓰지 않으니 우습다고 했으며, 일본인이 무릎을 꿇고 앉는 정좌의 습관도 말로는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옷이 이상하여 아래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그렇게 앉는 것이라 했다. 또한 나가바카마(長袴)도 윗사람을 공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일본인의 풍속이 경망하고 사람 찌르는 데 용감하므로, 그 윗사람 된 자가 혹 무슨 변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보하기에 불편하게 만들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뿐만 아니라 국서를 전달하는 의식에서 쇼군 요시무네가 입은 관복을 보고는 “또 들으니, 관백이 쓴 모자는 곧 집정 등이 쓰는 모자요, 천담포(浅淡炮)는 목면으로 만든 포(炮)라 한다. 왜인의 관(冠)은 본시 임금 신하의 구별이 없고 평소에 검소함을 숭상하여 목면 옷 입기를 좋아한다지만 정청(政庁)에 앉아서, 이웃 나라를 만나는 예식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라고, 역시 예복이 아닌 옷과 신분에 당치 않은 관을 쓰고서 손을 대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이 이상하고 특별한 행동을 좋아하여 풍속을 바꾸려 하는 것인가?(Ⅰ-534~5)”라며 비판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그의 선정을 칭찬하고, 또한 “비단 옷을 입고 입시하는 신하가 있으면 길종이 문득 그 옷의 값을 묻고는 곧 말하기를 ‘내가 입은 목면(木棉)옷도 족히 몸을 덮을 수 있다’ 하니 이 뒤에는 모시는 신하가 감히 비단을 입지 못하였다(Ⅰ-526~7)”고 하며 그 검소함을 칭찬한 신유한이지만, 외교 의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까지 목면 옷을 입은 것을 보고는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의전문제도 그가 많은 신경을 쓴 부분으로, 이미 쓰시마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일본측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쓰시마 도주를 접견할 때의 예법을 둘러싼 논쟁이었는데,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사절단이 이즈하라에 도착한지 3일째 되던 날, 도주가 쓰시마의 문인들과 필담․창화를 시키려고 연회를 열어 제술관을 부른 일이 있었다. 그런데 도주를 만날 때 제술관이 도주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면 도주는 앉은 채 소매만 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신유한이 거절하려고 했지만, 세 사신이 참석을 권하고 또 초청한 측의 호의도 무시할 수 없어 연회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참석했다. 참석자들과 필담을 나누다가 도주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신유한이 정색을 하고 도주를 접견할 때에 종래의 예절을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호슈가 전례가 그렇다고 하자, 신유한은 그렇지 않다고 한 다음 조선에서는 국서를 모신 京官이 외지에 나가면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藩臣과 한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는데, 쓰시마 도주는 대대로 조선으로부터 図書와 녹을 받는 受図書人15)이고 대소사에 관해 조선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으니 조선의 번신에 해당하므로 도주와 한 자리에서 예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내가 문신(文臣)으로 저작랑(著作郎)의 직함을 띄고 왔다. 설령 사신의 아래이어서 도주와는 약간 분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빈주(賓主)의 자리를 피하여 도주는 남으로 향하여 서고 나는 앞에 나아가 서로 마주서서 나는 두 번 읍하고 도주는 한 번 읍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비록 도주에게 편중(偏重)되는 혐의가 있으나 특히 사신인 것을 위하여 억지로 한 등을 낮추는 것이 되거니와, 만약 끝끝내도 도주는 앉고 나는 절하는 예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임금이 보낸 제술관으로 하여금 번신에게 체모를 잃게 하는 것이다(Ⅰ-408~9)”라며 자기의 지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역관에게 이것은 조정의 기강에 관계되는 일이니 일본측에 잘 설명하여 조정과 국가의 수치가 되지 않게 하라고 했다. 이 일은 결국 도주가 연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말이 났고, 이후로는 제술관이 사사로이 도주의 초청을 받고 선물을 받는 일이 폐지되었는데, 그가 의전문제에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간의 외교에서 의전이란 상대국에 대한 예우를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현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안이다. 의전의 격이 맞지 않으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체면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조선은 禮를 매우 중시하던 나라였다. 한국에 예가 언제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国学의 교수과목에 ꡔ禮記ꡕ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고려 말에 ꡔ朱子家礼ꡕ가 도입되고 조선의 지배이념이 성리학이 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조선 중기에 여러 차례 典礼論争을 거치면서 학문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학파에 따라 禮論이나 禮説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러한 차이가 17세기의 禮訟으로 이어져 급기야 1680년의 庚申大黜陟으로 발전하게 된다. 南人계열의 학자가 대량으로 죽임을 당해 西人이 정권을 잡는 계기가 된 이 사건은, 원래 효종의 母后인 趙大妃의 服喪 문제(1차 예송)를 놓고 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서인 계열과 尹稶를 중심으로 한 남인 계열 사이의 礼学論争에서 발단된 것이었다16) 즉 궁중의례를 둘러싼 논란이 대규모 옥사를 불러 올만큼 당시 조선에서는 예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사절단의 전례를 담당하고 있던 신유한이 쇼군의 관복이나 의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3) 성 풍속의 문란
신유한은 또한 일본인의 성 풍속이 문란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문견잡록」에서 일본인은 사촌남매끼리 결혼하고 형수나 제수가 과부가 되면 데리고 사는 등, 그 행실이 음탕하고 더러워 금수와 같다고 하여 근친 결혼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반드시 목욕탕이 있는데 남녀가 함께 벗고 목욕한다고 하며 혼욕의 풍속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은 역대 통신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서 그다지 특이할 것이 없다. 신유한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일본의 유곽을 기술한 대목이다17) 에도를 향해가던 신유한 일행은 오사카에서 5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 때 신유한은 오사카의 유곽을 보게 된다. 당시 신마치(新町)에 있던 오사카의 유곽은 교(京)의 시마바라(島原), 에도의 요시와라(吉原)와 함께 일본 3대 유곽의 하나로 불렸는데, 모두 막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공창이었다.
이를 보고 신유한은 일본의 “풍속에 각 지방에 노래하고 춤추는 기생을 설치하는 법이 없으므로 부상(富商)의 여행하는 자들이 모두 지내는 곳마다 사사로이 창녀(娼女)를 접하므로 이름난 도시의 큰 객점(客店)에는 모두 창루(娼楼)가 있(Ⅱ-93)”다고 하여 일본은 官妓제도가 없어서 유곽이 발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남녀간에 있어 상등의 풍류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일본의 유녀는 돈만 지불하면 아무에게나 좋다고 애교를 바치니 이것은 하등의 풍류에 속한다고 했다. 매춘이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발언이지만, 공창제도 없이 고려시대부터 확립된 관기제도를 운영해오던 조선의 지식인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곽의 풍습을 오언절구로도 읊었는데 9월 9일자 일기에 실려있는 「浪華女児曲」 30수가 그것이다. 일본의 일반적인 생활 풍속을 묘사한 시는 정몽주 이래 통신사들의 기행록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신유한처럼 유곽의 풍속을 악부시 형태의 시로 남긴 사람은 없다18) 이것은 그가 일본의 유곽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사실 일본의 유곽이나 풍속에 관한 묘사는 역대 통신사들의 기록 중에서 ꡔ해유록ꡕ이 가장 자세하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일본의 유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해도, 당시에 이를 소재로 시를 짓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가 「낭화여아곡」 서문에서, 공자가 淫詩가 많은 鄭나라의 노래를 멀리하라고 했으면서도 정작 시경을 편찬할 때에는 鄭과 衛 두 나라의 노래를 채록하여 후세의 경계로 삼았다는 사실을 예로 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男色을 소재로 한 시도 지었는데, 「낭화여아곡」 바로 뒤에 실린 「男娼詞」란 칠언절구 10수가 그것이다. 그가 서문에서 “이것은 정욕(情慾)중에도 특이한 경지로서 정․위(鄭衛)의 세상에서도 듣지 못하던 것이니, 한(漢)나라 애제(哀帝)가 동현(董賢)에게 하던 짓을 역사에 나무란 것이 곧 이것이던가?(Ⅰ-492~3)”라고 하여 그 충격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일본인의 성 풍속 중에서 신유한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그가 특별히 이 문제에 관해 호슈에게 확인한 것도 그 때문이었으리라. 즉, 신유한이 호슈의 글에 나오는 “왼쪽에는 붉은 치마요, 오른쪽에는 어여쁜 총각이다”라는 글귀를 가리키며 이것이 남창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호슈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신유한이 “귀국의 풍속이 괴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본래 천지 음양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니, 천하가 동일한 바이나 오히려 음(淫)하고 혹(惑)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어찌 양(陽)만 있고 음(陰)은 없이 서로 느끼고 좋아할 수 있다는 말이요?(Ⅱ-94)” 하고 반문하자, 호슈가 웃으며 당신은 남색의 즐거움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호슈는 당시 쓰시마의 서기로 대조선 외교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3년이나 부산에서 유학한 적이 있는 조선통으로 조선 사절들도 인정하는 학자였다. 그런 그가 이런 대답을 했으니 신유한으로서는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그가 “우삼 동의 말하는 것도 오히려 그와 같으니, 그 나라 풍속의 미혹(迷惑)함을 알 수 있다(Ⅱ-94)”고 한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이처럼 신유한은 조선의 유학자답게 일본인의 성 풍속에 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색에 기울인 그의 관심의 일단을 엿보기 위해 「남창사」의 시를 1수 살펴보면서 본론을 맺기로 하자.
구슬 밭 비단 장막 유구 자리로, 珠簾繍帳琉球席
그대를 가장 좋은 집에 고이 간직하네. 珍重蔵君最好家
허리에 찬 3자 칼로, 自擬腰間三尺水
미친 나비 봄꽃에 가까이 못하게 한다네. 不教狂蝶傍春花
류큐(琉球)에서 만든 자리를 깔고 아름답게 꾸민 저택에 미소년을 들여앉혀 놓고 다른 사람이 유혹하지 못하게 허리에 칼을 차고 지킨다고 한다. 男女(여기서는 물론 男男이지만) 사이를 나비와 꽃에 비유하는 것은 기발할 것도 없는 상투적인 비유이지만, 허리에 칼을 차고 꽃을 지킨다는 부분은 일본의 사무라이가 언제나 허리에 칼을 차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생각해낸 묘미 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문학적인 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실제 상황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남색이 성행한 것은 14세기 이후 절에서부터였지만 17세기에 들어와서는 무사는 말할 것도 없고 승려나 서민까지도 경쟁적으로 미소년을 편애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특히 3대 쇼군 이에미쓰(徳川家光)가 남색을 애호했기 때문에 이 풍조는 더욱 확산되어, 너도나도 미소년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한다19) 신유한도 이 시에 붙인 주에서 “왜인들은 자기들의 처에게는 질투하지 아니하면서도, 남창에게는 질투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까지 있다(Ⅰ-494)”고 했다.
맺는말
이상에서 신유한이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았나 살펴보았는데, 그가 관찰한 일본은 우선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가진 부국강병의 나라였다. 그는 ꡔ해유록ꡕ의 곳곳에서 일본 산수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이를 신선경에 비유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절경이 일본에 있는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도시의 화려함과 물질적 풍요에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가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번영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즉 일본의 경제가 대단히 발전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락함에 젖어 조선을 다시 침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군사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쓰시마에서 일본 수군의 용맹함을 경험하고는 이순신의 승리가 요행이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나라였던 것이다. 게다가 위정자는 검소하고 국민들은 청결하며 높은 시민의식을 갖춘,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선진국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바라본 일본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 나라이기도 했다. 의식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사절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에 쇼군이 목면옷을 입고 나타나는 등, 격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성 풍속이 난잡하여 근친결혼이나 남녀혼욕이 일상화되어 있고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으며 심지어 남색까지도 즐기는 나라라는 것이다. 게다가 과거로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신분을 세습하기 때문에, 재주있는 사람이 불우하게 지내고 능력없는 인물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大学頭였던 노부아츠인데 그가 문필이 졸하고 소박하여 모양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높은 자리에 있으니 가소로운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신유한이 문필의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사실 조선은 유교적 제도나 학문의 발달 정도를 가지고 문명을 평가하고 있었다. 청나라를 오랑캐라 부르며 조선만이 중화의 문명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중화’ 의식도 바로 이런 기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일본은 야만의 나라였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이 중화의 문명, 즉 유교 문명으로 교화시켜야 하는 나라였던 것이다. 신유한이 출발에 앞서 崔昌大에게 전별시를 청하자, 그가 서가에서 하쿠세키의 ꡔ白石詩草ꡕ를 꺼내 보여주면서, 자네 정도라면 하쿠세키를 한 팔로도 대적할 수 있겠지만 일본이 땅이 넓고 그 산수가 곱다 하니, 반드시 재주가 높고 눈이 넓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매사를 신중히 하여 그들을 심복시켜야 한다고 당부한 일도, 이러한 조선 지식인의 생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이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 불리는 정약용이 불과 50년 후에 있을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지 못하고, 일본의 학문이 발전했으므로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신유한은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조선의 교화를 받아야 할 야만의 나라 일본이 조선보다 더 부강하다는 사실을 목격했으니. 그가 앞에서 열거한 일본의 장점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부국강병의 장구한 낙을 누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신유한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일본을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조선의 문화적 우월주의라는 안경 때문에 일본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유한의 이러한 태도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문화적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정신사적으로 보면 300여년 전의 신유한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는 것은 아닐까?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