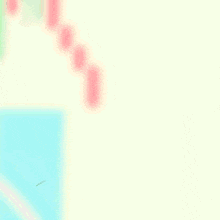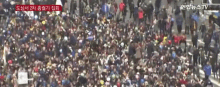[야동] 야동은 학원물이 진리라면서요?
W. Savory
으아아아- 기지개를 핀다. 곧게 뻗은 팔이 쭈욱 올라간다. 그 끝에는 동그랗게 말아 쥔 주먹이 있다. 하얀 게 잘 뻗어 예쁘다. 팔을 내리고는 머리를 벅벅 긁는다. 통통한 입술을 활짝 벌려 크게 하품을 한다. 순하게 구부러지는 눈꼬리 끝에 자그만 눈물이 맺힌다. 내가 쳐다보는 걸 느꼈는지 나를 흘낏 바라본다. 눈이 마주쳤다. 베시시 웃는다. 부끄러운 듯이 작게 입모양으로 봤어? 하고 물어온다. 고개를 끄덕이자 헤헤, 하고 웃어넘긴다. 장동우! 하는 담임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린다. 시계를 보니 벌써 아홉 시다. 야자가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는 듯 팔에 머리를 파묻는다. 푸른 빛이 감도는 머리카락에 덮인 하얀 목선이 드러난다. 참 예쁘다. 하얀 와이셔츠와도 잘 어울린다.
야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다. 적막이 맴돈다. 아무 말 없이 길을 걷고 있다. 저만치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란 듯이 내 소매를 쥐어온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쓸데없이 겁만 많아서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는 해가 지고 한참 뒤에야 집에 가는 걸 못 견뎌했다. 항상 내가 함께 가 주어야만 했다. 있지도 않은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없던 애교까지 부려대는데 사실 부탁하지 않았어도 같이 가 주려 했다. 내가 못 견디겠어서. 누가 납치해갈까봐서.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어온다. 무섭다고 잡고 있던 내 손을 더 꼭 잡는다. 장동우는 유난히 손발이 차가워서 항상 내가 잡고 있어 주는 걸 좋아했다.
"춥냐?"
"어… 이제 쌀쌀해졌네, 많이."
안 그래도 작은 체구인데 동그랗게 몸을 만다. 그러게 위에 뭐라도 걸치고 오라니까. 하고 핀잔을 주자 히히, 하고 저만 모르는 웃음을 짓는다. 하는 수 없다. 가방에서 가디건 하나를 꺼냈다. 아침저녁으로 추워진다는 일기예보에 늘 가지고 다니던 가디건이다. 이거 입어, 하며 던져주자 고마워! 라며 환한 웃음을 짓는다. 장동우 웃음은 백만불짜리다.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보이는 눈매가 예쁘게 휘어지면서 발갛고 통통한 입술이 벌려진다. 바라보는 사람도 행복해질 만큼 환하게 웃는다. 덩달아 웃어 주니 좋다고 가디건을 위에 걸쳐입는다. 몇 번이나 생각하는 거지만 장동우는 가디건이 참 잘 어울린다. 결 좋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자 키 작다고 무시하냐며 저 혼자 발끈한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놓았던 손을 다시 잡아온다.
"사내새끼끼리 무슨 놈의 손을 자꾸 잡아."
"귀신 나오면 책임질거야? 아, 무섭단 말이야. 그냥 좀 가줘, 호야아."
장동우 애교 중에는 이게 최고다. 호야, 호야아. 호야는 별명이다. 어릴 때부터 이름마냥 불려져서 익숙하긴 하지만, 나이가 몇 갠데 이런 애 같은 별명으로 불리는 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 장동우는 예외다. 똑같이 호야라고 하는데, 뭔가 다르다. 늘 호야아, 하고 말꼬리를 늘린다. 애교 부리거나 겁 먹을 때 나오는 특유의 울먹거리는 말 흐림이 좋다. 남들이 호야 호야 하면 아기 취급 받는 것 같은데, 장동우가 호야아, 하고 부르면 내가 장동우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장동우가 나한테 매달리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좋다. 장동우를 힐끗 내려다보니 동그란 정수리 밑으로 예쁘게 굴곡진 속눈썹이 파르르 떨린다. 무슨 겁이 이렇게 많을까. 보들보들한 손을 엄지로 어루만지자 나를 올려다본다. 눈동자가 일렁인다.
"많이 무섭냐?"
장동우가 고개를 까닥거린다. 늘 짓던 미소도 짓지 않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이 표정이 나는 미친 듯이 좋다. 늘 활발한 장동우만 보다가 이렇게 겁에 질린 장동우는, 색다르면서도 야하다. 묘한 정복감이 등골을 타고 흘러간다. 웃기만 하던 사람이 울면 그게 그렇게 꼴릴 수가 없다는 거다. 나만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궁지에 몰린 표정은, 마치. 누가 잡아먹기라도 할 듯이 나를 불안하게 올려다보며 덜덜 떠는 모습에 나는 미소가 나온다. 이게 사냥의 묘미다. 그게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물체의 목숨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느낌은 나를 위로 한껏 치켜세운다. 오늘따라 장동우가 유난히 많이도 떤다. 어슴푸레한 달빛에 창백한 피부가 비쳐 예쁘다.
벽에 밀쳤다. 무서움에 힘이 빠져 있던 몸이 벽에 밀쳐지자 힘없이 탁 하고 부딪힌다. 뭐냐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동그란 눈이 이제까지 봐 오던 무서움과는 다른 종류의 무서움으로 뒤덮였다. 두 손으로 장동우의 얼굴을 감쌌다. 뺨이 내 양 손으로 전부 가려졌다. 호야아, 왜, 그래.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말을 꺼낸다. 겁에 질린 목소리가 덜덜 떨린다. 입술이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난다. 붉지 않은데도 예쁜 입술이다. 먹어보고 싶었다. 입술을 포갰다. 장동우가 깜짝 놀라 손으로 가슴팍을 밀친다. 힘 없이 툭툭 떨어져나가는 장동우의 주먹에 실소가 흘렀다. 숨을 쉬기 곤란해한다. 혀가 뒤섞인다. 미처 삼키지 못한 침이 턱을 타고 흐른다. 속눈썹이 떨린다.
"컷-! 잘 했습니다!"
"두 사람 분위기가 왠지 학원 로맨스가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걸로 설정했는데, 둘 다 교복도 너무 잘 어울리고, 장르를 잘 선택한 것 같네요."
"키스신 압권인데요? 진짜 사귀는 거 아냐?"
촬영이 끝났다. 호원이 동우에게서 입술을 뗐다. 촬영이지만 리얼리티를 위해 실제처럼 키스하라는 감독님의 말에 그대로 하긴 했지만, 역시나 부끄러운 건 사실이다. 호원도 동우도 서로만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다. 마지막 촬영인 만큼 피곤할 만도 한데, 본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둘 다 아역 배우로 데뷔해 벌써 경력만 십 년이 넘은 베테랑 배우들이지만, 이런 촬영은 또 처음이라 얼굴이 발개진다.
관계자들에게도, 기자들에게도, 배우 동료들에게도 철저히 숨겼다.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우연히 호원에게 퀴어 영화 제의가 들어왔다. 동성애자였고, 퀴어 연기는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지만 이 기회에 색다른 연기를 하고 싶었던 이호원은 그 제안을 선뜻 수락했다. 뒤늦게 상대역이 사랑하는 연인 장동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서로 만나서 실컷 웃었다. 정말 이게 연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둘 다 진심이었지만. NG도 거의 내지 않고 영화는 순조롭게 촬영이 끝났다. 영화 자체도 대단한 호평이었다. 보는 사람들도 전부 연기인지 실제 사랑하는 사이인지 헷갈렸다고 할 만큼.
둘만이 아는 사실이다, 그것이 연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
그대들 왜이렇게 오랜만이죠 +//+
뭔갘ㅋㅋㅋㅋㅋ제목이랑 내용이랑 하나도 안 ㄴ어울리는 것 같은 기분은 뭐짘ㅋㅋㅋㅋㅋㅋㅋ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와… 정국 자컨에서 내내 한 쪽 팔 가렸대
와… 정국 자컨에서 내내 한 쪽 팔 가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