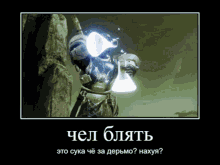더보기
어느새 벌써 해는 뉘엿뉘엿 사그라지는 모습이 잔상처럼 내 머릿 속에 흩어져 나를 뒤덮어 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만 우뚝 서서 천천히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자니 괜시리 쓸데없는 옛 추억들에 잠겨 기억 저 편으로 애써 밀어 넣어 두었던 너를 떠올리며 그려본다.
- 미안해 경수야.
너와의 추억들이 이리도 허무하게 져 버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던 그 어느 지난 날을 나는 기억한다. 빛바랜 사진들 처럼 이젠 희미해져만 가는 너와 내가 함께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한때의 추억으로만 변해버린 지금 이 순간도 난 널 생각한다.
너를 잃었던 그 날은 많이 울었다. 아주 많이…울었었던 것 같다. 나에게 애써 담담한 척 이별통보를 건네던 너는 나에게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눈 밑은 안쓰럽도록 벌개져 있었지만 난 모르는 척 했다. 그리고는 일부러 날 똑바로 바라보려 계속해서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는 너를…난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응시하기만 했었다. 그리고 무언가 불안한 듯이 이따금씩 흔들리던 네 눈동자를…난 알고 있었지만 또 다시 모르는 체 했다. 내 뱉는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 마다 입김이 서렸고, 무의식 적으로 내려갔던 내 시선이 멈췄던 건 백현이의 꽉 쥔 두 주먹에서 보이던 핏자국 때문이었다.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던 것인지 곧 소복히 쌓인 눈 위로 방울져 떨어지고…그것은 곧 꽃처럼 새빨갛게 스며들었지만 난 역시 모르는 체 해야만 했다. 나 만큼이나 여리고 어린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난 그 모든 것들을 애써 외면하며 너의 뻔히 다 보였던 삼류 연기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뒤 돌아서야만 했다. 너 조차도 알지 못했겠지. 짧은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위해 눈을 감아야만 했었던 사실을. 힘들게 끝맺었던 너의 이별통보를 듣고 내가 미련없이 너에게서 뒤돌아 섰을 때, 혹여나 눈물 짓는 내 모습을 네가 눈치챌까봐 입술을 깨물고 눈이 빨개지도록 눈물을 참아야만 했던 그 사실을. 네가 나에게 무엇을 숨기려 했었고, 그 때문에 그리도 힘들게 나를 보냈어야만 했었는지…나 또한 모두 알고 있었기에.
멍하니 그 날을 떠올리다 보니 이젠 보이지 않는 노을의 그림자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 위에 내려앉았고, 매서운 추위에 목에 둘둘 감은 목도리를 새빨개진 코 위로 끌어당기고는 코를 훌쩍거리며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겼다.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때 마다 기분좋게 들려오는 눈을 밟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입가엔 작은 실소가 배어나왔다. 오랜만이라면 그렇다고 할 수있었던 3년만에 나의 조그마한 기억 뒷 편에서 끄집어 냈던 너의 그 모습은 나를 살며시 미소짓게 했다.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너는 나에게 짧은 문자 하나도 보내지 않았고, 그랬기에 나 역시 그런 백현이에게 먼저 연락을 걸지는 않았다. 그 상태로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렇게 희미해져가는 너와의 추억이, 네 모습이 익숙해질 만큼의 3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나는 그 시절의 어린 나를 후회한다. …안쓰러울 만큼 빨개져 있었던 네 눈가를 어루만져주며 조금만 더 말을 붙일걸. 흔들리는 네 눈동자를 외면하지 말고, 날 더 많이 새겨둘 수 있게, 그럴 수 있게 더 많이 눈을 마주쳐 둘걸. 내 시선 끝에 닿았던 너의 그 두 주먹을 감싸쥐며 조금만 더 많이 네 온기를 느껴 둘걸.
- 으…춥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 고작 3년이란 시간에 하나씩 희미해져가는 너와의 추억을 조금만 더 기억할 수 있게…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내 작은 상자 속에 감춰 두었던 너를 꺼내 추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만 더 많이 너를 내 두 눈에 보아두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부질없는 후회가 그 어린 날의 나를 책망하는 듯이 내 머릿 속을 멤돈다. 하늘을 올려다 보는 습관이 생긴 이후로는 바보처럼 눈물도 많아진 것만 같다. 코를 쿨쩍거리며 이젠 칠흑같이 새까만 밤 하늘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별을 찾겠다며 계속해서 그런 밤 하늘을 바라보며 걸었다. 그리곤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별을 발견하고는 나도 모르게 작게 탄성을 내질렀다. 난 그렇게 또 한참을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그 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코 위까지 둘둘 감은 목도리에 숨이 막혀 그런 목도리를 입까지 내리고 숨이 막힌 듯 한숨을 내뱉자 하얗게 김이 서린 입김이 보였다.
그는 눈을 꿈뻑거리며 멍하니 밤하늘을 응시하기만 했고, 힘들게 찾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는 별을 향해 무어라고 입을 껌뻑대고는 한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다, 곧 미묘한 웃음을 짓고는 다시 뒤를 돌아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이라고는 그 뿐이 없던 그 골목길에는 오로지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단 한 사람만의 발자국만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을 뿐 이었다.
- 잘…지내니?
예 첫 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충격주의) 현재 난리난 "차면 부러지겠다” 대참사..JPG
(충격주의) 현재 난리난 "차면 부러지겠다” 대참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