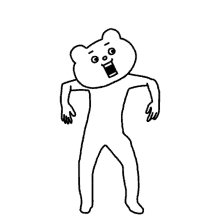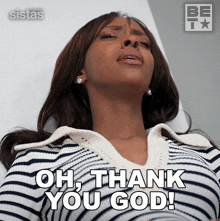어릴적 내 동네에는 깡 마른 남자애가 있었다.
추운날 동네친구들끼리 놀 때면 항상 껴있었던 아이인데
우린 모두 따뜻한 잠바를 입고 있었지만 그 남자애는 얇은 가을잠바를
입고 돌아다녔다. 항상 남자애는 기침소리가 끓는 감기를 가지고 다녔다.
돈을 들고 다니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항상 애들하테 얻어 먹거나,
지금 생각하면 자주 굶고 다녔던게 분명하였다.
친구네 집이나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저녁밥을 먹이면 허겁지겁 먹고 그랬으니깐
나의 엄마도 다 먹고선 눈치보는 그 아이의 그릇에 밥을 더 얹혀 주었다. 남자애는 또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고 말이다.
우리 동네무리 중에서 그 아이는 아주 온순하고 착한 아이였다.
그 아인 나를 자주 따르고 그랬다.
내가 무엇을 하든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놀고 엄마가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던 숲 속 까지
가서 놀고 그랬으니깐.
난 또래의 아이처럼 그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있으면 놀고 없으면 마는 그런 아이였지만
자주 놀았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 아이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추운 저녁에 놀고 흙에 젖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 같이 씻었다.
그 아인 옷을 벗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내가 벗겨주었다. 약간 몸을 베베 꼬긴했지만
얇은 옷이라 손바닥으로 어깨죽지를 때리며 술술 벗겨내기 쉬웠다.
조금 놀랐던게 그 아이의 마른 몸에는 파랗고 누런멍들이 꽤 많았다.
근데 그 아이와 잘 어울렸다. 그런 몸일꺼라 생각치도 못 했지만 위화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래도 엄마하테 들키면 안될 것 같은 생각에 화장실 문을 잠겄다.
아이는 우물쭈물하더니 바지를 다 벗었다. 나도 옷을 벗었고 작은만한 몸들을
따듯한 물로 가득찬 욕실에 들어가 처음에 어색한듯 싶었지만 작은 물장난 치며 놀았다.
언제가 엄마는 이 동네를 떠나 이사를 가야겠다며 이사짐을 쌓으시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자랑하듯 떠벌렸다. 나 이사간다며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어디가냐 그랬지만 금방
궁금증은 사라지고 막대기를 들며 놀아댔다. 다시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 사이에는 그 남자아이가 없었다.
내가 이사를 가는 날에 아이들의 엄마와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배웅하였다.
그때 그아이는 없었던 것 같았다.
서운하진않았다. 난 그 나이에 또래같이 그 아이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있으면 놀고 없으면 마는 그런 아이였다.
차를타서 뒤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쫓아오는게 보였다.
아이는 얼굴에 눈물 범벅인 얼굴 가지고 울먹거리며 차 뒤를 연신 달려 붙었다.
발을 절뚝거리며 지금 다시 기억해보면 좀 안쓰러워보였다.
나는 손을 흔들어주었고 내가 타고있는 차는 아이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아이의 모습은 내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시작단계라눙
그 뒷이야기가 생각이 안나서 꿈틀거린다...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신민아 김우빈 암 투병할 때 공양미 이고 기도했대
신민아 김우빈 암 투병할 때 공양미 이고 기도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