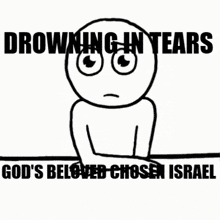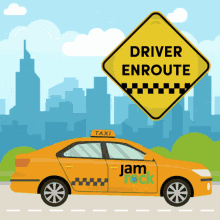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방. 따뜻하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에 기분이 좋아진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한다.
창밖을 보며 오늘도 나는 그 아이를 기다린다. 하나. 둘. 셋. 찰칵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기분 좋게 들어온다.
"왔어?"
장갑도 안 끼고 왔는지 손끝이 빨갛다.
"장갑이라도 끼고 오지. 손 시리겠다. 이리와."
내 침대 옆 의자를 끌고 와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다. 손을 꼭 쥐니 찬 기운이 나에게로 전해진다. 차갑지만 따뜻하다. 이 아이를 보면 그랬다. 차갑지만 따뜻한 아이.
손을 꼭 쥐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와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진다.
"오늘 진료는 언제래?"
"진료? 선생님 출장 가셔서 내일로 미루기로 했어."
"좋겠네. 밥은 안남기고 다 먹었지?"
"응. 오늘 나온 거 깨끗하게 다 먹었어."
꼼꼼히 나의 상태를 체크한다. 매일 아침 와서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도란도란 말을 하다 입시 준비 때문에 오후엔 학원을 간다.
저녁에는 힘든 몸을 이끌고 기어코 다시 여기로 온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안와도 된다고 말하지만 고집을 피워서라도 남아있다 내가 잠들면 돌아간다.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며 매일 예쁘다고 말해주는 너.
"나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 선생님이 마지막이라고 빡세게 해야 된다네."
"응. 잘 가. 내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구 와"
"와. 어쩜 서운한 척도 안하냐. 나 서운하게."
서운하다는 듯이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얼른 가보라며 손을 휘휘 저었더니 나중에 저녁에 또 올게- 라며 문을 닫고 나간다.
사실 저녁에 너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다고 했다. 가끔씩 죽도록 아팠지만 버틸만했다.
그 아이를 볼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몸은 아니었나 보다. 또 다시 몸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아파오기 시작했다.
이젠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아파왔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통은 내 몸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직 너한테 못 한 말이 많은데. 아직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느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너는 내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왜 울고 그래. 누구 죽었어?"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너를 쓰다듬으며 얘기했다.
"나 진짜 괜찮아. 그만 울어. 오늘은 선생님한테 안 혼났어?"
급하게 말을 돌리는 나를 눈치 챘는지 재빠르게 화재를 돌린다.
"어. 오늘은 완전 잘해서 선생님이 나 칭찬했잖아. 그래서 일찍 마치고 바로 왔지. 나 안보고 싶었어?"
"당연히 보고 싶었지.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자. 나도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나 방금 왔는데 이렇게 쫓아낼 거야?"
"피곤하잖아. 오늘 얼른 가서 자고 내일 일찍 와서 나랑 놀자."
아쉽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 간다. 아프고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보라는 말을 남기고 너는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또 몸 한구석이 아려왔고 고통은 더욱 강해져 온몸에 마비가 올 정도였다. 한참을 끙끙거리고 있을 때쯤 쪽지가 생각났고 있는 힘을 다해 쪽지를 펼쳤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멈출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
2014년 ㅇ월 ㅇ일 김익슨환자. 사망하였습니다.
'나 오늘 시험 통과했어. 너 생각하니깐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 병 다 나으면 우리 결혼하자. 내일 다시 올게. 일찍 일어나 있어. 내 사랑'
아련하게 써보고싶어서 썼는데 망했나봐여.
똥손은 도망갑니다. 안녕 여러분.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