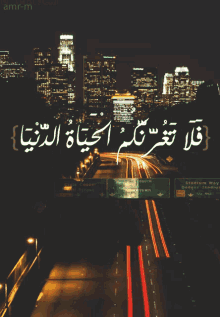Written the Hyeyo.
올턴
2년,만인가.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살랑이며 부는 바람과 함께 따듯하게 내리쬐는 햇빛이 마치 저를 반기듯이 어우러졌다. 종인이 살랑이는 바람에 흐트러진 앞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무작정 도롯가쪽으로 찾아걸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잠시의 방황으로 인해 부모님이 계시던 마카오로 유학을 다녀왔다. 말도없이 한국을 떠나 마카오 공항에 도착했을때 휴대폰이 터질듯 달아올랐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있을까? 택시를 잡아타고 익숙하게 주소를 불렀다. 시트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을 꺼내어 다이얼에서 한참 고민했다. 전화를, 해야하나? 결국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상가들이 꼭 저와 그의 모습을 연상케했다. 빨랐지만 정확하게 보이던 우리의 모습이, 차창에 그대로 비추어졌다.
*
오만원권 지폐를 기사에게 쥐어주고 트렁크에 있던 제 캐리어를 꺼내들었다. 고개를 들자 여전히 하늘색 페인트로 칠해져있는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놀이터와 경비실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있다. 천천히 걸어가 경비실 앞에 서자 경비아저씨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고 나오셨다.
˝ 아이구, 종인아… 어디 갔다오는거여… ˝
˝ 잘 지내셨죠? ˝
˝ 나야 암만 지내도 잘 지내지, 나보다는 찬열이부터 걱정해야되는거 아니여? ˝
˝ 찬열이, 아직도 여기서 살고있어요? ˝
경비아저씨가 혀를 쯧쯔,하고 찼다. 많이 변했어… 힘도 없고 애가 갑자기 축 늘어져서는 집에서 자주 나오지도 않어. 걱정되는 투로 팔짱을 끼시던 경비아저씨가 다시 환히 웃으시며 제 어깨를 밀었다. 어여 가봐, 보고싶지도 않어? 감사한 마음에 허리를 빠르게 숙였다. 등을 토닥이시는 손길이 예전처럼 여전히 따듯하셨고 이 곳은 변한게 없었다. 다만 박찬열이 변했다는것.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다. 사람이 없는지 제법 빠른속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 내심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찬열이 저를 거부하진 않을까, 미움을 사진 않았을까 아무리 2년이라지만 꽤 길었던 시간이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8층을 누르자 문이 닫혔다. 고개를 돌리다가 문득 예전에 써놓았던 낙서가 아직도 있을까해서 거울 근처를 둘러보았다.
´ 종인이랑 찬열이 ´
삐뚤빼뚤한 글씨가 구석에 나란히 모여있었다. 괜히 엄지손가락으로 낙서를 한번 훑고 ´8층입니다.´ 라며 울리는 목소리에 캐리어를 들었다. 차가운 느낌의 대리석 복도도 변함없이 말끔하게 청소되어있었고 넓은 창문 역시 시원하게 열려있었다. 복도를 찬찬히 걸어 806호를 찾았다, 복도에 캐리어바퀴가 끌리는 소리가 작게 울리며 아파트 근처를 날아가는 참새들과 입을 맞추었다. 806호, 기본의 호수알림판을 떼어내고 같이 만들었던 나무알림판이 예쁘게 걸려있었다. 2년 전에 만든건데, 아직도 갖고있네. 806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딩ㅡ동하며 밝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는 달리 집 안엔 기척이 없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있다가 도어락이 열렸다. 왜,문이 안 열리지? 평소 같았으면 얼른 나와서 저를 반겨줄 찬열이었을텐데, 미운털 하나가 제대로 박혔나보다싶어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 아…… ˝
문고리를 잡아 돌리자마자 찬열로 추정되는 남자가 빠르게 안겨왔다. 찰랑이는 갈색의 머릿결이 찬열임을 알려주었고, 멀뚱히 서있다가 저도 찬열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예전엔 무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벼워. 말이 없었다, 가만히 안겨서 작게 숨을 내쉬는 찬열은 말이 없었다. 많이 힘들었어? 물어보아도 대답은 돌아오지않고 찬열의 숨만 더 가빠졌다. 찬열의 허리를 껴안던 손이 등을 쓸어내리며 편안히 토닥였다.
˝ 너 미워. ˝
목소리가 많이 갈라졌다, 낮은 저음의 달짝지근했던 목소리는 주인을 잃고 사라졌다. 그래도 쉬어버린 찬열의 목소리는 예뻤다. 충분히, 제게는 예뻤다. 내가 대답이 없자 결국엔 울먹이던 목소리가 작게 흐느꼈다. 복도에 작은 울음소리가 퍼져 구석구석에 파묻혔다. 너 미워,밉다구. 찬열의 큰 손이 종인의 등을 내려쳤다. 그래도 남자라고 어지간히 힘은 세서 맞아서인지 따가운 등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찬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드라운 머릿결이 손가락 사이에 끼었다가 찰랑이며 제 자리를 되찾았다. 키는 저보다 훨씬 큰데 하는 짓은 꼭 길 잃어버린 아이같아서 강가에 아이를 내놓은 기분이다. 이젠 진정이 되었는지 다시 제 숨결을 찾기 바쁜 찬열에게 물었다. 너 나 없다고 밥 안 먹은거 아니지? 아니야. 나 없다고 잠 못 잔거 아니지? 아니야. 너 나 보고싶었지? …….
˝ 나 안 보고싶었어? ˝
찬열의 마른 볼을 붙잡고 눈을 마주하며 물었지만 찬열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기둥서방 없다고 밥도 안 먹었구만, 홀쭉하게 말라선 이게 뭐냐. 까슬한 찬열의 볼을 느릿하게 쓰다듬어주었다. 찬열이 고개를 들고선 종인에게 물었다. 넌, 넌 나 안 보고싶었어? 종인이 그저 찬열의 볼을 잡아 입술을 갖다대었다. 어깨를 쥐고있던 찬열의 손도 종인의 허리를 끌어안아 당겼고 살짝 비틀어지는 종인의 고개와 동시에 입술이 열렸다. 찬열이 종인의 뒷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 더욱 깊숙히 파고들었다. 서로 만났다가 다시 떨어지며 한쪽이 한쪽을 끌어당기는 혀놀음이 벌어지고 비틀리는 입술 사이로 선명하게 보였다. 타액이 입술을 번지르르하게 물들여 광을 내고 종인의 숨이 딸릴즈음 서로의 입술 안을 벗어나 고개를 뒤로 빼었다.
˝ 나야, 당연히 보고싶었지. ˝
종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종인의 캐리어를 든 찬열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종인의 방으로 향했다. 종인 역시 문을 닫고 거실에 있는 쇼파에 앉아 걸치고 있던 아주 얇은 가디건을 제 옆에 가지런히 눕혀 개어놓았다. 종인의 방에 캐리어를 두고 온 찬열이 방의 문을 닫고는 쇼파로 다가와 종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말없이 시계초침 소리만 듣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면서 눈꼬리를 휘어접었다.
˝ 진짜 얄미워, 알아? ˝
˝ 알아, 이제 안 갈거야. ˝
찬열이 종인의 어깨에 고개를 올리고 살짝이 눈을 감았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지 한숨을 곱게 내쉬고는 종인에게 손바닥을 보여주며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종인도 찬열의 머리 위로 기대고는 허벅지 위에 올라온 찬열의 손에 깍지를 끼며 저도 눈을 감았다. 찬열이 깍지를 낀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히 말했다. 지금 잠깐 눈 감고 일어났을때 네가 밥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