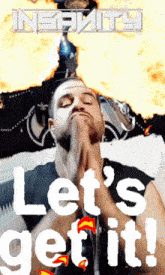비가 내렸다. 여름의 마지막을 알리기에 충분한 존재감으로 거세게. 창문 밖과 안의 괴리감에 묘한 기분을 느끼며 눅눅한 공기 속에 들어앉은 나는 고요히 널 떠올렸다.
우리는 어긋난 태엽같았다. 다름을 이겨내지 못했다. 서로를 할퀴고 상처내다가 결국엔, 그 모든 것에 무뎌졌다.
별 거 아닌 이별이었다. 너는 나에게 지쳐있었고 나도 그랬다. 너는 헤어질 방법을 생각했지만 나는 붙잡을 방법을 생각했던 것만이 달랐다.
“그만하자.”
너는 늘 그랬듯 항상 거침이 없었고,
“…왜?”
나는 늘 그랬듯 알면서도 되물었다.
한참을 말없이 마른 세수만 하던 너를 보며 나는 막연하게 이별을 받아들였다. 먼저 나가볼게, 라며 너는 일어났다.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고 한 번의 돌아봄도 없었다. 나는 손끝만 바라봤다. 흐렸다.
슬픈 노래를 찾아듣는다거나, 흔해빠진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짓는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슬펐고, 눈물이 났다. 시간이 모든 걸 잊게 해준다는 말을 믿 었지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없음에 답답했다.
자?
뭐해?
잘 지내?
언제 한 번 만나. 할 말이 있어.
나만 하는 대화에도 익숙해져갔다. 어느 날은 위안을 받기도 했다. 나는 길 잃은 난파선이었고 너는 불 꺼진 등대였다. 너는 날 그렇게 외면했다.
고질적인 신파극 속 여주인공처럼 구는 나 자신에게 질려갈 때쯤 전화를 받았다. 전파 섞인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제 그만할 때 안 됐어?
떨어뜨렸다.
나는 너를 잊었다. 아니, 잊은 척 했다. 그래야만 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한참 빗소리를 들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다.
여전하다.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환연 현지 인기 많은 거 보면 동탄 미시룩 어쩌고 해도 예쁜게 최고다
환연 현지 인기 많은 거 보면 동탄 미시룩 어쩌고 해도 예쁜게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