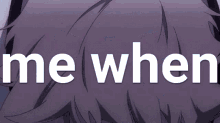모자르거나, 혹은 넘치는 것들
@김여사
학연은 울었다. 자꾸 눈을 찌르는 앞머리 탓을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엉엉 목놓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신을 훑는게 느껴졌으나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좀 있으면 잊어버릴 기억일 텐데. 애석하게도 학연은 오늘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다. 어쩐지 요 근래에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절대 잊지않던 택운과의 데이트도, 택운의 집주소도, 심지어 잠꼬대로 읊어대던 택운의 전화번호까지도. 집 가는 길이 몇 일 새에 가물가물해지고 있었다. 또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 할 일은 태산인데 손을 댈 수가 없다. 잊기전에 핸드폰을 들어 하트로 도배된 이름으로 문자를 보냈다. 우리 집으로 와봐, 할 말이 있어. 문자 하나를 보내면서도 보낼 말을 잊진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집의 물건을 깨끗이 정리하고 포스트잇을 붙였다. 꼴이 압류당한 듯 했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할 말을 정리하다가 경쾌한 집 울림에 인터폰을 보면 그가 서있다. 눈물이 나오려 했으나 입술을 물고 한 번 참아낸 학연이 예쁘장하게 웃음짓고 소파로 이끌었다. 그리고 꽤 무거운 분위기를 잡았다.
"헤어지자."
"연아."
"내가, 내가… 너무 힘들어, 택운아. 지쳐."
"……대체."
"운아… 제발."
일방적인 통보나 마찬가지인 이별이었다. 택운이 쉬는 짧은 한숨이 마음 한켠을 세게 후벼파는 듯 했다. 혹여나 택운과 눈이 마주치면, 너무나 곧은 그 눈동자가 날 흔들지 않을까 내가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버리진 않을까 고개를 떨구었다. 자그마치 8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낸 연인이었다. 그 흔한 다툼도 배려한답시고 먼저 숙여들었고, 연인 사이의 그 흔한 짜증 한번 없었다. 부끄러워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빼놓지 않았으며, 매일 밤 달콤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몇 번씩이나 얼굴을 쓸어내리던 손을 얼굴에 겹쳐올렸다. 울지마, 운아. 차마 나오지 못하는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시큰거렸다.
"……그래."
"미안…."
꽤 빠른 대답에 흔들리는 목소리.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서 더 안쓰러웠다. 눈가를 꼭꼭 누르는 하얀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당장이라도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싶었으나 아까부터 눈에 자근히 밟히던 포스트잇이 매섭게 채찍질했다. 8년동안 사람인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단단했던 택운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견고했던 벽이 허물어지고 남은 건 확연히 여렸다.
"이제 가줬으면 좋겠다."
"키스…한 번만 해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내 손목을 꽉 붙잡은 택운이 같이 일어섰다. 보채는 듯한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으나, 모른 척 택운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을 감고 입을 가까이 갖다대면 당연하단듯 내 허리에 손을 감고 끌어당겨 더 깊게 입을 맞춘다. 물어뜯을듯이 달려드는 그를 달래듯 토닥이면 또 당연하단 듯 튀어나오는 안타까운 배려심. 안녕, 땅을 보고 뱉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택운은 떠나갔다.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와 신민아 김우빈 웨딩사진 미쳤다
와 신민아 김우빈 웨딩사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