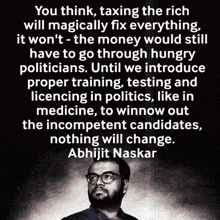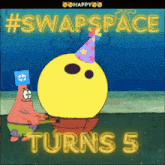제목만 보고 개그픽인가?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성지성 박지성ㅋ....
금손그대가 던져주신 소재를 덥썩 물어 썼는데
제목을 정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저딴 제목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안합네다
제목좀 정해주세요 누가.........
아그리고 함정이 또하나 있어요 달달물 아니고 새드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전 새드를 좋아하는 여자니까요
| 더보기 |
브금 들으며 보시라우 “여기 장동우 하나 계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없는 내 고백아닌 고백에, 동우가 푸핫, 하고 웃으며 햇살같이 웃었었다. 내가 내민 신용카드를 휙 낚아채 아이처럼 좋아하던 네 얼굴이 선명하다. “그럼 난… 이호원 하나 계산!” 내가 던진 멘트를 금세 따라하며 쿡쿡 웃어대던 그가,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잔상처럼 손에 잡힐 듯 말 듯 흐물거리는 네가 보였고, 잠이 들 것 같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너를 생각했었다. 백화점의 제일 외진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할 때도, 점장에게 꾸중을 들으며 기가 죽어 고개를 푹 떨구었을 때도, 너는 그 속에서 제일 빛났고 누구보다 반짝거렸다.
졸아버린 라면 면발처럼 구불거리는 머리를 하고 나타났을 때, 너는 쑥쓰러운 듯 계속해서 머리를 헤집어댔고, 나는 그런 네가 귀여워서 한참동안이나 웃었었다. 웃지 말라며 달려들다 발을 삐끗해 나에게 폭 안겨서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너와 처음으로 입을 맞추었을 때 내가 얼마나 설렜는지, 가슴이 뛰었는지 너는 알까. * “여행 가자! 여행 가고 싶어! 너무너무 가고 싶어어ㅡ!” 웬만하면 잘 졸라대지 않던 네가 처음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부탁해왔다. 나는 그런 네가 귀여워 거의 풀려 약간의 곱슬기가 남아있는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그러자, 하고 대답했었다. 잔뜩 신이나 이것 저것 짐을 챙기는 네 모습을 보고 크게 웃음이 났었다. 어린 애냐, 하고 장난스런 타박을 주자 너는 그 것도 모르고 ‘완전 신나!’ 하고 들뜬 모습이었었지. 도대체 내가 왜 그때 네 부탁을 들어주었을까, 가까이 다가와 몸을 들이밀던 네 체취에 홀려서 그랬을까. *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꺼져가는 정신을 겨우겨우 붙잡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우부터 찾았다. 지저분하게 먼지가 피어오르는 흙바닥에서, 감겨가는 눈을 애써 치뜨며 너를 찾았다. 차는 뒤집어져 강한 불을 머금고 있었고, 이 어둑한 곳에는 너와 나, 그리고 죽어버린 트럭 운전수 뿐이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시리고 습한 새벽 안개가 무섭게 몸을 덮쳐왔다. 안 되는데, 이러면 너를 찾을 수 없는데. “동… 동우야ㅡ 장동우… 어디… 어디있어ㅡ” 터질듯이 아픈 배를 붙잡고 겨우 소리쳤다. 아픔과 죽음이 동시에 몸을 눌러왔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무게가 죽음인지, 새벽 안개인지, 걱정인지, 알 길이 없었다. 동우, 동우가 없어.
* 새벽 도로는 한적했다. 동우는 짐을 다 챙기자 마자 출발하자며 닦달했고, 나는 그런 동우를 이길 수 없었다. 무작정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바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충분했다. 동우도 역시 고개를 주억거렸다. 바다로 가자, 한 마디에 나는 핸들을 꺾어 바다로 향했다. 바다가 가까운 탓인지, 도로에는 바다의 물기를 그대로 머금은 진한 안개가 자욱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약간 불안했지만 딱 그 정도였다. 더이상의 걱정도, 우려도 없었다. 어차피 차 한 대 보이지 않는 새벽 도로에 안개 쯤이야, 하고 생각했다. 갑자기 다가온 큰 트럭 경적소리에 놀란 동우가 나에게 안겨왔다. 동우가 내 가슴팍에 몸을 묻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졌다. 동우가 호원아, 하고 울먹였다. 달래줘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이미 핸들은 급하게 꺾여버렸고, 절벽 위의 도로를 달리고 있던 차는 가드레일을 넘어 절벽 밑으로 떨어져가고 있었다. 핸들을 놓고 동우를 껴 안았다. 제발, 제발, 제발, 하고 속으로 미친 듯이 되뇌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절벽은 까마득하게 위에 있었다. 배는 터질 듯 아팠고, 움켜쥔 복부에서는 피가 울컥 울컥 치솟았다. 시야가 뿌얘지고 눈물이 차올랐다. 필사적으로 몸을 질질 끌어 기었다. 비싸게 주고 산 와이셔츠에 흙이 묻던 피가 묻던 신경쓰이지 않았다. 차 건너편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동우,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아픔의 무게를 이기려 이를 악 물고 몸을 일으켰다. 다리 한 쪽은 부러진 것인지 움직이지 않았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는 질질 끌며 한 쪽 다리로만 절뚝거리며 걸었다. 배에선 피가 멎질 않았다. 머리를 만져보니 찢어져 피가 흘렀다. 하아, 하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불을 잔뜩 내뿜는 차에서 멀찍이 떨어져 그 건너편으로 걸었다. 동우가 죽은 듯 누워있었다. “동우야… 장동ㅇ…” 억, 소리도 낼 수 없이 고통이 밀려왔다. 그대로 주저앉아 땅으로 엎어졌다. 끄으윽, 하고 앓는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왔다. 움직이지 않는 몸을 겨우 끌었다. 땅은 미치도록 차갑고 시렸다. 바다와 가까운지 파도소리가 들려왔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안개가 동우와 나를 덮었다. 동우의 몸이 흠칫 떨렸다. 눈물이 왜 이렇게 차오르는 것인지, 짜증이 치밀었다. 동우와 나란히 누운 자세로 그를 바라보았다. 동우가 파르르 떨리는 눈을 치뜨고 나에게 시선을 던졌다. 공허하게 비어있었다. 얼굴에는 잔뜩 상처가 나 있었다. 동우와 내가 누워있는 흙바닥에 점점 피가 번져갔다. 동우가 운다, 얼굴을 잔뜩 구긴 채 울었다. 햇살같이 웃던 동우가, 미친듯이, 아이처럼 엉엉 울고있다. 부들부들 떨리는 팔을 들어올려 동우의 머리를 매만졌다. 부드러운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져왔다. 점점 더 아픔이 몸을 눌러왔다. 거기에 죽음의 무게까지 더해져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온 힘을 쥐어짜 동우를 향해 씩, 웃었다. 동우가 울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었다. 그게 뭐야, 하며 픽 웃었다. 시야가 흐려져 동우가 잘 보이지 않았다. 동우가 머리로 손을 올려 내 손을 꼭 잡았다. 그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호원아… 호원아아… 너무 아파아… 어떡해… 흐… 괜히… 내가 괜히 바다 가자고 졸라서…”
괜찮아, 이 한 마디가 나오지 않았다. 배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다. 눈이 점점 감겨왔다. 잠이 쏟아지는 것 인지, 애석하게도 내 입은 열릴 생각이 없는 듯 했다.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호원아, 이호원… 왜 그래… 눈 감지마아…… 호원아아…” 동우가 내 손을 더 세게 그러쥐었다. 손에 힘이 더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호원ㅇ… 이ㅎ……” 시야가 하얗게 흐려졌다. 동우도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 햇살같이 밝은 미소가, 웃음이, 예쁜 곱슬머리가,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 목소리도 아득히 멀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바스라지듯 그렇게, 아스라히 아득해졌다. |
말씀드린대로 짧네요 매우.......... 쓸때도 짧았으니 보실때도 짧기를ㅋㅋㅋㅋ
지루하지만 않으면 되죠 뭐.... 지루하다구요? 넹 ㅠㅠ....
글잡에 글 처음써보는데.... 가끔 재밌는거 있으면 들고 올게요~.~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