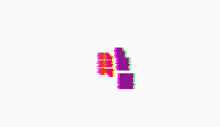신을 모셔라.
제가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싫습니다.
뒤돌아 걸어가는 택운의 몸이 휘청거렸다, 신이 나를 이리도 괴롭히는구나. 눈앞이 아득해져오고 몸에는 아무런 기운이 들지 아니하여도 그저 걸었다. 결국에는 그 신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버릴 저를 알지만서도 신을 모시기 싫었다. 제가 신을 모시게 된다면, 떠날 그가 눈에 밟혀 최대한을 버티려 악을 써보았다. 그래서인지 택운의 몸이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으며, 그 때문에 제게 커져버린 옷자락에 차갑고도 서러운 것이 자신을 휘감았다.
신이 저를 제 몸에 들이라 그리 발버둥 치셔도, 저는 아니합니다. 다른 몸을 찾아보시지요. 신과의 싸움이니 얼마 못가 죽거나 신을 모시게 되는 것 중 하나였다. 죽는 것은 불타죽는 듯하고, 사지가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주면서 저를 받으라 하는 신의 투정이겠지 그것이 신병으로 나타나 지금 제 자신을 괴롭히고. 한발 한발 내딛는 발에 가시밭길보다 더한 느낌이 전해져온다. 아릿한 그 느낌에, 눈을 감아보지만 눈을 감자 보이는 신의 모습에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만다.
당신은 이러한 제 몸이 무엇이 좋으셔서 저보고 당신을 모시라 하십니까, 야속하십니다. 그저 자신의 앞에 히죽거리는 신에 입술을 지그시 물었다. 입술 물지 마, 나를 모실 몸인데 조심히 여겨라. 이럴 때만, 자신이 필요할 때만 입을 열었다. 그에 그저 세게 입술을 물자, 그 주변의 붉은 기가 점점 사라져갔다. 붉은기가 사라지다 못해 하이얀 도화지같이 창백해지고 있었다. 자신의 신을 바라보는 택운의 눈빛에는 독이 넘쳤다. 그 넘치는 독이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갈 것임을 알지만 노려보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였을지도 모르겠다.
택운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몸을 눕히니 신은 더욱더 저를 괴롭히고 있었다, 가만히 누워있음이 틀림이 없는데 돌팔매질을 당하는 느낌에 손을 쥐어보니 끝이 저릿해왔다. 저릿한 느낌이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끝이겠구나 싶은 그 마음에 눈물이 고여 왔다. 차가운 바닥이 더욱이 저를 시리게 하였으며 사람이라고는 저 하나뿐인 공간이라 계속 아래로 저 깊숙이 가는 듯했다. 어쩌면, 저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하여 더 깊이 가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른다.
빗소리가 귓가에 닿을 때,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 저가 어릴 때 비를 맞고 태어난 까닭일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항시 전해 들으면 저는 붉디붉은 치맛자락에 쌓여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다고 한다. 가끔 그 치맛자락을 펴볼 때면 어머니의 향이 나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고향이 그리워지고는 한다, 이런 것이 향수이려나. 잠깐 안정을 가지는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못 했다. 신이 저를 다시 힘들게 하였다.
하지마시옵소서, 다른 몸을 찾아가시옵소서. 그리 빌어도 신은 계속 히죽거리며 웃을 뿐이었다. 오늘만 해도 얼마인가, 이 고통이. 제 몸이 불타는 고통이 자꾸만 느껴져오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였다. 언제 신이 자신을 받으라 투정을 부릴지는 신만이 아는 것이었다.
눈을 감으니 신은 날 보았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자 신이 나를 보다 재미없다는 듯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연유에서인지 눈이 편히 감기었고, 편히 잠에 들 수 있었다. 오랜만에 그를 만났다, 그를. 그곳에서 우리들은 예전과 같았다. 예전과 같이 서로를 보듬었다. 그 정이 오랜만이어서 무언가가 틈새를 비집어 나오려 했지만, 약한 모습이 싫어 그 무언가를 손등으로 훔쳐내었다. 일어나보니 허한 이 느낌에 차라리 신병이라도 일어 불타는 고통이라도 느껴보고자 하였지만 그것은 되지 아니하였다. 계속되는 허한 느낌에 옷을 차려입고 신을 신었다. 신은 마치 저와 닮았다며 임이 사주신 신이었다. 신과 신, 똑같은 말임에도 무엇이 이리도 다르더냐.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개구리 울음이 귓가를 가득 메워도 걸었다. 그렇게 도착한 문 앞에서 숨을 골랐고 문을 열었다.
자신을 막는 종들이 보여 나다, 내가 아닌가 소리쳐보아도 그저 나는 막혀있었다. 들여라, 라는 말이 공간을 타고 흘러나오자 제 자신의 벽이 사라졌다. 걸어들어가는데 임의 모습이 가득 차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지만 다가갔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것이 슬퍼 그저 바라보았다. 신을 독이 담긴 눈빛이 아닌 임을 바라보는 눈빛은 하나의 순수한 감정이 흘러내렸다.
왜 왔느냐, 내가 오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고개를 저어보았다, 그러면 저를 밀어내지 않을까 하여 방금의 이야기가 부정될까 하여. 임은 제게서 등을 돌리어 멀어지려 하였다. 가면 안 되옵니다, 소리치려는 입은 붙어 저를 막았다. 제 몸을 막는 여럿의 종보다 더 자신을 강하게 막았다. 분명히 안인데 지금 밖에서 바람과 풀을 맞으며 서있는 것 같았으며 시린 바람과 젖어버린 풀이 저를 아프게 내치는 듯했다.
신을 아직 모시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서 잠시 들렸습니다. 라는 입이 안에서 맴돌다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넓은 등이 작아지는 것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 만이 흘렀다. 신병에도 이리 울지 않던 저였는데, 임이라는 존재에 우는 저를 봐주십시오. 울음이 빗소리에 겹쳐들리지 않는 것인지 저를 보러 오지 않는 임이 그리도 미웠다, 그럼에도 아직 임을 그리워하는 제 자신이 임보다 미웠고 싫었다. 임의 흔적이 눈에 가득 찼지만 임은 없다. 임의 흔적이 남았으면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오. 임이 없는데.
임이 쓰시던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젖은 옷 때문인지 화선지에 물이 묻어 자꾸만 번져나가는 먹이 제 아린 마음 같아 괜히 먹먹해져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적었을까 이제야 번지지 않는 먹이 참으로 야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냥 묻고 싶었습니다. 하이얀 종잇장 위에 적은 글씨는 아주 고왔습니다, 임이 한자라도 못 보실까 열심히 적었습니다.
相思相見只憑夢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儂訪歡時歡訪儂 -내가 님 찾아 떠났을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願使遙遙他夜夢 -바라거니, 언제일까 다음날 밤 꿈에는
一時同作路中逢 -같이 떠나 오가는 길에서 만나기를
임이 그리운 마음을 담아 고이 접어 올려두었습니다, 아직도 내리는 비를 맞으며 저편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두고 가겠습니다.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조인성은 나래바 초대 거절했대
조인성은 나래바 초대 거절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