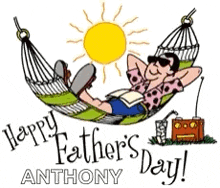전자레인지 수호대
w. 제 3의 치아
감자가 먹고 싶었다. 그저 그 뿐이었다. 아니, 실은 감자칩이 먹고 싶었다. 먹고 나면 입술과 손은 기름으로 번들거리고, 짭조름하고 바삭거리는 맛이 있는 감자칩(질소)을. 뭐든 상관 없었다. 그저, 감자칩 한 봉지면 맨발로 물웅덩이에 들어가 소금쟁이들과 물장구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선 막상 그렇게 되어버리면 누구보다 먼저 내뺄 거라는 걸 안다. 물론 부리나케 도망치는 내 손엔 감자칩이 있겠지. 어릴 적,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모여 올챙이를 잡고 있는 논으로 달려가기 위해 질척질척한 논두렁을, 무려 공주 슬리퍼로 지랄맞게 달려가다 넘어지던 그때처럼. 고개를 들었지만 눈이 마주치는 건 모르는 얼굴들의 당황어린 시선이었을 때에의 허무함과 쪽팔림을 어깨에 매달아 일어나지 못하던, 그때처럼.
그러나 나는 보았다. 지금껏 살면서 찍어본 적 없는, 최대치를 향해 올라가던 숫자들을. 그렇게 따지던 정확 어린 예의들은 어디로 가고, 혼란스럽게 뒤바뀌는 숫자들만 남은 것인지. 모서리 멱살을 쥐고 탈탈 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이 주인도 몰라 뵈는 망할 것 같으니라구! 지난 시간들은 시간이 아니었다 말하는 것이니. 너한텐, 나와의 정이 정두 아닌 게 되는 구나. 못된 것! 벌건 얼굴로 흘리던 구슬땀도 함께 나누었잖니! 너는, 내 밑에서, 힘겹게 나를 받아내었대두!
한바탕 울분을 토하고 나서야 다시 올라간 체중계 위로, 방금 과는 다르게 금방 나타나는…. Ctrl v+Ctrl c. 난생 처음 보는 숫자는 고개를 떨군 내게 이렇게 말했다.
Ctrl v+Ctrl c. 님 복붙 꺼지셈ㅋ.
…씨발.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니, 아닌 건가. 이미 도마 위엔 한 뭉텅이의 키친 타올이 있는데. 얇기가 다 다른 감자들은 여전히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나,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다, 잘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이 분명하다. 뜨뜻한 바람으로 실속있게 말라가는 감자들이 증거였다.
전분기를 빼라며 30분 정도 담궈 놓으라는 말에, 요즘은 시간도 아껴 써야 하는 걸 모르냐며. 남은 27분은 집 안 어딘가로 숨겨둔지 오래였다. 아마도 오빠 방 컴퓨터 속 발구지 폴더에 들어갔음이 분명했다. 그 폴더로 들어가면 발구지는 커녕, 마우스 커서조차 풀HD급 고화질이었으니까. 신의 영역으로 사라진 27분 덕에 남은 3분은 빠지려던 전분기가 다시 흡수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만큼, 미친듯이 물을 빨아들인 게 틀림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여러 번 물기가 닦아지고서도, 쟁반에 누워 물기 머금은 촉촉한 바디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3장의 키친 타올을 뜯어, 다시 한 번 쟁반 위를 톡톡 두드리며 닦아 내고 있노라면 문득 억울함이 물밀 듯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건 키친 타올인가, 행주인가. 심지어 손에 든 이것은 분명 빨아쓰는 타올도 아닌데. 누군가, '얘 신데렐라!' 하고 부르면 허겁지겁 달려가야 할 것 같았다. 가면 분명 아직도 걸레질을 하는 거냐며 화를 낼 것이 분명했다. 동화 속 계모와 언니들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했다. 유리 구두를 신었지만 사이즈가 작아, 내가 구두를 신은 건지 뭘 신은 건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구두가 맞지 않는 건 언니들일 텐데. 그럼 나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언니인 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찝찝한 떨떠름함은 곧장 방으로 향하게 했고, 어질러진 서랍 속에선 빨간 드라이기를 꺼내들었다. 이거면 충분하겠지. 먼지 가득한 콘센트에 코드를 꼽던 그 순간, 번쩍 터지던 구원의 빛이 참 아찔하단 생각과 함께.
으흐흫흥. 언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냐는 듯, 드라이기로 말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웃음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다. 정체 모를 흥얼거림에 들썩대며 적당하게 자른 종이 호일 위로 감자들을 펼쳐 놓았고. 그것을 타고 전자레인지에서 윙, 윙 돌아가는 감자들을 보니 전자파 따윈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전자파로 쌍 따귀를 맞는다고 해도. 지금 눈 앞에서 감자가, 감자칩이 되어 가고 있는데! 내 밥그릇엔 벌써 한 판의 감자칩이 있는데!
이건 존나 혁명이야! 와하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렁찬 웃음과 함께 들리는 팡, 소리에 순간 모든 것이 멈춰지고. 놀란 눈을 하고 있으면 맡기만 해도 쓴 탄내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와 더불어 왜인지, 불이 꺼진 전자레인지는 도통 반을을 보이질 않는다. 뭐지? 뭐지? 혼란스러움에 코를 벌름대며 전자레인지 앞으로 다가갔다. 혹시 고장이라도 난 것일까, 벌써부터 얼얼한 등짝에 울상이 되어 있으면 대뜸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딴 혁명은 아무한테나 줘도 안 가져."
"감자칩, 그거 내가 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귀찮다는 듯 휙휙 젓는 손짓 후에 제자리에서 가뿐하게 돌아가는 백텀블링과 함께 사방으로 흩날리는 정체 모를 가루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줄 알았던 가루들이 눈과 콧구멍 안으로 들어올 듯 요동쳤다. 잠시 고개를 돌려 눈을 꼬옥 감았다.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듯 그렇지 않은 것에 슬그머니 눈을 뜨자, 턱 밑까지 차오른 감자칩이 보였다.
"미친, 세상에…"
"이 정도는, 뭐."
정신 나간 채, 행해지는 감탄에도 뿌듯한 얼굴을 해보인다. 표정이 다 드러나는 얼굴이 참 오밀조밀 하단 생각이 들었다. 신이 난 것인지 들뜬 것인지는 몰라도 다시 한 번 백텀블링을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이 꼭 통통 튀어오르는 작은 공 같았다. 꼬마애들이 노는 볼풀의, 작은 공. 작은, 공…. 작은…. 공?
"헐."
"응?"
그러고 보니 이 남자, 체구가 아담해도 너무나 아담하다. 아니, 이건 아담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다. 제 발 아래까지 아슬아슬하게 차오른 감자칩 하나를 양 손 가득 쥐고는 그대로 반을 쪼개서 먹기까지 한다. 적당한 크기의 감자칩 하나로 몸의 1/2가 가려진다. 나는 그걸로 내 입술을 가리는데, 남자는 숨바꼭질을 한다. 어쩌다 건지는 대박 감자칩들 사이로 들어가면, 못 찾겠다 꾀꼬리! 를 수도 없이 외쳐야 할 것 같았다. 그만큼 작았다, 남자는.
그래서 허공에도 뜨는 건가 싶으면 등 뒤로 연신 파닥이는 날개가 보였다. 어찌나 작은지 쌀 한 톨씩을 등 뒤에 붙여 놓은 것 처럼 보였다. 남자는 작았지만 날개는 더 작았다. 그러나. 날개가 작으니, 남자가 커보였다. 신기한 일이었다.
다 먹지도 못할 것 같던 감자칩을 금세 뚝딱 해치운 남자가 다시 감자칩 하나를 또 손에 들었다. 방금 전과 같이 두 개로 나뉘어진 감자칩 사이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너무 중앙에 있으니 눈이 몰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럼 남자는 도망을 갈 지도 모른다. 충격이 배로 갈지도 모른다.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려야 했다.
"먹어."
아, 아…. 세상에. 남자가, 감자칩을 입가로 내민다. 벌써 한 손에 든 제 감자칩은 한 입 크게 오도독 베어 물고는 우물거리며, 반대편 손의 감자칩을 내민다. 먹을 걸 준다, 남자가. 나도 안 주는 먹을 것을 남자는 서스럼 없이 건넨다. 저 밑부터 찌르르하게 올라오는 감동으로 받아 먹을 생각은 않고 멍하게 있으면 손수 입에 넣어주기까지 한다. 남자는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경계 아닌 경계가 풀리고 나서야 문득, 온 몸에 채이는 감자칩들이 느껴진다. 행복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이것이 평생 먹을 감자칩이라고 해도 상관 없다. 나중엔 어떻게든 만들어 먹으려 할 테니.
"안 돼."
"예?"
"만들어 먹지 마."
뭐, 뭐를…?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아?"
미친, 혹시 독심술도 할 줄 아는 건가. 머릿털이 괜히 쭈뼛서는 기분이 들었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붉어진 게 아니라, 정말 들켜서 얼굴엔 빨갛게 열이 달아올랐다. 내 마음은 알아도 쓸 데가 없는데!
"지금 있는데."
세상에, 진짜다. 진짜로 하는 구나. 손에 묻은 가루를 털어내려, 두 손을 꼼지락 거리는 남자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서도 발에 채이는 감자칩들을 하나씩 툭툭 차댄다. 꼭 혼이 나 풀죽은 아이 같은 모양새였다. 가방끈을 꽉 쥐고는 운동화 앞코에 닿는 돌멩이들은 죄다 걷어 차버리는. 다행히 떨어질 곳이 없어 멀리 나간 갑자칩은 다른 곳의 위로 톡톡 떨어진다. 어느 것 하나에도 쉽게 눈을 떼지 못 하면, 남자는 톡이 아닌 툭. 으로 말을 던졌다.
"너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날 뻔 했어."
모를 리가 없다. 눈앞에서 작동을 멈춤과 동시에 전원이 나가버렸는데. 작게 끄덕이는 고갯짓에 한숨을 푹 내쉰다.
"고장이 나면 다른 집 전자레인지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왜, 요?"
"여기가 좋으니까."
음, 음. 몰랐는데, 이 남자 은근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다. 날개가 달려 있으니 발이 움직이지 않아도 알아서 다 되는 건가 보다. 이리 슉, 저리 슉. 그러다 고개를 들어 슬그머니 눈치를 보는 듯 하는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였다. 남자의 손에 코가 붙잡힌 것은.
"너는 나랑 같은 감자칩을 먹었어."
"아, 저기…."
"이제 나랑 너는 한 편이야."
"저, 조긍만."
"잘 부탁해."
"에, 예?"
이제 우리는 같이, 전자레인지를 지키면, 되는 거야.
* * *
얼마 전에, 감자칩을 만들겠다며 썰어서 물기까지 다 뺀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계속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요. 그랬더니 전원이 나가버리길래 순간 식은땀이 확 나는데, 그렇게 당황했던 건 요 근래 처음이었을 거예요. 혹시 몰라 코드를 뽑아 두고 한참 있다가 다시 켰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구요. (감격)
결론은, 전자레인지도 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열을 계속 받아서 전원이 나갈지도 모릅니다.
웃음이 예쁘다...!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TeamB/진환] 전자레인지 수호대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c/9/3/c934c3559d5ecc559a3d1b247078c87d.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