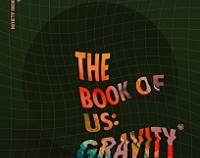▲ Listen in browser click!
꼭 아스라한 낭떠러지 아래를 목전에 두고 간신히 되살아난 기분이었다. 그저 이진혁, 이 한 사람 덕분에. 이러니까 꼭 그가 구한 게 내 목숨 같아진다.
"…많이 기다렸지, 자기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뛰어온 건지 가늠조차 쉽지 않은 얼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그런 얼굴을 해서는 굳이 '자기'라는 말을 몇 번은 더 했다.
자기야, 자기야. 누군가 확인 시켜주고픈 사람을 옆에 둔 사람처럼 몇 번이고 더.
바람에 온통 헝클어진 머리칼과 그 머리에 맺힌 땀. 그의 지금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말없이 눈에 담았다. 포스기 누르는 법도 까무룩 잊어버리게 만드는 저 단호하고 눅눅한 시선. 누차 어르고 달래 꾹꾹 눌러 놓았던 눈물이 그 모습 한 번에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눈물이란 건 원래, 수십 가지의 치욕보다 단 하나의 고마움에 더 빨리 반응한다는 그 사실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안 가요?"
날 보고 있던 고개를 돌연 돌린다. 망부석이 된 놈을 빤히 마주한다. 그런 그가 조용히 턱짓하며 말했다. 예쁜 눈썹에 잔뜩 굴곡이 졌다. 차갑다 못해 서늘했다. 목소리도, 눈빛도. 단번에 얼어붙은 표정.
"아, 그럼…나 가, 갈게."
늘어놓는 말마다 한 대 아니, 스무 대는 더 넘게 냅다 패 놓고 싶던 놈이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한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천천히 느긋하게, 그러나 뭐든 놓치는 법이 없는 이진혁의 서슬 퍼런 두 눈을 버틸 깜도 안 되던 그 인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 치다 사라졌다. 그가 사라져버린 출입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나는 속으로 울었다.
불현듯 멍이 든 속이 마구 욱신거리는 느낌. 그건 일종의 자괴감이었다. 내가 저런 대도 않은 인간을 좋아했다는게, 저 지경의 사람을 정신까지 뒤흔들릴 정도로 사랑했다는 그 빌어먹을 사실이 슬프다 못해 쓰라렸다. 나는 자꾸만 손에 쥐고 있던 화살을 스스로 내 가슴팍에다 꽂았다. 기어이 피를 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쿨해지는 건 역시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
멍청해진 눈으로 멀리 문 근처를 속절없이 바라보던 내가 돌연 정신을 붙잡게 된 건, 조용히 흐르던 내 시야에 딱 걸린 이진혁 그의 손목 어딘가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피딱지 엉긴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얄따란 손등이 어쩐지 눈에 계속 밟혀서.
나는 곧장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새 반쪽이 된 얼굴. 충혈된 두 눈. 어딘가 심상치 않은 내 시선을 그새 느낀 그가 우물쭈물 제 손목을 주머니속으로 푹 찔러 넣곤 공연히 입술을 비죽였다. 삽시간에 어딘가 어색해진 모양새. 멋쩍은 듯 목덜미를 벅벅 긁는 일은 자연히 그 반대 손의 몫이었다.
"그거…왜 그,"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려 했다. 묻고 싶었다. 나도 걱정이란 걸 해보고 싶어서. 그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게 지금 내가 해야할 일 같았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이 내게도 생겼으니까.
"아니, 여주씨 괜찮아요? 손봐봐요."
그래봤자 바보 천치가 따로 없는 나는 늘 걸음이 느렸다. 누가 먼저 걱정하나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질세라 급히 입술을 떼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저기,"
"괜찮아? 피나는데."
하나도 안 괜찮은 얼굴로 나더러 괜찮냐 연신 묻는다. 고작 바늘에 찔린 내 손 보다 몇 배는 더 시원찮은 안색으로 내 안위나 신경 쓴다. 걱정은 오롯이 자기 몫인 것처럼 그저 열 뻗친 얼굴로, 피 요만큼 난 내 손가락을 제 손에 가만히 쥐고 있을 뿐이다.
"어디 봐요, 아파요?"
내 손 꼭 쥔 그가 뱉은 문장의 모든 주어는 나였다. 지금 그에게 반창고로 둘러싼 허연 팔목이나 어딘가 까칠해진 제 안색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죄다 털어내고 남은 건 날 향한 안부뿐이었다.
"약은. 아니, 어쩌다가 그랬어,"
연거푸 묻고 묻는다, 내 안부를. 머릿속엔 온통 그거 하나다.
그래서 나는, 이참에 얼른 용기를 내보기로 한다.
"진혁씨."
아니, 내야만 했다. 생전 안 하던 짓을 한 번 해보려는 그런 용기.
"어디…아파요?"
"?"
"그, 얼굴이 안…좋은 것 같은데,"
온통 내 걱정뿐인 그를 걱정하는 일. 내가 만약 초등학생이었다면 알림장 1번 칸에다 두고 두고 적어뒀을 그 일을. 몇 분이라도 더 일찍 물었어야 할 질문을 이제야 했다. 기역 니은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처럼 더듬거리며 말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도 걸음마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늦었지만 내겐 상당한 발전이었다.
내 문장에 물음표가 채 찍히기도 전에 2배는 더 커진 동공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가 내놓은 답이란 그래봤자
"나는 괜찮아,"
"…,"
"여주씨는요."
그저 자긴 괜찮다는 말이 전부였지만, 몇 번을 더 되물어도 결국 나는 어떻냐는 그 말뿐이었지만 어쨌든.
"뭐가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여기 연고 같은 거 있어요?"
"아니,"
도돌이표 씌워 놓은 '괜찮다'라는 그 말. 하마터면 한숨으로 카페 바닥을 내려 앉힐 뻔했다. 진짜 이진혁. 바보같이.
내가 버릇처럼 달고 살던 말인데, 듣다 보니 괜히 내가 성질이 났다. 열받았다. 누군가 시들시들 아픈 게 이토록 마음 쓰이다 못해 속이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일이었다는 걸 난생 처음 깨달은 거다. 이 사람 덕분에, 처음 있는 일이 많아졌다.
버릇처럼 아랫입술을 꽉 깨문 내 앞에 선 그가 느닷없이 피식하고 웃는다. 빼빼 마른 얼굴에 보조개가 참 깊게도 패였다. 덕분에 배 안속까지 갑갑해진 내 속 하나 모르고. 웃을 포인트도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눈꼬리가 아주 휘어지도록 몇 번 더 웃었다. 그것도 울그락 붉으락 화났다 슬펐다 혼자 다 하는 나를 보면서.
"지, 지금 웃음이 나와요?!"
나는 겁도없이, 도끼눈을 뜨고서 그 허연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못 웃을 게 뭐 있어요,"
"…?"
"여주씨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
꺄르르 이진혁이 이번엔 대놓고 웃었다. 뱉은 근사한 말에 대한 자부심이 만든 웃음인지, 말해놓고 본인도 민망스러워 흘린 웃음인지 알 수 없었다. 웃음 띤 얼굴로 슬쩍 던지듯 말했다. 잔잔하게 던진 공인 줄 알았는데, 받고 보니 광속구였다. 휘청했다. 덕분에 나는 호기롭게 뜬 눈을 다시 떨궈야했다. 이길 생각도 없었지만 이길 생각도 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하는 그의, 그만의 문장들.
"누, 누가 들음 어쩌려고, 진짜…"
얼굴이 금세 화끈거린다. 괜히 미어캣이라도 된 것처럼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폈다. 정말 못 들은 건지 두 귀로는 못 들어줄 낯간지러운 얘기라 애써 못 들은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다들 제 할 일 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눈치 보느라 여기저기 위태로이 굴러가던 시선이 마침내 그의 푸석한 얼굴 위로 종착했다. 그의 두 눈을 마주한다. 시선이 닿은 걸 알고서, 그가 말했다.
"그럼 퇴근하고 마저 할 게요."
"그게 무슨,"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혔다. 사소한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내 머릿속 스위치를 꺼뜨려 놓는다는 걸 이 사람이 알까. 알고 하는 말일까.
"그럼, 나 갈게요."
"저…"
"약 고마워요, 다 나았어."
아닌데, 모르는 것 같은데.
그가 반쪽이 된 얼굴을 다 가릴법한 널찍한 손을 좌우로 팔랑거리며 옅게 웃었다. 매장 협탁 어딘가에 쳐박혀 있을 그 흔한 종합감기약하나 주지 못했는데, 약은커녕 안부를 묻는 것조차 허둥지둥 어리숙했던 난데. 그런 내게 느닷었이 고맙다 한다. 내 덕에 다 나았다고.
잘 가라고 하거나, 무어라 고맙다고 하거나. 그것도 정 안되면 카페 매뉴얼대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인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 못 알아 들어 그랬다. 그가 두고 간 그 한 줄을 앞에다 놓고서 두고 두고 생각했다.
혹시 내가 제 약이라도 되는 걸까. 그래서 한 말일까. 어쩌면 나도 그런데.
"이따 봐요, 연락 할게."
그러더니 이내 돌아갔다. 커피 한 잔 시키지도 않고 그는 갔다. 정말 내가 걱정돼서 급히 온 사람처럼. 그 이유가 전부였던 사람처럼.
멀리 작아지는 그의 동그란 뒷통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묻지 못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도 묻지 못했고 그래서 매번 오던 두 시를 훌쩍 넘겼던 건지도 나는 묻지 못했다.
그만 제 여자친구 얼굴 좀 보게.
그 말이 담은 의미 또한 커다란 물음표로 가슴에 남았고,
누구야, 자기야.
'자기'란 단어가 가진, 그 의미의 크고 작음 역시도 못 물어봤다.
하는 말꼬리마다 눅눅한 다정함이 뚝뚝 묻어나는 말들을, 내 헛헛한 구멍을 죄다 핑크색으로 색칠해놓는 그 문장들을 두 귀로 듣고도 그저 불안해했다. 보고 듣고 느끼고도, 확인받을 때까진 마음을 영 놓지 못하는 건 내 지긋지긋한 고질병이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 일이란 게, 출발선 앞에 선 심판의 휘각 소리가 들리면 그때야 시작되는 레이스도 아닌데. '준비, 시작!' 소리가 들려야만 시작인 걸 아는 초등학생처럼 나는, 아직 무어라 딱 규정하지 않은 우리의 사이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여름날의 다람쥐를 좋아하세요?
07. 그것도 평생.
오후 내내 이진혁 그의 얼굴을 머리 한가운데다 띄워 놓은 채로 일했다. 평소에도 늘 귀소본능만 앞선 탓에 집에 가고 싶어 늘 입에 가시가 돋칠 지경이었는데, 그의 개운치 않은 얼굴을 두 눈으로 봐버린 마당에 일이 눈에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었다. 주문 실수도 몇 건을 더 냈고 만들다 쏟은 음료만 몇 잔이 더 됐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일이 이런 거라면, 나는 숨 쉬는 것보다 더 잦게 그를 생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 왔어요."
이진혁에 관한 잡념이 한 가득이었던 하루 일과가 끝나고, 터덜터덜 카페를 나서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김없이 그의 검은색 차였다. 보닛에 가만히 기댄 모습이 오늘은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인다. 좀 쉬지 기어이 또 차를 끌고 왔느냐고 마음에도 없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내게 그가 버릇처럼 또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아냐, 오늘은 다쳤으니까 차 태워 보내야 돼요."
참나. 고작 명찰 뒷면에 찔려 피 몇 방울 찔끔한 게 걷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통 알 수가 없다.
아니다. 다친 게 손가락 말고 '마음'을 말하는 건가. 그런 거라면 오늘 좀 힘들긴 힘들었는데.
한동안 쭈뼛거리다 열린 조수석으로 머리통을 비집었다. 발을 모으고 앉았다. 여느 때처럼 내가 탄 걸 확인한 그가 다시 운전석에 올랐다. 그걸 알까. 저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나는 덜컥 얹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늘로 엄지를 몇 번이고 찔러도 내려 가지 않을 것처럼 꽉 막혀가지곤.
우물쭈물 벨트를 당겨 매려는 내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온다. 휘둥그래진 두 눈. 덩달아 고개가 절로 기울어졌다.
"지금 이게 다…뭐예요?"
그와 나 사이에 놓인 콘솔박스에 약품 뭉탱이가 아주 한가득이다. 엥. 순간, 나는 무슨 구급차를 탄 줄 알았다니까. 뼈가 진탕 나가야 겨우 쓸 법한 두꺼운 흰색 붕대라던가, 새빨간 소독약이 몇 통씩은 되는 데다 바르는 허연 연고도 그 종류만 열 가지가 넘었다.
"그야…여주씨 다쳤잖아요."
두 눈 가득 물음표를 매달고 묻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물을 걸 물으라는 듯 슝늉마냥 싱거운 표정이다. 어쩜 저런 단순한 대답이 다 있는지. 어이가 없어서 자꾸만 헛웃음이 제동을 걸려 하는 내 속은 모른 채 열심히 밴드 꾸러미를 뜯기 시작한다. 분주했다. 그게 다 뭐라고, 세상 열중할 때마다 나오는 좁아든 미간을 가만히 본다. 마냥 어른스럽다가도 드문드문 애 다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손 조금 찔린 거 갖고 누가 붕대를 감아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연고 뚜껑을 열고 뚜껑 뒤축으로 입구를 뜯는다. 손 줘봐요. 물음에 답하기도 전에 덥석, 그의 차가운 손이 다가와 내 다친 손을 데려간다. 대답을 들으려 건넨 물음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내 손을 그에게 맡겼다.
핏자국 엉겨 붙은 상처에 연고를 발라 주고 꽤 널찍한 밴드를 뜯어 꼼꼼히도 붙여 준다. 물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는 세심한 잔소리도 잊지 않고 전했다. 어깨 한 쪽이 아예 빠져야 겨우 쓸 법한 그 두꺼운 붕대는 쓰이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 해야할까.
"누구한텐 조금이 조금이 아니니까 그러지."
내 손을 쥔 그가 대답했다. 밴드 발린 내 상처 위를 제 곧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이나 매만졌다. 진득한 연고가 발린 건 이 손가락인데, 꼭 내 가슴팍 어딘가에도 그가 손수 붙여준 밴드가 가만히 올려져 있는 기분이었다.
그가 잔잔하게 만져주던 밴드 윗부분을 똑같이 매만졌다. 기분 탓인가 시큰하던 자리가 조금은 누그러든 것 같기도 하고.
"병원은…,"
"어?"
"병원, 간 거에요?"
이번엔 내 차례였다. 개운치 못한 얼굴로 벨트를 고쳐 매려는 그에게 내가 물었다. 혼자 살다가 이대로 혼자 세상을 등질 것 같던 내가 남 아픈 걸 이토록 걱정하고 있다니, 나조차도 이런 내가 낯설 지경이었다.
"나 왜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냐,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
아무렇지 않은 척 맨들맨들한 턱을 쓰담쓰담 매만지고 있던 그에게 홱 하고 쏘아붙였다. 절로 입술이 깨물렸다. 걱정 몇 번에 입술이 남아날 생각을 안했다. 나를 발견한 그가 별안간 씨익 웃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심각한데, 이런 것 갖고 지금 웃을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웃어요, 진짜."
"아니…그냥."
"…,"
"계속 아프고 싶다 하면, 화낼 거죠? 그럴 것 같았어."
"네?"
진짜 어디 많이 아픈가. 저리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나 늘어놓고. 마음 같아선 저 동그란 이마를 손 쭉 뻗어 한 번 만져보고 싶었다. 혹시 아무 말이나 나올 정도로 펄펄 열 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여주씨가 걱정하니까 좋아서요."
"…,"
"말도 많아지고."
그는 정확했다. 호기롭게 쏜 화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가슴팍 어딘가에 놓여 있던 과녁 한 가운데에 정확히 명중시킨다. 걱정을 빙자해 주절주절 수다스럽던 내가 돌연 말문이 턱 막혔다.
둘 사이를 아득히 매우는 그 고요를 단번에 깨뜨린건,
"아니다, 우리 그냥,"
…그냥?
여름날의 다람쥐를 좋아하세요?
07. 그것도 평생.
오후 내내 이진혁 그의 얼굴을 머리 한가운데다 띄워 놓은 채로 일했다. 평소에도 늘 귀소본능만 앞선 탓에 집에 가고 싶어 늘 입에 가시가 돋칠 지경이었는데, 그의 개운치 않은 얼굴을 두 눈으로 봐버린 마당에 일이 눈에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었다. 주문 실수도 몇 건을 더 냈고 만들다 쏟은 음료만 몇 잔이 더 됐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일이 이런 거라면, 나는 숨 쉬는 것보다 더 잦게 그를 생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 왔어요."
이진혁에 관한 잡념이 한 가득이었던 하루 일과가 끝나고, 터덜터덜 카페를 나서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김없이 그의 검은색 차였다. 보닛에 가만히 기댄 모습이 오늘은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인다. 좀 쉬지 기어이 또 차를 끌고 왔느냐고 마음에도 없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내게 그가 버릇처럼 또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아냐, 오늘은 다쳤으니까 차 태워 보내야 돼요."
참나. 고작 명찰 뒷면에 찔려 피 몇 방울 찔끔한 게 걷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통 알 수가 없다.
아니다. 다친 게 손가락 말고 '마음'을 말하는 건가. 그런 거라면 오늘 좀 힘들긴 힘들었는데.
한동안 쭈뼛거리다 열린 조수석으로 머리통을 비집었다. 발을 모으고 앉았다. 여느 때처럼 내가 탄 걸 확인한 그가 다시 운전석에 올랐다. 그걸 알까. 저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나는 덜컥 얹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늘로 엄지를 몇 번이고 찔러도 내려 가지 않을 것처럼 꽉 막혀가지곤.
우물쭈물 벨트를 당겨 매려는 내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온다. 휘둥그래진 두 눈. 덩달아 고개가 절로 기울어졌다.
"지금 이게 다…뭐예요?"
그와 나 사이에 놓인 콘솔박스에 약품 뭉탱이가 아주 한가득이다. 엥. 순간, 나는 무슨 구급차를 탄 줄 알았다니까. 뼈가 진탕 나가야 겨우 쓸 법한 두꺼운 흰색 붕대라던가, 새빨간 소독약이 몇 통씩은 되는 데다 바르는 허연 연고도 그 종류만 열 가지가 넘었다.
"그야…여주씨 다쳤잖아요."
두 눈 가득 물음표를 매달고 묻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물을 걸 물으라는 듯 슝늉마냥 싱거운 표정이다. 어쩜 저런 단순한 대답이 다 있는지. 어이가 없어서 자꾸만 헛웃음이 제동을 걸려 하는 내 속은 모른 채 열심히 밴드 꾸러미를 뜯기 시작한다. 분주했다. 그게 다 뭐라고, 세상 열중할 때마다 나오는 좁아든 미간을 가만히 본다. 마냥 어른스럽다가도 드문드문 애 다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손 조금 찔린 거 갖고 누가 붕대를 감아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연고 뚜껑을 열고 뚜껑 뒤축으로 입구를 뜯는다. 손 줘봐요. 물음에 답하기도 전에 덥석, 그의 차가운 손이 다가와 내 다친 손을 데려간다. 대답을 들으려 건넨 물음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내 손을 그에게 맡겼다.
핏자국 엉겨 붙은 상처에 연고를 발라 주고 꽤 널찍한 밴드를 뜯어 꼼꼼히도 붙여 준다. 물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는 세심한 잔소리도 잊지 않고 전했다. 어깨 한 쪽이 아예 빠져야 겨우 쓸 법한 그 두꺼운 붕대는 쓰이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 해야할까.
"누구한텐 조금이 조금이 아니니까 그러지."
내 손을 쥔 그가 대답했다. 밴드 발린 내 상처 위를 제 곧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이나 매만졌다. 진득한 연고가 발린 건 이 손가락인데, 꼭 내 가슴팍 어딘가에도 그가 손수 붙여준 밴드가 가만히 올려져 있는 기분이었다.
그가 잔잔하게 만져주던 밴드 윗부분을 똑같이 매만졌다. 기분 탓인가 시큰하던 자리가 조금은 누그러든 것 같기도 하고.
"병원은…,"
"어?"
"병원, 간 거에요?"
이번엔 내 차례였다. 개운치 못한 얼굴로 벨트를 고쳐 매려는 그에게 내가 물었다. 혼자 살다가 이대로 혼자 세상을 등질 것 같던 내가 남 아픈 걸 이토록 걱정하고 있다니, 나조차도 이런 내가 낯설 지경이었다.
"나 왜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냐,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
아무렇지 않은 척 맨들맨들한 턱을 쓰담쓰담 매만지고 있던 그에게 홱 하고 쏘아붙였다. 절로 입술이 깨물렸다. 걱정 몇 번에 입술이 남아날 생각을 안했다. 나를 발견한 그가 별안간 씨익 웃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심각한데, 이런 것 갖고 지금 웃을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웃어요, 진짜."
"아니…그냥."
"…,"
"계속 아프고 싶다 하면, 화낼 거죠? 그럴 것 같았어."
"네?"
진짜 어디 많이 아픈가. 저리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나 늘어놓고. 마음 같아선 저 동그란 이마를 손 쭉 뻗어 한 번 만져보고 싶었다. 혹시 아무 말이나 나올 정도로 펄펄 열 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여주씨가 걱정하니까 좋아서요."
"…,"
"말도 많아지고."
그는 정확했다. 호기롭게 쏜 화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가슴팍 어딘가에 놓여 있던 과녁 한 가운데에 정확히 명중시킨다. 걱정을 빙자해 주절주절 수다스럽던 내가 돌연 말문이 턱 막혔다.
둘 사이를 아득히 매우는 그 고요를 단번에 깨뜨린건,
"아니다, 우리 그냥,"
…그냥?
여름날의 다람쥐를 좋아하세요?
07. 그것도 평생.
오후 내내 이진혁 그의 얼굴을 머리 한가운데다 띄워 놓은 채로 일했다. 평소에도 늘 귀소본능만 앞선 탓에 집에 가고 싶어 늘 입에 가시가 돋칠 지경이었는데, 그의 개운치 않은 얼굴을 두 눈으로 봐버린 마당에 일이 눈에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었다. 주문 실수도 몇 건을 더 냈고 만들다 쏟은 음료만 몇 잔이 더 됐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일이 이런 거라면, 나는 숨 쉬는 것보다 더 잦게 그를 생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 왔어요."
이진혁에 관한 잡념이 한 가득이었던 하루 일과가 끝나고, 터덜터덜 카페를 나서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김없이 그의 검은색 차였다. 보닛에 가만히 기댄 모습이 오늘은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인다. 좀 쉬지 기어이 또 차를 끌고 왔느냐고 마음에도 없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내게 그가 버릇처럼 또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아냐, 오늘은 다쳤으니까 차 태워 보내야 돼요."
참나. 고작 명찰 뒷면에 찔려 피 몇 방울 찔끔한 게 걷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통 알 수가 없다.
아니다. 다친 게 손가락 말고 '마음'을 말하는 건가. 그런 거라면 오늘 좀 힘들긴 힘들었는데.
한동안 쭈뼛거리다 열린 조수석으로 머리통을 비집었다. 발을 모으고 앉았다. 여느 때처럼 내가 탄 걸 확인한 그가 다시 운전석에 올랐다. 그걸 알까. 저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나는 덜컥 얹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늘로 엄지를 몇 번이고 찔러도 내려 가지 않을 것처럼 꽉 막혀가지곤.
우물쭈물 벨트를 당겨 매려는 내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온다. 휘둥그래진 두 눈. 덩달아 고개가 절로 기울어졌다.
"지금 이게 다…뭐예요?"
그와 나 사이에 놓인 콘솔박스에 약품 뭉탱이가 아주 한가득이다. 엥. 순간, 나는 무슨 구급차를 탄 줄 알았다니까. 뼈가 진탕 나가야 겨우 쓸 법한 두꺼운 흰색 붕대라던가, 새빨간 소독약이 몇 통씩은 되는 데다 바르는 허연 연고도 그 종류만 열 가지가 넘었다.
"그야…여주씨 다쳤잖아요."
두 눈 가득 물음표를 매달고 묻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물을 걸 물으라는 듯 슝늉마냥 싱거운 표정이다. 어쩜 저런 단순한 대답이 다 있는지. 어이가 없어서 자꾸만 헛웃음이 제동을 걸려 하는 내 속은 모른 채 열심히 밴드 꾸러미를 뜯기 시작한다. 분주했다. 그게 다 뭐라고, 세상 열중할 때마다 나오는 좁아든 미간을 가만히 본다. 마냥 어른스럽다가도 드문드문 애 다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손 조금 찔린 거 갖고 누가 붕대를 감아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연고 뚜껑을 열고 뚜껑 뒤축으로 입구를 뜯는다. 손 줘봐요. 물음에 답하기도 전에 덥석, 그의 차가운 손이 다가와 내 다친 손을 데려간다. 대답을 들으려 건넨 물음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내 손을 그에게 맡겼다.
핏자국 엉겨 붙은 상처에 연고를 발라 주고 꽤 널찍한 밴드를 뜯어 꼼꼼히도 붙여 준다. 물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는 세심한 잔소리도 잊지 않고 전했다. 어깨 한 쪽이 아예 빠져야 겨우 쓸 법한 그 두꺼운 붕대는 쓰이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 해야할까.
"누구한텐 조금이 조금이 아니니까 그러지."
내 손을 쥔 그가 대답했다. 밴드 발린 내 상처 위를 제 곧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이나 매만졌다. 진득한 연고가 발린 건 이 손가락인데, 꼭 내 가슴팍 어딘가에도 그가 손수 붙여준 밴드가 가만히 올려져 있는 기분이었다.
그가 잔잔하게 만져주던 밴드 윗부분을 똑같이 매만졌다. 기분 탓인가 시큰하던 자리가 조금은 누그러든 것 같기도 하고.
"병원은…,"
"어?"
"병원, 간 거에요?"
이번엔 내 차례였다. 개운치 못한 얼굴로 벨트를 고쳐 매려는 그에게 내가 물었다. 혼자 살다가 이대로 혼자 세상을 등질 것 같던 내가 남 아픈 걸 이토록 걱정하고 있다니, 나조차도 이런 내가 낯설 지경이었다.
"나 왜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냐,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
아무렇지 않은 척 맨들맨들한 턱을 쓰담쓰담 매만지고 있던 그에게 홱 하고 쏘아붙였다. 절로 입술이 깨물렸다. 걱정 몇 번에 입술이 남아날 생각을 안했다. 나를 발견한 그가 별안간 씨익 웃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심각한데, 이런 것 갖고 지금 웃을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웃어요, 진짜."
"아니…그냥."
"…,"
"계속 아프고 싶다 하면, 화낼 거죠? 그럴 것 같았어."
"네?"
진짜 어디 많이 아픈가. 저리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나 늘어놓고. 마음 같아선 저 동그란 이마를 손 쭉 뻗어 한 번 만져보고 싶었다. 혹시 아무 말이나 나올 정도로 펄펄 열 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여주씨가 걱정하니까 좋아서요."
"…,"
"말도 많아지고."


 초록글
초록글![[프로듀스/이진혁] 여름날의 다람쥐를 좋아하세요? 07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9/08/18/22/910edb64bc7941f83be035099e050285_mp4.gif'))
![[프로듀스/이진혁] 여름날의 다람쥐를 좋아하세요? 07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_thumb/2019/08/18/22/910edb64bc7941f83be035099e050285_mp4.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