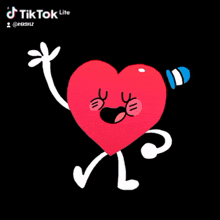내 실제 경험 바탕으로 한 글이고 ‘설렜던 경험 써보자’ 이런 글에 끄적였던 건데 연예인을 대입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적어봤어!
@@긴 글 주의@@
@안 설렐 수도 있음 주의@
——————————————————————
1.
‘딩- 동- 댕- 동-‘
여느 때와 같이 점심시간 예비종이 울렸고 여느 때와 같이 옆 반 친구가 책을 빌리러 왔다. 쟤는 교과서를 산 거야 만 거야.
“야~~~~~~~”
- 뭔데. 이번 시간은 뭔데 또. 과학?
“국어! 국어 교과서!”
- 저걸 죽여 살려 진짜...이젠 양심도 없나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물함으로 가 손을 뻗는 순간, 딱 그 찰나였다.
“야!”
자리에 앉아 있던 네가 다급히 달려와 내 앞에 섰다.
“허어..너무 놀라가지고..뛰어와서..아흐 깜짝이야”
- 뭐 얼마나 멀다고...왜?
왜 그렇게 달려왔냐는 내 질문에도 넌 히죽 웃으며 말을 돌렸다.
“흐음~ 오늘 되게 덥다, 그치?”
- 어..근데 나 지금 친구 책 빌려줘야 되는데 잠깐 나와주라
“응? 책? 아~ 교과서~ 국어?”
고개를 끄덕이며 네 뒤로 보이는 사물함 손잡이를 잡았다. 너에게도 분명 뒷 문에 서있는 저 친구의 재촉이 들릴 텐데, 왜 자꾸 내 앞을 막아서는 건지 모르겠다. 서너 번 은근슬쩍 사물함에서 날 떼어내는 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 차은우. 나 약간 짜증나려고 해, 지금
내 말에 넌 어쩔 줄 몰라하며 옆으로 스윽 비켜섰다. 진작 비켜주지. 네가 이렇게 짓궂은 아이가 아니란 걸 알기에 더 이상하기만 했다.
사물함을 열어 국어 교과서를 꺼내는 순간, 네가 외쳤다. 그리고는 이내 나의 표정을 읽으려는 듯 힐끔거렸다.
“나!! 나도!! ...나도..네 교과서 빌리려고 했었는데..오늘 책검사하잖아!”
책 필기 검사가 오늘이었나? 내가 날짜를 착각한 건가? 항상 필기는 해왔으니 별 상관은 없긴 하지만 당연히 다음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몇 분 전부터 저기 서있던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너에게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 좀 전에 쟤가 먼저 빌려달라고 했어서..미안ㅎ-
“야, 너네 책 검사 오늘이야? 그럼 나 다른 반 애한테 빌릴게, 나 간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 이거 누가 안 빌려가지? 그치?”
- ..네가 방금 빌려달라고..
“응? 아하하...근데 생각해보니까 검사가 다음주더라고..
타이밍 안 좋게 친 수업 시작 종때문에 화를 낼 수 없었다. 누가 큰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다. 아까부터 이상했던 게 분명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국어 교과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너를 비롯한 잡생각으로 5교시를 보냈다. 한 교시를 꽉 채울 만큼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
넌 내게 왜 그런 장난을 친 걸까. 장난이 맞긴 할까. 괴롭히고 싶었나. 네가 그럴 아이는 아닌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수업이 끝나자마자 네 자리를 찾아가 물었지만 너는 헤실거리며 정말 몰랐다는 말 뿐이었다.
“..화났어? 나 진짜 몰랐다니까~ 진짜야!”
그 대사로 10분을 버틴 네가 참 대단해보였다.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건가.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10분 내내 붙잡고 있던 게 괜히 미안해졌다.
6교시, 국어시간이었다. 책상 서랍에 넣어 둔 교과서를 꺼내 페이지 수를 찾는데 뒷 자리에 앉은 아이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야, 차은우가 너 불러”
내 뒷쪽으로 대각선 자리에 앉은 너에게 고개를 돌리니 네가 입모양으로 내게 무어라 말했다. 인상을 찌푸리며 못 들었다는 시늉을 하니 넌 작게 웃고는 이번엔 손가락까지 동원해서 속삭였다.
‘113쪽’
113쪽? 113쪽을 뭐 어쩌라는 건지. 펴보라는 건가 싶어 몇 장 넘기니 자그마한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다.
널 닮은 하늘색 포스트잇, 널 닮은 정갈한 글씨체
‘영화 보러 갈래?’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너무 놀라서.
너는 지금 날 보고있을까. 지금 내 표정은 어떨까.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 한 채 널 돌아봤다. 너는 또 입을 움직였다.
‘둘이서’
-
2.
우울했다. 뭐라 말 할 것도 없는, 평범하지만 좀 더 우울했던 그런 하루였다. 텅 빈 집에 들어가기 싫어 주변을 빙빙 돌다보니 비가 내렸고, 동시에 눈물이 흘렀다.
문을 열지 않은 작은 식당 천막 밑으로 들어가 쪼그려 앉아 비를 피했다. 눈물을 그렇게 흘려놓고, 얼굴을 그렇게 적셔놓고 비 맞는 건 싫었나 보다. 하필 또 날씨는 여름이어서, 하필 또 날짜는 8월이어서 말 그대로 폭우가 내렸다. 집에 가기 싫어 주저앉았는데 집이, 그 텅 빈 집이 그렇게 가고싶었다.
우중충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보고 있자니 우중충한 생각들만 떠올랐다. 안 그래도 요새 집 안 일들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이 엉켜져 풀어질 틈이 안 보였는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니 서러웠다. 겨우 그친 울음이 또 다시 터진다.
- ...짜증나
갖고 다니던 휴지도 다 써버려 온갖 짜증이 몰려오던 찰나였다.
당신이 내 옆으로 슥 다가왔다.
땅 끝까지 가라앉은 이 기분에, 울기까지 하고 있던 터라 당신은 안중에도 없었다.
몇 분 정도 내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당신이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친한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더 힘이 될 때가 있다. 당신은 내게 그런 존재였다.
“이거 쓰고 가요. 난 집이 코 앞이라서 괜찮아요”
당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길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우산을 내어준 건, 연민이었을까.
- 아니요, 감사하지만 제가 이걸 받으면 그쪽은 어떻게 가요. 괜찮아요
“말했잖아요, 집이 코 앞이라고”
- ...저 아세요?
“네?”
- 아니, 쌩 판 처음보는 사람 뭘 믿고 주시는 건지..비싸 보이는데 갖고 튀면 어쩌려고..
나름 진지하게 꺼낸 말인데 당신은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리고는 내 손에 긴 우산을 꽉 쥐어주었다.
“내일 저녁 6시. 그 때쯤에 여기 지나가는데 이 가게 문에 걸어놓고 가줄래요?”
차마 우산만 걸어놓고 돌아서기엔 감사인사도, 사과도 못 했기에 또 쭈그려 앉아 당신을 기다렸다.
“어? 기다렸어요?”
- 네.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요.
내 말에 당신은 싱긋 웃으며 물었다. 그리고는 이내 내 표정을 살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당신은 근처 고등학교 교사였고, 한창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였는지 주저앉아 빗 속에서 아이처럼 우는 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우산, 그 날을 계기로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그 가게 앞에서 만났다. 통성명을 하거나, 나이를 묻진 않았다. 그저 나는 일주일 간 어떤 일이 있었고 이래서 힘들었다 하는 것들을 공유할 뿐이었다.
“나 아직도 시험문제 못 낸 거 있죠? ..또 한 소리 듣겠네”
만남이 끊긴 건 순전히 나때문이었다. 당신은 과제 검사를 하느라 밤을 샜어도 내 옆에 앉아 투정을 부렸는데, 나는 그러지 못 했다. 한꺼번에 쌓인 일에 비해 내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적었고, 난 수요일 6시, 그 곳에 가지 못 했다. 7시가 다 되어서야 도착했지만, 당신은 없었다. 나는 당신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몰랐기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끝나는 듯 했다.
그렇게 마치 영화같던 일들이 서서히 멀어지고 한 달 쯤 지났을 무렵,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낯선 길이었기에 헤메는 내게 친구는 정류장 옆 학교 앞에 서있으라 했고 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보고있을 때였다. 딱 그 순간, 축제를 홍보하는 플랜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학교 이름이.
‘00고등학교’
당신이 교사로 있다던, 그 학교였다. 틀림없었다.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에 더욱 확신했다. 그 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겨우 한 달 전 일들인데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혹시 내가 꿈을 꾼 걸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꿈이 아니란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 .....
“...여기, 어떻게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
놀랐다. 당신도 나 못지 않게 놀란 듯 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한 달 전 그 때, 내가 시간 맞춰 나갔다면 우린 아직 매주 만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 힘들다며 솔직하게 말할까. 우리 둘 다 속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 미안했다. 그래서 당신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이 튀어나갔다.
- 미안해요. ..아, 이 말을 하러 온 건 아닌데-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찾아온 게 아니었다. 다른 용건으로 그저 이 곳을 지날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오해한 당신에게 변명으로 들릴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억울하다기보다는, 서운했다. 나는 나름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고 당신도 분명 내게 좋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 믿었다. 그 약속을 깬 사람은 나였지만 선을 그어버리는 듯한 당신의 말에 괜히 울컥하며 이기적인 감정이 몰려왔다.
- ....
그리고 이어지는 당신의 말에, 고여있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올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잖아. 울지 마요.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한테 속얘기 털어놓지도 말고”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고르기] (실화 바탕) 더 설레는 일화 고르기 | 인스티즈](http://cfile276.uf.daum.net/image/999C9F3E5A535F8A3B05C3)
![[고르기] (실화 바탕) 더 설레는 일화 고르기 | 인스티즈](http://cfile253.uf.daum.net/image/99ABEC4F5A536362178D9C)
![[고르기] (실화 바탕) 더 설레는 일화 고르기 | 인스티즈](http://cfile260.uf.daum.net/image/9906B3505A5367D42E3918)
![[고르기] (실화 바탕) 더 설레는 일화 고르기 | 인스티즈](http://cfile268.uf.daum.net/image/99A8334E5A536A042766C4)
![[고르기] (실화 바탕) 더 설레는 일화 고르기 | 인스티즈](http://cfile293.uf.daum.net/image/998F0C445A5485242EFDA6)
![[고르기] (실화 바탕) 더 설레는 일화 고르기 | 인스티즈](http://cfile277.uf.daum.net/image/99A11C445A5485682B633E)
![[고르기] (실화 바탕) 더 설레는 일화 고르기 | 인스티즈](http://cfile276.uf.daum.net/image/99CE2E4F5A5488091CA6EE)
![[고르기] (실화 바탕) 더 설레는 일화 고르기 | 인스티즈](http://cfile255.uf.daum.net/image/99B5754F5A54906612E1E6)
 팬들이 변요한 티파니 알았던 이유
팬들이 변요한 티파니 알았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