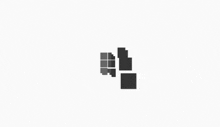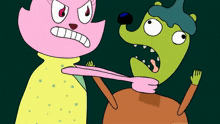2
그 뒤로 우리는 대체로 같이 가곤 했다. 나, 그, R 언니, J 언니. 나는 J 언니가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라 그런 건 금방 알아차리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도 빨리 알아챘다. 아무에게 말도 못 하고 끙끙 앓고만 있었다. 고3에 짝사랑이라니. 앞으로의 인생과 당장의 짝사랑 둘 다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어느 날씨 좋은 주말, 나는 그와 연락하다 무심결에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한강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나오겠냐며 물었지만, 경기도에 살던 내가 한강까지 가려면 두 시간이나 걸리는 터라 웃으며 됐다고 하였다. 결국 그 날, 한강은 가지 못했지만, 그가 먼저 한강을 가겠냐며 말을 꺼내주어 기뻤다. 그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괜시리 웃음이 났다.
그렇게 한동안 한강은 대화주제였다. 날씨가 흐렸던 언젠가, 그는 자기 학교 근처에 잘하는 냉면집이 있으니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하였다. 순수하게 그가 먼저 무언가를 함께하자고 한 건 그게 처음이었다. 딱히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얼른 냉면을 먹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추석연휴의 마지막 날에 만나기로 하였다(물론 한강에 가고 싶다는 이유만은 아니었고, J 언니보다 선수쳐야겠다는 강한 위기의식도 있었다). 당일 날 아침까지 어디서 몇 시에 만날 건지는 정하지도 않았었고, 그도 미적지근한 태도인 것 같아서 한 달 갂ㅏ이 당일 날 뭘 입고 갈지 고민했던 나는 괜히 자존심이 상했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린 1시에 선유도 공원에서 만났다. 들떠 있던 나는 지하철을 반대로 타 10분이나 지각했고, 너는 많이 기다리지 않았다고 했다. 학원 밖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할지도 모르겠었고,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모르겠었다. 다만,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기자고 다짐했었다.
벤치에 앉아 두어 시간을 얘기했던 것 같다. 말재주가 없는데다가 긴장까지 했던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던 걸까 기억도 나질 않는다. 그냥, 일주일 전부터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제발 맑기를 바랬던 것처럼 살짝 더울 정도로 맑고 좋았던 날씨와, 보리차 내음, 빛바랜 듯한 느낌의 오후 햇살, 빛이 깨져 흐르던 강물, 나뭇잎향의 산들바람. 그리고 그. 흰 피부, 살짝 졸린 듯한 눈, 목이 약간 늘어난 반팔 티셔츠. 곱슬머리. 아마, 죽을 때쯤에나 잊혀질 그 때.
살짝 거리를 두고 앉은 벤치. 두 손의 거리는 미묘했다. 그에게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의 손을 잡는 상상을 했다. 그럴 때마다 내 옆의 그에게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 얼른 다른 생각을 하려 애썼다. 그럴수록 이상한 말들이나 늘어놓았던 것 같다. 또 헛소리를 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 볼이 빨개지고, 그걸 다시 식히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손종원 셰프 나이 살짝 의외다
손종원 셰프 나이 살짝 의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