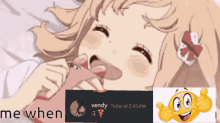읽으시기 전에, 이 글은 번외편입니다. Part 2 본편을 읽고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해요. 단편이니 빠르게 읽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
[인피니트/현성/단편] Part 2 번외
<부제 : 이별 후에도 시간은 흐른다.> |
written by. 빙빙바
쯧, 지치지도 않느냐
' 어르신, 제발, 제발.. 우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니가 이러니 그 아이가 널 잊지 못하는 것 아니냐.
' 제발, 영혼으로 내려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
..약속 하나만 하거라. 그 아이가 널 잊을 수 있게.
' ...예. 꼭, 그렇게 할게요. '
5년이다. 5년안엔 오도록 하려무나.
* * *
" ..다녀올게, 성규야. "
품에 서류봉투를 안고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에 들리지 않을 인사를 한 뒤 나가는 우현을 오늘도 바라보는 성규는 자신도 우현에게 들리지 않을 인사를 했다.
서재는 2층에 있었다. 가는 내내 중간 중간 벽에 걸려있는 성규의 사진은 언제나 성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살아있을 때는 이 때 있었던 일을 추억하며 혼자 웃었는데, 이제는 씁쓸한 미소만이 입가에 걸려있었다. 자신을 잊지못하고 늘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는 우현을 계속 지켜보았기 때문일까. 추억이 담겨있던 사진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늘 찡했다. 언제쯤이면 우현이 자신을 잊을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날 잊지않았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잡고 있었다.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해서, 우현이 너가 날 잊지 못하는걸까. 우현의 서재에 들어서자 천장에 닿을듯한 책꽂이들이 웅장하게 서있었다. 방은 주인의 성격이라던지 성품을 알려준다하였는데 딱 맞는 말이었다. 우현의 향으로 가득 찬 이 서재는 방 주인인 우현의 성품을 그대로 알려주는 듯 했다.
쌀쌀한 바람에 한기를 느낀 성규가 테라스 창으로 다가가 닫으려 손을 뻗었을 때, 성규는 또 허탈감을 느꼈다. 맞다, 나 죽었었지. 형체가 없는 손은 그대로 창문을 통과할 뿐, 아무것도 잡히질 않았다. 지난 4년간 그랬었다. 손을 뻗어도 잡히질 않는 이 허탈감은 성규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며 울고 웃고 또 다시 우는 우현을 볼때마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영혼이 되어 떠도는 성규에게 우현을 안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안으려 해도 우현의 몸을 그대로 통과하는 그 느낌은 말로 형용 할 수가 없었다.
한참을 밖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보란듯이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원망도 많이 했었다. 날 왜 이리 일찍 죽인거냐고. 무엇보다 우현의 곁에 있을 수 가 없다는 것이 성규를 더욱 힘들게만 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달라질 수 없었고 성규는 받아들였다. 자신의 죽음을. 우현의 책상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에 띄인 종이에 손을 뻗었다. 놀랍게도, 종이는 손에 잡혔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손에는 종이가 들려있었다. 눈물 범벅이 되서 잉크가 번져버린 종이. 우현의 필체였다.
아, 어르신. 이제 보내야하나봐요.
「널 지워낸 듯 하지만, 여전히 넌 내 안에 가득해.」
우현아,
「또 다른 겨울이 찾아오면 모든게 다 잊혀질 거라고 했던 그 말.」
5년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 겨울이 오고 지나가고 다시 와도 널 보내질 못해서,
" 하, 하.. 이젠 별 게 다보이네. "
이제 내가 미친건가. 넋나간 눈을 한 우현이 작게 중얼거렸다.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쳐다본 성규가 눈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환상이었을까. 우현이 성규를 부르자 흩날리던 눈송이가 땅에 닿아 순식간에 녹아버린것처럼 성규는 우현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럼 그렇지. 넌 죽었는데, 내 눈에서 너가 보일리가 없지. 당연한건데 왜이렇게 눈이 따끔거릴까. 우현은 한참동안 성규가 서있었던 듯한 자리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거두고 침대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몇 분 안되서 방안에는 우현의 숨소리만 들렸다. 새근새근, 아기가 잠든 마냥 지금만큼은 평화롭다는 듯. 성규는 우현이 누워있는 침대 맡으로 다가가 앉아 우현을 바라보았다. 긴 속눈썹. 날렵한 콧대. 자신을 따스하게 감싸주었던 우현의 입술. 손을 대도 느낄 수 없었던 감촉이 이제서야 조금씩 느껴졌다. 조금은 헬쓱해진 볼과 거칠어진 피부. 전부 자신때문인듯해 성규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있었다.
지금만큼은, 너가 내 목소리를 꿈속에라서도 들을 수 있기를.
" 우현아. "
성규를 잊지 못해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우현은 다짜고짜 씩씩대며 자신의 집에 벌컥 들어온 명수에게 얼굴에 주먹을 맞았다. 씩씩대는 명수를 동우가 간신히 말려 더 이상 때리지는 못했지만, 명수는 우현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정신 좀 차리라고. 성규형이 너 이러는 꼴 보면 편히 가기는 하겠느냐고. 더이상 나도 이러는 꼴 못보겠다고. 정신이 번쩍드는 명수의 말에 우현은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노력했다. 자신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성규에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차에 치이기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씩이나 생각해왔던 일이었다. 그 때 우리가 그렇게 싸우다가 내가 빗물에 삐끗하지만 않았어도 괜찮았을까. 맘에도 없었던 말들로 상처주고 씩씩대지만 않았다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달라져있기는 했을까. 대형 트럭차에 치여 구급차에 급하게 실려갔지만, 6시간의 대수술이 끝난 뒤에 3주동안이나 생사가 오락가락했던 성규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자신도 알았을 터. 제 몸이 더이상 버텨주지 못한다는 걸. 우현은 늘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성규에게 매일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었다. 말할 기운도 없어 간신히 남아돌지 않는 정신을 붙들며 다 들었던 성규는 이제 한계라는 걸 느꼈다.
우현아.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성규를 보고 눈이 동그랗게 커진 우현은 활짝 웃어주었다. 응,말해.뭐 갖다줄까? ..미,안..해. 형이 뭐가 미안해, 미안하면 얼른.. 형?..형? 왜그래. 어? 갑자기 호흡이 격해지는 성규. 그리고 당황한 우현은 침대 맡에 있던 붉은 벨을 급하게 눌렀다. 형, 좀만 참아.응? 의사선생님 올거야. ...또, 다른, 겨울이 오면,.... 점점 말하기가 힘들어지는건지 성규의 호흡은 더욱 가빠지기 시작했다. 형, 말하지마. 제발, 제발.. 좀만 참자..어?.. 한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자신의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건 그 때가 처음이었다. ...ㅇ..잊혀,질..거야.. 미안, ㅎ,ㅡ.. 삐이ㅡ 성규의 말이 다 끝내기도 전에 심장박동이 멈춘 소리가 조용한 병실안에 울려 퍼졌다. 조심스럽게 감긴 눈은 오랜만에 평온을 맞이한듯 하였다.
" 5번째의 겨울이야. "
성규가 자고있는 우현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죽을까봐 무서웠던 날 편하게 안심시켜주려고 잡아주었던 손을, 이젠 내가 잡아야겠지.
" 많이 길었지? "
성규의 발 끝부터 시작해서 다리로, 그리고 허리로, 그렇게 조금씩 빛가루를 내며 자신이 조금씩 사라져감을 느꼈다. 이제 가야할 때구나.
" 우현아. "
울음을 참고 있는 성규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빛가루는 우현의 손을 잡고있는 성규의 손까지 올라왔다.
" 이젠, 날 .. "
소리없는 성규의 말은 빛가루와 함께 흩어졌다. 성규의 말을 알아들은걸까. 우현의 감긴 눈에서 한 방울로 시작한 눈물이 툭, 툭ㅡ 침대시트를 적셨다. 창밖에는 슬프고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퍼졌다.
* * *
아무도 없는 납골당은 으스스하기보다는 포근한 햇살때문인지 따뜻하게만 느껴졌다. 명수를 뒤따라 들어와 이제서야 성규를 맞이한 우현은 아무 말 없이 성규의 유골함 옆에 세워놓은 성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기다릴게. 명수는 우현만 남기고 뚜벅뚜벅 걸어갔다.
" 형 "
성규에게 들리지 않을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바램이 이루어질까. 우현은 성규의 유골함을 쳐다보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걸 느꼈다. 울컥 치솟으려는 눈물을 참아내고 말을 이어갔다.
" 많이 생각했었어. 힘들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밝게 보내고 싶어 웃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막을 수 가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우현은 명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뚜벅뚜벅. 우현의 발소리가 납골당 안에서 조용히 울려퍼졌다.
|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