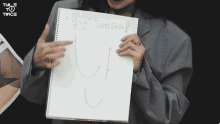“경수야 난 네가 좋아..”
아무것도 모르고 어색했던 고1의 생활이 지나고 파릇파릇한 고2 생활을 맞은 지 한 달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였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봄이 서서히 올 것만 같았다. 그래도 아직은 바람이 차다. 교복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겨울 바람은 날 더 떨리게 만들었다. 난 바닥에 시선을 박은 채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너무 떨려서 말이 나오지도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 오늘은 꼭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난 이게 거절의 표시인가 하고 고개를 서서히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다. 난 그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 때였다.
“백현아”
그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웠다. 정말 녹아버릴 것만 같았다. 남자인 내가 듣기에도 너무 황홀했다. 난 그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떨리고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아마 그가 본 내 모습은 귀까지 붉게 달아올라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꼭 터질 듯한 우스운 모습일 것이다. 난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사실에 멍하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에 더 더욱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더러워. 꺼져”
하지만 그는 날 더 이상 부드럽게 대하고 있지 않았다. 명백히 내 마음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래도 난 그 순간에도 그가 멋있어 보여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했더라면 속이 더 편했을 지도 모르겠다.
“야 꺼지라고”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 정신 차리는 그 순간에도 그는 나에게 독설을 마구 내뱉고 있었다. 그의 비아냥 거리는 말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었다. 내 작은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부들 부들 떠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백현아 내 말 이해 못 해?”
“다시 한 번 말해줘?”
“같은 거 달린 새끼한테 좋아한다 지껄이는 너 더럽다고”
난 누군가 내 뺨을 때리는 거 같은 충격에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곤 내 신발 위에 침을 찍- 뱉고 유유히 나에게 등을 돌려 교실로 들어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거절하는 방법까지 격했다. 그래도 난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마저도 너무 좋았으니깐. 18살 되는 해 겨울 바람은 차도 너무 찼다. 언제 봄이 올까 하는 생각과 나에게도 봄이 오긴 할까? 하는 생각이 대조 되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