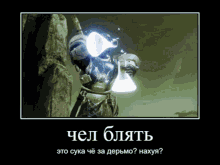쌍방 크리티컬 로맨스 作 Chapter Four “비도 참 오지게 내리는군.” 가까스로 비가 그친 맹탕색의 하늘에 대고 중얼거렸다. 온통 빗물 투성이였다. 이런 건 딱 질색인데. 질척거리고 습하고 냄새나고. 색만 투명하지 희뿌연 색이었다간 봐. 남자 정액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꼬라지였다. 갓길을 채운 물덩이를 피해 발을 디뎠다. 나는 비가 싫었다. 어깨가 아팠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탓이었다. 일본 지사를 내 명의로 돌리겠다는 회의 안건은 발표와 동시에 이사진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회장이 악화된 병세로 인해 퇴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딸이 감히 나서냐는 뜻을 내포했을 것이 분명했다. 우습기 짝이 없었다. 아버지의 퇴임으로 어수선해진 틈을 타 일본 지사의 지분을 떼어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으려던 속셈이었겠지. 하여간 돈독만 올라서는. 하얗게 샌 머리들이 같잖은 분노를 휘두르는 것을 보며 구역질이 날 뻔한 걸 간신히 참아냈다. “그렇게 속이 뻔히 보여서야 장차 뭘 하시겠다고들.” 재미없는 사람들. 재미없는 레퍼토리. 간간히 비까지 내린다. 최악이었다. 지붕 있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빗물이 튀지 않은 곳을 손으로 짚어 골라냈다. 피곤했다. 눈두덩이를 손으로 꾹꾹 눌러댔다. 찡한 고통이 얼굴 전체에 녹진히 스몄다. 확실하지도 않은 계획에 차를 끌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집에 돌아가기 전 바에서 위스키라도 들이킬 예정이었는데, 피곤함에 그마저도 포기했다. 한참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자켓 하나만을 걸쳐 쌀쌀했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손목 관절을 돌리며 숨을 뱉어냈다. 순간이었다. 어둠에 적응된 눈이 무언가의 형상을 잡아챘다. 그것은 반대편 벤치에 앉아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런 것 같았다. 눈을 찌푸리고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상대방이 꼰 다리를 풀어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다. “여기 내 구역인데.” 저음의 목소리가 지껄였다. 멍한 정신을 다잡았다. 어이가 없었다. 상대가 말을 덧붙였다. 구역에 침입했으면 입장료를 내야 인지상정이지. “돈 있어?” “있다면?” “구라치네.” 상대가 얼굴을 좀 더 앞으로 들이밀었다. 쌍꺼풀이 짙게 진 얼굴이 드러났다. 척 봐도 액면가가 어렸다. 어라. 맹랑한 꼬마군. 숨기지 않고 코웃음을 쳤다. “나 돈 많은데.” “구라치지 말라니까. 딱 봐도 어디 말단 사원 같이 생겼는데.” “그런 말 심하네. 기분 좆 같게.” 험한 입놀림에 상대의 표정이 놀란 듯 일그러졌다. 그러면서 말을 던진다. 우와. 무슨 여자 말투가 그래? 말 함부로 하네. 이내 재미있다며 웃는다. 그 꼬락서니가 유치해 나는 또다시 코웃음을 쳤다. 곱씹어보면 내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 재력이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이 땅덩어리 쯤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턱에 팔을 괴고 지그시 노려보며 먼저 입술을 열었다. “몇 살이야? 20대 초반?” “나 그렇게 늙어보여? 아직 좆고딩인데.” “좀 늙어보이긴 하네. 고딩이 이 밤에 뭐 하고 다녀? 너 같은 것들은 원양어선에 팔려가봐야 정신 차리려나.” “그러는 너는 나이를 좀 많이 처먹었나봐.” 맹랑한 꼬마가 혀를 놀리는 게 수준급이군. 물건인데. 속으로 휘파람을 불며 이번에는 눈빛을 다르게 했다. 다시 보니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쩔까. 나이를 속여 먹을까 하다가도 귀찮아진다. 퉁명스레 씹어뱉었다. 스물 여섯 살. 어라. 그런데도 웃는 낯에 변화가 없다. “생각보다 아줌마는 아니네.” “너랑 최소 일곱 살 차이인데 존댓말은 쓰지. 게다가 초면이기도 한데.” “초면에 좆 같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신경쓰나?” 아. 볼수록 귀엽군. “어차피 우리 원나잇이잖아.” “원나잇?” “뭐야. 지금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는 거 안 보여?” 원나잇이라는 단어에 왠지 시무룩해진다. 좆고딩이 어디서 화술을 배워오기라도 한 건지 지루할 틈이 없다. 폐부를 찔러온다. 한 치의 틈도 없이 시선을 맞추고 이어나가는 대화가, 나쁘지 않다. 손바닥을 채워오는 온기가 낯설었다. 밤이라서 미치기라도 한 걸까. 대답을 않고 가만히 있자 상대가 고개를 비틀며 의아해한다. 어쭈 이제 질문까지 씹네. 덧붙여오는 말의 어투가 날카로운데도 어쩐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너 싸움 잘 해?” 이젠 본격적으로 '너'라고까지 부른다. 맹랑한 꼬마가. “존나 잘 하는데. 너랑 맞짱 떠도 내가 이길 걸.”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새 아내들과 머리채를 잡고 싸운 적도 있고. 시비 거는 새끼들의 아가리에 주먹을 꽂은 적도 다분했다. 요즘 시대에 여자가 주먹을 못 휘두르면 쓰나. “나도 이 근방에선 한 주먹 하는데 너무 무시하네.” “넌 나 못 이겨.” “못 하는 말이 없어.” 나를 향해 비웃음을 흘리던 놈이 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영문을 몰라 그 얼굴을 멍청히 올려다보자 씨익 웃어제낀다. 왜 처웃냐 묻자 집에 갈 시간이란다. 뜬금없는 모범 발언에 벙 쪘다. 팔짱 끼고 짝 다리 짚으며 시건방지게 내려다보는 꼴을 보니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졌다. 별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뭐. “이름이 뭐냐.” “돈 많다고 했지. 이름 알고 싶으면 백 만원 내놔.” 표정을 굳히고 노려보자 손을 샐샐 내저으며 능글맞게 내뱉는다. 농담에 죽자고 표정 썩히기는. “죽여주는 샛별 고딩 김종인.” “샛별은 또 뭐야.” “그냥 빛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들어.” 졸려. 자고 싶어. 그러니까 나 간다. 웅얼대며 뒤돌아 걷는다.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오른손을 들어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미친 놈. 속으로 깨작대며 입술을 비틀어 올렸다. 놈이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나는 자리를 뜨지 못 했다. 와중에도 밤은 계속 깊어가고 있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죽여주는 샛별 고딩. 혓바닥 위로 맴도는 역한 단어들에 괜스레 얼굴을 구기며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들었다.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어 있었다. 까만 하늘이 밤을 수놓는 중이었다. 발을 움직여 길을 걸었다. 나는 어느샌가 웃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 좆고딩 김종인 스물 여섯 살 드센 여자
이 시리즈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현재글 [EXO/김종인/오세훈] 쌍방 크리티컬 로맨스 「01」 1
11년 전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충격주의) 현재 난리난 "차면 부러지겠다” 대참사..JPG
(충격주의) 현재 난리난 "차면 부러지겠다” 대참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