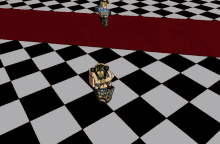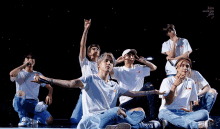"나가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닐테다." "총알도 없는 새끼가 뒤지고 싶으시다면야 누구 한명은 기꺼이 죽여주겠지." "이건 모욕이야, 레이는 25개주고, 우리는 15개라니." "레이가 왜 나와?" "차별, 씨발." 아이링은 얼굴을 찌푸리더니 귀찮은 듯 손을 흔들며 그만 물러가줘, 징계받으신 분들. 이라 말했다. 민석은 이 상황이 귀찮았다. 재미도, 감동도, 그렇다고 해서 분노도 없는 이 상황은 민석에게 시간낭비였다. 묵묵히 일어나 고개를 까딱 숙여 조용히 나갈 심산이였다. 하지만 루한은 달랐다. 여기서 모든 한을 풀고 가리라. 이런 생각 중인 것같다. 총탄 배부와 징계의 심각성, 사실 별로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쓸데없는 레이의 얘기까지. 침을 튀겨가며 두서없이 말하는 루한이 아이링에게는 시간낭비였다. 아이링이 민석에게 눈짓했다. "가, 루한." "놔봐, 난 쌓인게 많아. 시우민 너는 안 짜증나? 아, 그래 넌 일주일이겠지. 일주일동안 휴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나는 삼주라고." "루한, 나 손아파. 약 먹어야 될 것같아." 손. 루한이 천천히 민석의 오른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별 다를게 없어보이는데, 부은 것같기도, 빨갛게 일어난건가. 루한이 조용히 입을 다물자 아이링은 살짝 웃었다. 이제, 제발 꺼져주기를. 아이링은 빌고 빌었다. 저 말많은 새끼가 귀찮았다. 루한은 민석의 손에서 눈길을 떼고는 아이링을 쳐다보았다. "너만 보면 화나."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니 탓이야, 루한." "결과적으로는 너야." "아, 제발, 가라고 시발놈아. 몇년전 얘기를 아직까지 들먹이다니. 나도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나.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둘 다, 제발. 내 잘못이였어, 됐지? 루한 가자." 아이링이 잘게 떠는 것을 본 민석이 루한의 손을 붙잡고 좁은 방의 문을 열었다. 갑작스레 밝은 빛이 보이는 바람에 민석은 눈을 찌푸렸다. 루한, 나봐. 이제 끝이야. 민석의 말에도 루한은 계속해서 아이링을 주시했다. 아이링을 보는 눈에는 여러가지가 담겨있었다. 분노, 애증, 약간의 연민. 그리고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증오. 그 여러가지를 받아내는 아이링의 눈에도 한가지가 담겨있었다. 루한과 민석을 향한 애처로움. 곧 문이 닫히고 어둠이 찾아왔다. 다시 7년전 악몽이 떠올랐다. 아니, 8년전인가. 그래, 그 때. 루한의 실수와, 민석의 호의와, 아이링의 자신의. "약 먹을래? 몇일만에 먹는거지? 갑자기 왜 아픈거야? 카이 일에 신경을 써서 그런가, 아까 총 오른손으로 잡았어?" "약 먹을래, 이주만이고, 나도 잘 모르겠어. 카이일에 신경 별로 안썼고, 총 왼손으로 잡았어. 하나씩 질문해 루한." "불안해서, 너 그때처럼..." "아, 그만. 그만하자. 루한, 약 좀 갖다줄래?" "그래." 루한이 싱크대 선반을 열러간 사이 민석이 자신의 오른손을 쳐다보았다. 손등 전체를 뒤덮는 흉터, 그 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새록새록? 그렇게 어감이 예쁜 단어를 써도될, 행복한 추억인가. 절대 아니였다. 민석의 생사가 갈릴 정도였다. 피비린내, 떨어져나간 살점들, 루한의 울먹거리는 눈, 아이링의 당황한 표정, 민석을 잡아끄는 간부들. 그 중에서도 민석은 피비린내와 루한의 눈이 가장 싫었다. 기억에도 없는 엄마 손을 붙잡고간 수산시장의 생선 비린내보다 역겨웠던 냄새, 저가 가장 좋아하는 루한의 눈에서 떨어지던 눈물. 그 때 루한이... "약 먹어." 루한이 물이 담긴 컵과 진통제를 들고 왔다. 왼손에 몇알 쥐어주고는 오른손에는 물컵을 주었다. 아, 이 약들. 이주만에 보는 이 약들, 언제나 소름돋았다. 민석은 죽어도 먹기를 싫어했지만, 오늘은 안 먹으면 루한이 꾀병인 것을 알아채고 다시 아이링에게 따지러갈까봐 꾸역꾸역 입속으로 털어넣었다. 넣자마자 혀에 닿아 서서히 녹아가 쓴 맛을 내는 약들이 싫었다. 물을 바로 마셔도 그 쓴 맛이 오래가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 원래 쓴 것을 잘 못먹는 민석이니, 잠 못자는 것 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다. "착해." "나 원래 착해." "그래, 이제 자자." 루한이 민석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다. 민석도 루한 쪽으로 몸을 틀고는 품을 더 파고 들어갔다. 몇년을 이런 식으로 자왔다. 루한이 아이링이 내린 지시를 수행하러갈 때 빼고는 항상 루한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게 편했고, 따듯했다. 그리고 루한 특유의 청량한 향도 좋았다. 근데 오늘은, 아니였다. 총냄새. 총을 쏘고 난 직후의 냄새가 옅게 남아있었다. 오늘 루한이 네발이나 쏴서 그런가,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고. 루한아, 왜. 왜일까? 왜 니 총 향이 아닐까? 오늘 뭔가 찜찜한 밤이 될 것같았다. "아 깜짝이야 씨발..." 민석은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아이링에 욕부터 해보았다. 내가 이래서 숙소에서 안 자는거야. 잠긴 목소리로 투정을 부려도 아이링은 그저 일어라나는 듯 특유의 나른한 표정으로 손을 까딱였다. 그에 민석은 루한을 툭툭 쳐보았다. 아, 왜에... 루한도 잠긴 목소리로 말꼬리를 늘렸다. 그래, 넌 더 자거라. 루한을 그냥 두고 아이링을 쳐다보자 살짝 웃었다. "얼룩말이 왔다." 그리고 그말은 루한에게 무엇보다도 거슬리는 알람이 되었다. [와아- 민석아, 루한아! 오랫만이야~.] [야, 김종대 여기 중국이야. 중국어로 말해.] 민석의 말에 종대는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금세 장난스런 웃음으로 바꾸었다. "무시하지마, 너 가고 5년 동안 공부했어." "오, 대단하네." 920921첸, 본명 김종대. 사춘기 즈음에 들어온, 늦둥이같은 녀석이다. 5년전 한국지사로 중국아이들을 몇명 보냈을 때, 민석과 루한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좀 시끄러운 놈. 아저씨들 사이에서 뻘쭘하게 있는 둘에게 다가가 웃어보이며 민석에게 건낸 첫 마디, '야, 너 한국인이지?' 종대는 눈썰미가 좋았다. 루한에게는 '?好(안녕하세요)' 라며 어깨를 툭툭 쳤다. 그러고는, [아, 우리가 여자였다면 브라끈이나 튕기며 친해졌을까? 내가 있던 고아원 여자애들은 그러던데, 미친년들이지?] 루한은 무슨 뜻인지 몰라 민석의 소맷가랑이를 살짝 당겼고 민석은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루한은 얼굴이 시뻘게 지더니 종대에게 소리질렀다. '미친놈!' 종대는 민석에게 뜻을 물어보았고 민석은 또 설명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종대는 실실 웃더니 '왜~ 뭐 어때.' 하고는 루한 옆에 착 달라붙어 쫑알대었다. [우와, 너 보기보다 순수하구나. 완전 신기 그 자체야. 브라가 그렇게 창피해? 어이구, 애기네.] [너보다 형일 것같은데, 음.] [아하, 김종대! 첸이라구 불러. 근데 난 종대가 더 편해. 그리구 나 92년생인데?] [우리 둘 다 90이야.] 그리고 정적. 종대는 당황한듯 아하하, 하며 작게 웃어보였고 루한은 아직까지 얼굴이 시뻘게 져있었다. 종대는 가히 미친놈이였다. 루한 말대로, 미친놈이 맞다. 종대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 앞에서도 그 지랄을 하였는데, 나이를 알고나서도 루한옆에서 떨어질줄을 몰랐다. [와, 형. 하하, 형이네. 완전 동안이야! 근데 브라가 그렇게 창피해? 아 창피할 수도 있겠다. 우리 고아원은 여자가 더 많아서, 난 그거 나 보면서 자랐거든, 아근데 형 중국인이구나. 내가 한말 못 알아듣겠네? 저 형이 통역해줘야되지?] [첸, 너. 루한이 너보다...] [아 근데 귀엽잖아요! 브라를 창피해해... 완전 애기.] 첸, 너 계속 뭐라는거냐. 상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종대를 데리고온, 그 때 당시 칼을 잘 다뤘던, 이상수. 종대는 상수의 목소리를 듣고 굳었다. 민석은 픽 웃었다. 너 나대다가 잘 걸렸다. 민석은 제대로 엿먹일 생각으로 상수에게 짧게 목례를 한 뒤 종대의 만행에 대해 입을 열려 '했었다.' [지브라요, 지브라. 얼룩말.] 민석은 정말 종대가 최소 정신병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헤어질 즈음 종대는 루한의 옷소매를 잡으며 애걸복걸했다.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연히 루한은 못 알아들었고 아이링에게 오늘 별 미친놈을 다봤다고 털어놓았다. 루한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 아이링은 호탕하게 고개를 젓혀 웃더니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는 말했다. "걔 원래 그래."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다들 펑펑 울었던 한국 영화 적어봐
다들 펑펑 울었던 한국 영화 적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