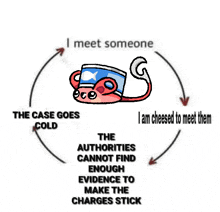2012년 크리스마스. 너와 사귄 지 3년. 그리고 너와 맞는 세 번째 크리스마스. 죽마고우인 줄 알았던 우리는 서툰 나의 고백을 받아준 너의 대답에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 발전했다. 어렸던 우리는 벌써 성인이 되었고, 서로에게 너무나 깊이 빠져있었다. 우리 사이엔 조금의 틈도 없었다. 조금 쉬어가며 약간의 숨 쉴 틈을 남겨두며 사랑을 했었어야 했는데 구석구석 빠짐없이 사랑을 했다. 물론, 난 그게 좋았지만. 너에게는 혹시나 짐이 될까 마음이 무거워진다. 동시에 너에게로 가는 발걸음도 같이 무거워진다. 저 멀리 아릿하게 경수의 모습이 보였다. 난 어쩔 수 없는 도경수 빠돌이 인건지 얼굴도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그 형태만 알아보고 무거워진 발을 억지로 떼어내어 뜀박질을 했다. 경수의 동그란 뒤통수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직 내 모습은 못 본 듯해서 바로 뒤에까지 살금살금 걸어가 숨을 한 번에 들어마셨다가 경수의 어깨에 양손을 턱, 올림과 동시에 숨을 내뱉으며 입술을 뗐다.
"도경수!"
"…아, 놀래라."
"뭐야. 안 놀랐잖아."
"들켰어?"
입꼬리를 끌어당기고 소리 내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나도 따라 싱글벙글 웃어댔다. 한참을 마주 보고 웃다가 경수의 입에서 하얗게 나오는 입김을 보고 아차, 했다. 경수 추위 많이 타는데.
"어디 들어갈까?"
"에이, 싫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던데."
"안 추워?"
"네가 손잡아주던가. 그럼."
"네가 먼저 잡으면 되지. 꼭 먼저 안 잡더라."
'에베베, 안 들린다.' 하면서 제 손을 내민다. 하긴 누가 먼저 잡으면 어때. 맞잡은 두 손이 따뜻하면 됐지, 뭐. 경수의 내밀어진 손을 붙잡으려고 하자 외투 주머니로 쏙, 사라져 버렸다. 동그란 뒤통수 마냥 동그란 경수의 눈이 휘어진다. 이게 진짜, 하고 째려보니 어느새 열 걸음 정도 뛰어나가 버렸다. 이리 와, 빨리. 경수가 옆에 없어진 지 몇 초도 안돼서 외로워진 나는 빨리 오라며 양 팔을 벌려댔다. 그랬더니 더 장난기 그득한 얼굴로 더 멀리, 사라져 버린다.
"내가 못 산다, 도경수."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경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서서 '빨리 와. 변백현!'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게 또 밉지가 않아서 미소가 지어졌다. 한 걸음씩 천천히 걸으며 조금은 시린 손을 호, 부는데 그 위로 눈송이가 앉았다.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구나.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자 하얀 눈들이 내 시야 가득 내리기 시작했다. '와, 경수야. 눈 내린다.'하고 경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조용한 거리, 조용히 눈 내리는 거리에서, 시끄러운 마찰음이 내 귓 속에 찢어발길 듯이 박혔다.
.
.
.
2014년 크리스마스. 너와 함께한 지 3년, 그리고 플러스 2년. 언제나 그랬듯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무언의 약속처럼 그 장소로 향했다. 근데, 걸으면 걸을수록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도 도착하기 전까지는 울지 말아야지. 꾸욱꾸욱,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밀어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뗐다. 이쯤에선 너의 아릿한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오늘도 보이지가 않는다. 조금 더 가까이 가기로 한다.
한 걸음 더.
그래도 도경수의 모습은 없다.
한 걸음만 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이의 모습은 없다.
약속 장소에 다다르고 결국 나는 주저앉아 울어버렸다. 분명히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나는 오늘도 미련하게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에서 도경수를 찾았다.
하지만 도경수는 이 세상에 없다.
.
.
.
경수가 있는 곳으로 왔다. 사진 속에 경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엔 역시나 나도 웃고있었고. 손을 뻗어 사진을 만지자 이질적인 유리의 느낌만 손 끝으로 전해졌다. 따뜻한 경수의 온기따위 있을리가 없다. 그래도 혹시나 느껴질까 다시 한 번 유리로 손을 뻗는다. 그러다가 힘 없이 손을 바닥으로 늘어트렸다. 다 부질없는 짓이지. 그렇지? 경수야. 대답 좀 해라. 내 말은 곧 죽어도 안 들었으면서 말대답은 꼬박꼬박 잘 했잖아, 너.
'에이, 싫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던데.'
"그러니 그 날도 말 안 듣고…."
'네가 손잡아 주던가. 그럼.'
"…이리오라고. 이리오라고 했을 때 왔으면 됐잖아. 너."
'에베베, 안 들린다.'
"왜 그 때 안 와서."
'…….'
"왜!!"
'…….'
왜…….
.
.
.
오늘도 혼자 걷는 이 길엔 너라는 꽃이 없어서 나는 죽어가.
이 향기는 분명 네 것이 맞는데. 경수야, 너는 왜 내 옆에 없어?
고개를 드니 시야 가득 눈이 내린다. 마치 그 날 처럼. 엿 같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저 눈 중에 하나라도 돼서 내 어깨에 네가 내려앉기를. 난 이번 년도에도 소원해, 도경수.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모택 3까지 나온 마당에 이나은은 진짜 불쌍하다
모택 3까지 나온 마당에 이나은은 진짜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