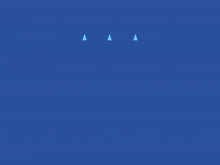2013년 8월 25일.
지독하게도 더운 날씨 였다. 얇은 흰 티셔츠에 땀이 베어 찝찝하기 그지 없는 꼴 이었다. 따가운 햇볕 아래 도로 위 아지랑이가 피어 오를 때, 더움에 지쳐 구겨진 인상들 사이로 떨어지는 전단지가 내 시선을 좇았다. 대박할인 이라는 글씨가 이러저리 밟혀 금세 제 모습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커매지고 찢겨졌다. 그럼에도 전단지를 내미는 내 손을 분주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짜증스럽게 종이를 내치는 손길들이 원망스럽기 보단 뭐랄까, 마치 당연하게 느껴졌다. 내쳐진 전단지가, 시커먼 자태로 거리를 뒹구는 종이조각들이 나의 모습과 다를 게 없지않나.
겉도 속도, 깨끗한 속알맹이 마저 내 속을 헤집어 가져간 네가 원망스럽지 않았다. 나는 네가 원망스럽지 않다. 그저 물어보고 싶다. 왜냐고, 왜 나였느냐 물어보고 싶다. 이 추레한 나라는 사람을 나마저도 놓게 만들어놓은 너에게 왜 였느냐고 물어보고 싶다. 이 것뿐이었다. 너라는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바란걸까. 막연한 미래? 아니다. 서로를 보고, 느끼고, 만지며 육체적 온기를 원한걸까. 아니다. 그저 행복이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네가 필요했다. 네 몸이 필요했고, 네 관심이 필요했고, 네 마음이 필요했다. 이 추저분한 겉을 너로 인해 씻겨내리고 싶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웅크려져, 채 피지못한 몸뚱아리를 조심스레 일으켜줄 네가 필요했다. 이러한 나를 너는 알고나 있었을까.
안다. 네가 나를 취급하지 않는 것. 나를 비난의 잣대로 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공연하게 들리던 말들과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눈흘김이 나에게... 어떤 말 이었는지.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너에게 목적없는 용서를 구할 마음 따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너에게 용서를 바라지도 않았다. 너라는 사람에게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연 네게 내가 어떤 '사람' 이었는지 조차도 의문스런 궁금증이 든다. 항상 즐비하게 늘어섰던 네 현혹스러운 말에 내 이름을 제외한 채 네게 날 '사람' 이라는 존재를 인식할만한 것들이 있었던가. 용서라는 겉껍데기를 쓴 채 네게 더러운 흙발자국을 낸 나에게, 더러워질 몸뚱아리를 알면서도 고귀하고 순결한 내 살결들을 탐하려 했던 너에게. 우린 서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아니었다. 너에게 용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그리고 넌 꽁꽁 싸매진 내 속알맹이들을 보며 고귀하다 지칭하는 나에게 한쪽 입꼬리가 기괴하게 뒤틀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얼굴 할 너를 안다. 너의 모든 기분의 표현들이 기괴하게 뒤틀렸다는 것을 오직 나만이 안다. 더럽고도 추악한 너의 이질적인 모습을 안다. 그것을 낱낱이 끄집어내어 네 앞에 보란듯이 지껄이고 싶다. 겁에 질려 원망과 괴상하게 틀어진 얼굴로 날 바라보는 너에게 너로 인해 태어날 시도조차 못한 나의 모습들을 되돌리고 싶다. 너와 똑같이 기괴하게 뒤틀린채 웃는 나를 더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다.
사랑. 지독하고도 집착적인 단어이다. 너와 아주 어울리는 단어이다. 널 보면 사랑이 떠오른다. 널보면 지독하고도 집착적인 감정이 수면위로 둥둥 떠오른다. 지금 너는 없다. 이 수면위로 떠오른 마음을 제어해줄 너는 없다. 이 마음은 조금씩 흩어져 언젠가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물에 빠져 죽으려 할지도 모른다. 주인을 잃은 채 영생하려는 혼이 될지도 모른다.
살아서도, 죽어도, 죽어서도.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에게 꼭 붙여줄 것이다. 기괴하게 뒤틀린 우리에게 고결한 사랑이라는 존재로 커다란 성곽을 세울 것이다. 나는 단지 그 것 뿐이다.
0화 입니다.
0화 이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조인성은 나래바 초대 거절했대
조인성은 나래바 초대 거절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