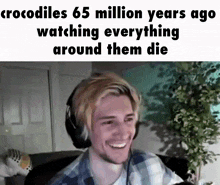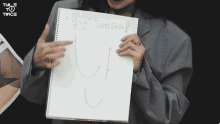바람
김종인X도경수
입술 끝에서 입김이 서렸다. 벌써 종인을 기다린 지 두 시간이 흘렀다. 기다리는 사이에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경수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벤치에 그대로 앉은 채였다.
“경수야.”
제 머리 위로 별안간 빗방울이 멈췄다. 종인의 낮은 듯 들뜬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올려 눈을 맞췄다. 오늘도 역시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지만 어쩐지 근심이 가득하다. 웃는 낯에 가려진 걱정을 읽었다. 그래서 경수는 이미 파랗게 질린 입술을 움직여 웃어보려 했다. 추위에 잔뜩 얼어붙은 온 몸이 미친 듯이 떨렸다.
종인은 경수가 참 미련하다 생각했다. 다른 곳에서 비를 피해도 될 텐데 꼭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건지 답답했다. 경수의 머리칼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다. 어깨가 잘게 떨렸다.
“왜 여기 앉아 있어.”
“니가 연락 안 받아서… 혹시나 엇갈릴까봐.”
종인은 주섬주섬 휴대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3통. 이 3통의 전화도 엄청난 고민 끝에 전화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만큼 경수는 지금의 이 불확실한 관계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확실하게 정의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연락하기를 꺼려하는 걸 알고 있었다. 종인은 작게 욕을 뱉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아니, 건넸다기보다는 억지로 떠넘기듯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경수는 또 이걸 감내하는 것이다.
종인에게 있어서 이건 바람이었다. 그리고 경수는 그 상대였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종인은 제 여자친구를 여전히 사랑했고, 경수와는 바람을 피기 보다는 가볍게 바람을 쐬는 듯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답답할 때 쐬러 나온 바람 같은 존재, 그것이 둘 사이의 암묵적인 관계 정의였다. 그래서 경수는 자신과 종인은 떳떳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오늘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었다. 종인은 휴대폰을 든 손을 떨구었다. 종인의 눈에 비친 경수의 몸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손가락 끝은 하얗게 핏기를 잃어갔다. 괜히 미안해서 우산을 경수 쪽으로 좀 더 기울였다. 이미 늦어버린 걸 알면서도 그랬다.
“일단 집에 가자. 너 씻고, 그 다음에,”
“…전화 받아.”
간헐적으로 울리는 진동소리에 종인의 인상이 구겨졌다. 발신인은 채원이었다.
“어.”
-오빠 어디야?
“밖에 잠깐 나왔어.”
-비도 오는데 무슨 밖을 나가? 오빠도 나처럼 감기 걸리고 싶지?
애교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까지 들렸다. 경수는 통화 내용을 다 들은 모양인지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종인의 눈에 서려있던 그 걱정거리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뭐라고 종인이가, 그렇게 아프게 걱정을 하겠냐고, 경수는 이내 인정했다.
오랜만에 하는 종인과 경수, 둘만의 데이트였다. 하지만 종인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해야했다. 종인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다. 종인은 경수와 만나기 위해 가던 길을 돌려 채원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처 경수와 연락하지 못 했다. 그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마다 종인은 항상 채원이 우선순위였다.
“빨리 가봐. 아플 땐 원래 더 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
곧 입을 연 경수의 말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종인은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경수 또한 아픈 사람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런 종인의 태도에 경수는 단호한 얼굴로 한 번 더 말했다. 빨리 가보라니까.
종인은 경수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주고 다시 병원에 돌아갔다. 집까지 태워주려 했지만 경수가 거부했다. 종인은 계속해서 표정을 풀 지 못했다. 결국 이런 거다. 결국엔 채원에게로 돌아간다. 결국엔, 경수보다는 채원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경수를 완전히 놓지 못하는 자신의 멍청하고 우유부단한 태도에 화가 났다. 채원에게 가는 길은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았다. 누구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비가 쏟아졌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운 종인이다.
경수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종인의 앞이라고 참아왔던 눈물이 조금씩 볼을 타고 땅으로 떨어졌다. 몸에서 한기가 새어 나오는 것 같았다. 부들부들 떨리는 어깨를 어찌하지 못하고 겨우 집에 도착한 경수는 씻을 생각도,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일단 침대에 몸을 뉘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써도 비에 젖은 몸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다. 마음이 시렸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추지 못했다. 결국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온 몸이 들썩거리게 울었다.
*
이불에 파묻힌 채로 잠든 지 두 시간 만에 경수는 눈을 떠야했다. 못 이겨낼 정도로 아픈 몸 때문이었다. 비를 그렇게나 맞고 그대로 잠든 것이 화근이었다. 게다가 울다 잠든 탓인지, 목구멍에서 기침과 함께 쇳소리가 나왔다. 색색대는 제 숨소리가 듣기 싫어 인상을 썼다.
협탁에 두었던 휴대폰을 봤다. 이번엔 종인이 제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한 시간 전.
경수는 종인이 전화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안부 전화 해달라는 형식적인 것. 쓰게 웃은 경수가 고민 없이 종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몇 차례 울리다가 곧 끊겼다. 그리고 종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엔 잘 들어갔지?
“응. 채원씨는 괜찮고?”
-어. …오늘 미안했다.
“아니야. 괜찮아.”
경수는 잠깐 숨을 멈추었다. 튀어나오려는 기침을 참으려는 것이었다. 종인은 경수의 이상해진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 한 듯 했다. 한동안 말이 없는 경수를 부르던 종인은 채원이 저를 찾음에 서둘러 경수에게 내뱉듯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경수는 알고 있었다. 다시 연락하는 건 없다.
경수는 끊어진 휴대폰을 협탁 위에 올려두고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어질했다. 질질 늘어지는 발걸음을 떼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약이 없었다. 이번엔 찬장을 뒤적였다. 거기도 역시 약이 없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약을 더 이상 찾을 여력이 없는 경수는 방으로 돌아가기도 힘든 수준이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웅웅대는 머리를 부여잡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바닥을 기다시피해서 방 안으로 몸을 옮겼다. 정말이지, 태어난 후 겪어 본 아픔 중 최고였다. 기절하지 않은 게 신기했다.
경수는 침대 위로 겨우 몸을 뉘이고 잠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는 탓에 허기진 뱃속이 아픈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곳은 명치 부근이었다. 우습게도 몸보다 머릿속이, 마음속이 훨씬 아팠다. 가슴이 죄는 것 같았다. 종인아. 나도, 아파. 채원씨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고. 종인아. 김종인, 나 진짜 너무, 아픈데. 약도 없고, 먹은 것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어. 아파. 보고 싶어. 올거야? 나도 너 부르면, 나한테 와줄 수 있어? 종인아, 아파. 사랑해.
===
바람
1.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비밀스런 만남
2.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변요한 같은 배우도 저런거보면 연애나 결혼은 무조건 마이너스네
변요한 같은 배우도 저런거보면 연애나 결혼은 무조건 마이너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