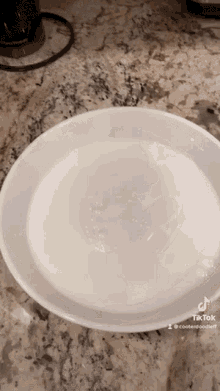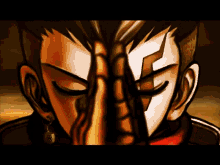넓은 집에 울리는 소리라곤 내가 틀어 놓은 티비 소리가 전부였다. 가장 활동적일 시간에 가장 무기력한 난 오늘도 아까 왔던 문자를 머리에 새기려는 듯 찾아 본다. [오늘 휘에서 태영 그룹 따님과 점심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한테선 마음을 찌르는 향이 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나이 열 일곱, 너도 이젠 길을 들여야 하지 않겠냐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갔던 정재계 모임에서 처음 그 사람을 만났다. 마주친 눈에 이마를 구기던 그 사람을.
![[하정우] 0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5080515/2ca9efdfa9f9551d2349ade23ab9d84e.gif)
세어보면 한 손에 꼽지도 못 할 햇수였다. 그 몇 년간 얼굴에 철판깔며 집에 먹칠하며 따라다닌 것도 자그만치 7년이었다. 지겹다는 시선과 질린다는 한숨도 그 7년간 뼈저리게 보고 들었다. 그래, 무려 7년이란 그 긴 시간동안 변한 건 하나도 없었다. 답없는 나도, 무정한 그 사람도 변한 건 정말 단 하나도 없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 "기다렸어요?" "늦게 온 덕분에 다음 약속도 생겼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며 앞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앉지 마. 일어날거야."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 대신에 자리에서 일어난 그가 입을 열었다. 도도하게 좀 굴어. ...그 사람한테선 마음을 찌르는 향이 난다. 소문이 돌았다. 어딜 가든 그 사람의 얘기였다. 휘의 하정우와 태영의 김지연이 내년 초 약혼식을 올린다는 그런 소문이. 절대 그냥 나는 소문일리 없었다. 늦게 온 덕분에 다음 약속도 생겼다는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약속은 하고 오셨습니까?" "비켜요." "지금 부회장님...!" 나도 알아, 그냥 난 소문은 아니라는 거. 근데 내가 직접 듣고 싶어서 그래. 어디서 나온 힘인지 앞을 가로 막는 남자 둘을 직접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니 얼굴을 구긴 상태로 문 쪽을 주시하고 있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시끄러웠어요? 표정 좀 풀어요." "왜 온 건데." "알면서 묻지 마요. 소문 난 거 알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여전히 얼굴을 구긴 상태였다. 들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 놓으며 마른 세수를 하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도도하게 굴라고 한 거 잊었어?" "진짜 약혼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막 들어 와." "진짜 약혼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진짜...... 약혼 하냐구요." 잔뜩 떨린 목소리에 소리라도 지르려는 듯 목소리를 높이던 그가 멈췄다. 구겨져있던 그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도 같았다. "그냥 난 소문인 거 맞죠..." "여기 이젠 오지 마." "그냥, 결혼 할 시기라서 그래서 난 소문인... .." "내년 초에 약혼하는 거 맞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무서운 말을 뱉는 그를 보며 목구멍으로 울컥 눈물이 치밀었다. 참으려 했더니 몸이 떨려 다리에 힘을 주고 흐린 시야를 바닥으로 떨궜다. 내가 불쌍해 보이긴 할까. 혹시 이젠 붙을 일 없을 거라고 기뻐하진 않을까.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후자가 그와 더 어울리니. "...내가 언제 당신한테 반했는 지 알아요?" "..." "처음 본 날 눈썹 찡그리고 눈 마주쳤을 때." "그때... 반했어요." "나중에 눈이 나빠서 그렇게 봤다는 거 알고 조금... 허탈했었는데 그냥 멋있으면 됐지 하고 넘겼었어요." 툭 하고 떨어진 눈물 방울에 시야가 탁 트였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와 다시 눈을 마주쳤다. 그냥 멋있으면 됐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에게서 몸을 돌렸다. 문고리를 잡고 돌리니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방을 나가서 문을 닫으니 그제서야 울음이 터졌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못생기게 우는 얼굴은 못 봤을 테니까. 01 증권가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럴수록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고 보고 싶지 않았다. 한때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람도 볼 자신이 없었다. 행복하다는 듯 웃으면 정말 찢어질 거 같아서. 집으론 간간히 모임 초대장이 왔고 방 밖에선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렇게 갇혀 살길 몇 달. "괜찮아?" "괜찮을 거 같아." 하루에도 몇 번이고 꿈을 꿨다. 그 사람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아내와 마주보며 웃는 그런 악몽을. "꿈과 실전은 달라." "알아, 근데... 괜찮을 거 같아." 계속 괜찮냐 묻는 친구의 말에 대답하며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오랜만에 나간 모임, 노래 소리,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서 습관처럼 찾게 되는 그의... 얼굴. 숨이 막혀 급하게 들이 쉬면서도 마주친 눈을 피하진 않았다. 여전한 그 얼굴, 찡그린 눈도. 당신에게선 여전히 그 향이 날까.
![[하정우] 01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5080923/faf7d7b51b3abb2e5ccaca56c6f7b5f0.gif)
흘러 나오는 노래와 삼삼오오 모여 인맥 만드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은 빛났다. 굳이 무얼 하지 않아도 몰려드는 사람들 사이에 그와 이제 그의 여자가 될 사람. 사진으로만 접했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얼얼해 서둘러 자리를 옮겼다. 반짝 거리는 샹들리에 밑으로 여러 종류의 디저트들이 놓아져있는 곳, 모임이라는 명분 하에 그와 그 여자의 약혼을 축하하는 자리. 한참을 그사람 생각만 하다 다시 차렸을 때, 옆에 있던... 보고 싶었던 그 사람. "오랜만이네요, 우리." "그러게." 그리고 내겐 익숙했던 침묵이 파고 들었다. 전엔 구태여 할 말을 찾아내곤 했었는데. "다... 정리 된 건가." 내겐 익숙한 침묵이 그에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잘난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 온다. 올려다 본 얼굴은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마주친 시선은 전과는 조금 다른 것도 같기에. 그의 질문에도 여전히 침묵은 이어졌다. 그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은 조금씩 바닥을 보였고, 이상하게 달라진 사이에 의문이 들었다. 이 사람은 내게 질문을 할 사람도, 내 답을 기다릴만큼 내게 여유로운 사람도 아닌데 왜 오늘은. 내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전처럼 차가워 질 건가요? 하지 못 할 말을 속으로 꾹 눌러 삼키며 생각보다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 "당신에게서만 나는 향이 있어요." "..." "당신이 지나칠 때, 다가 올 때 마다 나는 향." "...무슨 향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마음을 찌르는 향, 이라고." 그 향에 하도 찔리고 베여 너덜대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젠..." "..." "그 향이 나질 않아. 당신한테서." 놓인 샴페인 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가만히 있는 이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다 머리를 저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족하고 있는 중이겠지. 그렇군. 한참을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었다.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익숙한 그 향을 맡으면서. 거짓말이야. 당신에게서 안 날리가 없잖아. 하지만 이제 더이상 맡을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은 날 찾지 않을 테고 나도 구태여 당신을 찾지 않을 테니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