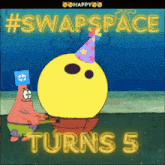태일은 스크린을 보며 편평하던 미간을 좁히는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그게 너답지. 미친 듯이 뭔가에 몰두하는 게 수석 연구원답지. 그래야 내가 아끼는 놈이지. 후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쓸어 올리는 녀석을 보며 태일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지호. 그 애가 온 뒤로 표지훈은 달라졌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다.
태일은 갑자기 담배가 피고 싶어졌다.
휴게실로 들어온 태일을 반긴 건 아무도 없는 텅 빈 넓은 휴게실이 아닌 경이었다. 태일이 눈살을 확 찌푸리며 휠체어를 밀어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한 쪽 벽이 전부 다 창문이라 탁 트인 공간에 속이 뻥 뚫린다. 천천히 담배를 꺼내 입에 무는 태일에게 경이 "담배 또 펴요?"하고 난리를 피운다. 태일은 경의 말은 모조리 씹은 채 창 밖으로 보이는 공허한 땅을 바라보았다. 이 마른 풀만 자라나는 황무지를 지나면 X구역이 나온다. 그래, X구역.
"무슨 생각해요?"
"어릴 때 생각."
"그러고보니 박사님 어릴 때 서울에서 사셨다고 했나."
"응."
"용케도 살아 계시네요."
그 말에 태일은 킥하고 웃으며 동시에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어느새 옆으로 다가온 경이 눈살을 찌푸리며 "내가 언젠가 박사님 담배 끊게 만들 거에요"하고 말하고, 태일은 "네가 무슨 수로?"하고 비웃을 뿐이었다.
X구역.
우지호.
X구역.
한 때 꿈과 열정으로 가득찼던 도시.
서울.
10년 전.
빠른 과학 기술의 성장으로 자라나고 있던 서울. 그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한 연구소는 태일이 꿈을 키우게 도운 곳이었다. 비록 태일이 가진 것은 몇 십년은 된 듯한 MP3 플레이어를 끼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만 하는 할머니와 바글바글 시끄러운 동생 세 명 뿐이었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이 태일의 마음을 오히려 바로 잡아주었다. 단단한 콘크리트 틈을 비집고 자라나는 풀, 태일이 그러했다.
어릴 때부터 비상한 머리는 어딜 가나 인정을 받아서, 그 연구소에서 연락이 와 태일은 인턴으로 잠시 이것저것 배우며 연구소에 출입할 수 있었다. 잔심부름을 맡는 일이 대다수였지만, 묘하게도 태일은 모든 게 즐거웠다. 자신에게 특히나 잘 해주던 박사 한 명 덕분에 태일은 학교나 기존의 책에선 배울 수 없던 지식들을 더 많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태일의 중학교 시절이 흘렀다.
한참 이종교배를 배우고 있던 시기였다. 대규모 연구에 참가할 수 있게 된 태일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박사들에게 이것저것 배우며 태일은 그렇게 커가고 있었다.
그 날도 자전거를 타고 길진 않지만 튼튼한 두 다리로 페달을 밟으며 학교로 가던 태일이었다. 여느 학생들과 다를 것 없이(비상한 머리가 차이라면 차이겠지만)얇은 하복을 입고 지각이라며 미친 듯이 학교를 향해 달리는 모습. 그리고 마침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던 태일의 눈에 들어온 건, 연구소의 모습. 평소와 다를 바 없던 모습. 하지만 태일의 눈에는 그 연구소가 이상하게 보였다.
그리고 태일은 자전거를 타고 기껏 올라왔던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왔다.
"할머니!"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계단을 올라 옥탑방을 향해 달려든 태일. 주변의 높다란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의 건물들과는 달리 오래된 끽해봐야 2층에서 3층 높이의 낡은 주택들이 집합한 곳. 그 중에서도 칠이 벗겨지고 좁은 옥탑방이 태일의 집이었다.
철컹철컹. 잘 열리지 않는 문을 힘을 써서 겨우 열고 안에 들어가니 방 구석에 앉아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할머니가 보인다. 할머니에게 급히 다가가 이어폰을 빼고 "나가야 해요"하고 말하는 태일의 표정이 다급하다. 할머니가 싫다고 엉엉 우시지만 태일은 애써 할머니를 끌고 집을 나왔다. 좁은 옥상 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본 건지, 어느새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어린 동생들.
"형아! 뭔 일이야?"
"형아!"
"오빠아."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서울을 벗어나야 돼. 응? 빨리 내려가자. 할머니 모시고, 얘들아!"
다급하게 말하는 태일이지만 동생들은 '형이 학교에 안 가고 다시 집에 왔다!'하고 자기들끼리 와와거리며 해맑게 웃을 뿐이었다. 태일의 눈 앞이 새하얗게 변해간다. 안 돼, 안 돼. 태일이 입술을 꾹 물고 할머니의 뼈와 가죽 뿐인 거친 팔을 다시 한 번 잡아 당겼다. 그 때 칭얼거림만 나오던 늙은 입에서, 노래같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훨훨 날아든다아."
할머니의 눈이 향한 곳은 주택가 저 너머, 연구소. 태일의 손에서 힘이 풀리고 동생들의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어느새 다가와 교복 바지를 꼭 붙잡은 동생들의 어깨를 허리를 숙여 감싸고 태일은 바르르 떨었다. 저건. 저건.
연구소 중앙에서 나오는 하얀 빛줄기.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이 장관을 이루었다. 빛줄기가 끊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연구소의 모든 곳에서 빛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태일은 눈을 질끈 감고 할머니와 동생들의 어깨를 감쌀 뿐이었다. 아무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순간, 태일이 들은 소리는 할머니의 노랫소리 뿐이었다.
"온갖 개새가 날아든다."
[살아 있어!]
태일이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그 날, 유난히도 맑고 불안하던 공기.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느낀 텁텁하고 숨 쉬기 괴롭던 공기. 하지만 지금 태일이 맡고 있는 공기는 그저 맑고 시원한 연구소 내의 쾌적한 공기일 뿐이다.
연구소의 폭발로 폐허가 되어 서울특별시는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찾아온 시기. 그리고 서울의 인구 천만 명 중에서 열 명도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이 태일이었다. 할머니와 동생들은 어딨는지 모를 일이고, 태일은 구조 대원들에게 이끌려 격리된 상태로 일 년을 보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태일의 두 다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휠체어 발받이에 얌전히 놓여 있는 두 다리. 태일은 눈을 내리깔고 다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톡톡 쳤다. 감각이 없다.
키가 크면서 다리도 같이 길어졌다. 다른 못 걷는 사람들처럼 다리가 얇아지는 근육의 퇴화도 없었다. 남들이 보면 태일의 다리는 멀쩡했다.
"무슨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 생각."
"지금 생각이 뭐에요."
웃음을 터뜨리는 경. 태일은 그런 경을 힐끗 바라보다가 다시 담배를 새로 꺼내 입에 물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X구역. 어릴 때 가족들과 있었던 일. 연구소에서 두 다리로 걸으며 많은 걸 배우던 일. 새로운 연구소. 박사. 표지훈. 우지호...
"담배 좀 끊어요."
"싫어."
"내가 언젠가 박사님 입에서 담배 끊는다는 말 나오게 할 거에요."
"그러시던가."
태일은 잠시 머리 아픈 생각은 접고 쉬기로 했다. 말 그대로 여긴 휴게실이니까.
| 더보기 |
똥긇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원래 어제도 올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빙의글 하나에 꽂혀서 늦었어여...ㅁ7ㅁ8 |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