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응?”
지수의 테라스에서 짧다란 얘기가 오가는 와중이었다. 다 져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슬슬 차가워지는 가을 공기에 지수가 어깨를 가볍게 떨다 여주의 물음에 답했다. 여주가 붉은 하늘에 고개를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여주의 손에 가볍게 들린 머그가 미지근해진다.
“어쩌면 나는, 가끔 우울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응.”
“…………”
“뭔가, 아- 이 때쯤인데, 슬슬 우울해질텐데. 하다가 우울해지는 느낌.”
“…………”
“물론 당연히 좋아서는 아니고. 겁에 질려서 먼저 우울한테 다가가는. 그러면서 생각해.”
비가 와야 무지개가 피잖아. 그래서 아픈 거잖아.
“…그러면서 새벽마다 내리는 비를 피하지도 못하고, 나를 향해 펼쳐지는 우산들을 외면한채 혼자 쫄딱 젖는.”
“…나는 너를 보면서,”
“…………”
“…항상 비를 맞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
“그리고 너가 말하는 그 우울해지는 순간이, …뭐 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엔 그게 비에 젖은 네가 주저앉는 순간 같았고.
“…아.”
“………..”
지수의 말에 코끝이 시큰해진 여주가 고개를 살며시 숙였다. 서늘히 식어버린 차, 그 속에 옅게 비친 자신을 보던 여주는 웅덩이에 빠진 듯 말이 없었다. 지수가 옆 테이블에 올려둔 커피 속 얼음을 입에 머금었다. 그 얼음이 녹을 때까지 둘 사이엔 편안한 정적이 자리했다. 먼저 입을 연 건 여주였다.
“완벽주의 성향때문에 그런가. 자꾸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무시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돌려놓고싶어.”
“…………”
“…………”
“여주야. 여주 좀 용서해줘.”
“…………”
꼭 여기 없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듯, 지수가 말했다. 여주가 작게 입을 벌리곤 다시 다물으며 눈을 감았다. 울음이 몰려오는 듯 했다. 지수의 잔잔한 그 위로가 여주에게 닿았다.
“사람마다 달리는 속도는 천차만별이고, 누구에게나 제 자리는 있을 거라면서, 메달 하나 못 땄다고 경기 끝나고 돌아와서 아쉬워하는 승철이랑 찬이한테 수도없이 위로했던 여주야.”
“………...”
“지금 절망에 갇힌 것 같아도 하나의 에피소드일 거라고, 내일은 행복할 거고, 다음주는 지금의 순간을 고마워할지도 모른다고, 순영이한테 그렇게 말했던 여주야.”
“…………”
“아픔이 있으면 꼭 찬란해진다고, 서사가 있고 아픈만큼 꼭, 그 누구보다 찬란함 속에 갇힐 거라고, 그래서 그 아픔이 많이 무겁고 버겁더라도 그걸 짊어지고 있는 너를 나무라지 말라고, 그렇게 승관이한테 말했던 여주야.”
“…………”
“넌 겁쟁이가 아니고, 모든 순간에 나를 위해줬다고,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물들여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석민이한테 말했던 여주야.”
“………...”
“똑같은 말을 여주한테 좀 해줘.”
![[세븐틴/홍일점] <세때홍클 일상> | 03 지수의 테라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5/03/24/0/d/1/0d1887ebd12d3609a43a279892bb75b7.gif)
말하지 못했고, 얘기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한 번 만, 속삭여줘. 우리 여주는 똑똑해서 금방 알아들을테니까.
여주가 기어코 흐른 눈물에 제 소매로 얼굴을 감쌌다. 또, 습관처럼 소리는 없었다. 뜨거운 숨을 뱉어내는 숨소리만 간간이 자리했다. 지수도 목이 메는 듯, 침을 삼켰다가 저 먼발치에서 터덜터덜 들어오는 민현을 보곤 다시금 입을 열었다.
“언제든, 이렇게 얘기하자.”
“…………”
“말버릇처럼 네가 너를 나무란다면,”
“………...”
“나도 내 말버릇으로 널 위로할테니까.”
“…………”
“…다 괜찮아져. 가끔 찾아오는 우울에, 우리의 우산을 기어코 피해서는 네가 그 비를 다 맞는다면,”
“…………”
“..음. 그냥 우리는 우산 안하지 뭐. 볕을 할게.”
“………...”
“매일같이 지겹게 뜨는 해가 되어서, 너를 말리면 되지.”
“…………”
“여주야 나는,”
“…………”
“나는 너한테 사실 듣고싶은 말이 하나 있어.”
…뭐 황민현도 이지훈도, 김민규 이석민 다- 듣고싶은 말일텐데.
“…내가 행복해달라고 부탁하면,”
“…….……”
“응. 행복할게.”
“…….…..”
“네가 이렇게 답하는 거야.”
“…………”
“어렵지.”
“…………”
“스스로를 용서하고 위하는 일은, 참 쉬우면서도 어렵지.”
“…………”
“너무 쫓기지마. 그게 무엇이든.”
“…………”
“여유한테 마음을 내어줘. 그래야 찾아와. 뭐든.”
“…………”
“차분히 다시 해보자. 오래 걸려도 돼.”
“…………”
“다 괜찮아. 네가 뭘해도, 나는, 우리는 다 괜찮아.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가 여기 있잖아.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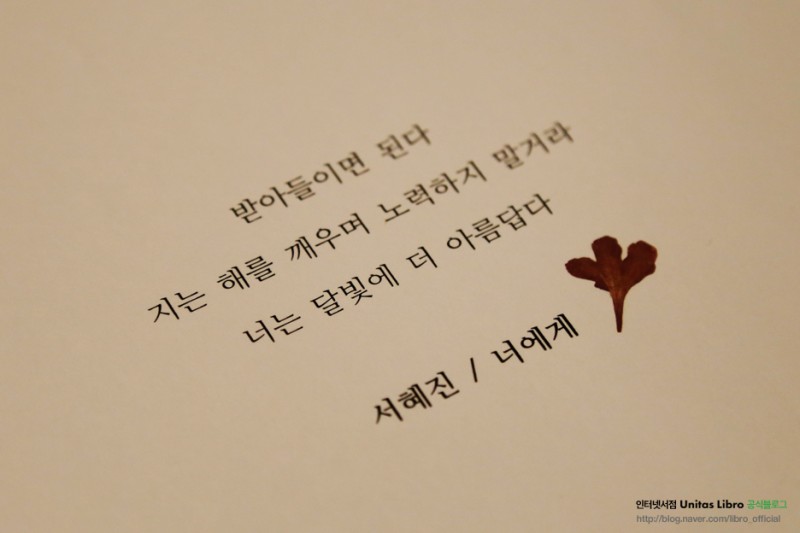
 정채연 같은 턱 가진 여배 또 누구있을까
정채연 같은 턱 가진 여배 또 누구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