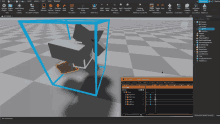준면, 경수, 종인 그 대치상황이란 보는 이로 하게끔 숨이 막힐 정도였다. 준면과 떨어지지 않으려 굳이 좁은 쇼파에 엉덩이를 맞대고 앉은 경수하며 맞은 편에 앉아 누구 하나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종인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두고 어딜 먼저 물어야 고통이 제일 극함에 닿을지 고민하는 야수와 같았다.
" 그래서, 김종인 너는 싫다 이거야? "
간혈적으로 몸을 떠는 경수를 준면이 어깨를 매만지며 넌지시 물었다. 돌아올 대답을 뻔할 것을 알고있음에도 물은 이유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였다. 남자는 여자와 달리 마음이 쉽게 움직인다. 말 몇번 구슬리면 넘어오는 게 김종인이였으니 말이다.
" 말했잖아, 도경수랑 같이 지내기 싫다고. "
뜻은 확고했다. 그말을 끝으로 종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다.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히자 맞은 편에 놓인 달력이 펄럭 거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경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혐오감이 가득한 얼굴로 준면을 올려다 볼뿐.
" 형 그냥 제가 다른 곳에서 살게요, 저도 딱히 여기서 살기 싫고... "
" 학교. "
" ... ... "
" 넌 여기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문제잖아? "
" ... ... "
" 김종인이랑 다른 반으로 넣어줄게, 일단 너도 방에 들어가있어 "
억지로 자리에서 일으켜 방으로 경수를 들여보내는 준면의 마음도 탐탁치 않았다. 저라고 굳이 싫다는 둘을 붙여두고 싶을까. 하지만 제가 해외출장을 가버리면 결국 서로가 혼자가 될 게 뻔하니 붙여놓자는 게 제 의견이였다. 그게 한 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니까.
쇼파에서 일어나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하얀색 벽지로 도배된 거실과 그에 걸맞는 붉은색의 쇼파, 그 앞 유리 테이블에 놓인.
" ... ... "
경수가 없는 가족 사진, 말 없이 그 액자를 엎어 두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 가족이 아니다. 그러니 한집에 살 이유가 없긴 하다. 아직 어린 종인의 마음을 이해 못하진 않았다.
-
' 경수야, 넌 엄마 없어? '
' 없어. '
' 아빠는? '
' ... ... '
' 아빠도 없어? '
'... 있어. '
모래투성이가 된 경수의 머리를 찬열이 털어내며 넌저시 물었다. 그때 나이 열넷,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경수는 뜻밖의 친구를 만났다. 저보다 한참은 큰 키에 단정한 옷차림과 신사적인 말투. 가끔 그를 볼 때면 정말 나와 나이가 같을까 싶을 정도로 성숙했다.
왜소한 체구인만큼 경수를 향한 괴롭힘도 강도가 높았다. 실내화 주머니에 모래와 우유를 섞어 붓는다든지, 책 사이마다 침을 뱉거나 풀을 바른다든지.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이유가 꼭 만만해서는 아니였다.
경수는 울지 않았다.
머리에 급식을 쏟을 때도, 체육복을 빼앗아 교실에 나체로 방치할 때도 그저 무덤덤한 얼굴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할 뿐이였다.
' 재수 없어 '
' 애새끼, 부모 없는 거 티 내? '
실내화로 짓눌렸던 볼에는 흙과 머리카락, 먼지들이 한데 뒤엉켜 붙어있었다. 그것을 떼어내는 찬열이 낮게 한숨을 쉬었다. 같은 학교는 아니였다. 걸어서 5분 거리의 옆학교였지만, 하교길이 같았다.
' 안녕. '
가방끈을 손에 쥐고 걸어가던 중, 누가 말을 걸었다. 그것도 뒤가 아닌 앞에서. 제 앞을 가로 막은 누군가의 얼굴을 보기 위해 경수는 얼굴을 들었다. 햇빛이 비추어져 눈이 찌푸러졌다. 그러자 그 의문의 손은, 경수의 눈 위에 가리개를 만들어 햇빛을 막았다.
' 박찬열. '
' ... 뭐? '
' 난 박찬열이야. '
찬열은 경수의 까만 머리가 그 하얀 피부에 꽤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수는 손을 쳐냈다. 자신의 머리가 닿는 어깨를 밀쳐내곤 제 갈길을 갔다. 웬 재수 없는 놈이 꼬이니, 운수가 없으려나. 그게 경수의 가치관이였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모두 걸림돌이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모두 쳐내야 한다.
-
그는 내 인생 최대의 걸림돌이였다, 박찬열은.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