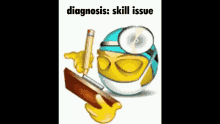![[짘규/지코성규] Death Sentence(전 뱀파이어 짘규)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8/9/e/89e000f6f462b13ea55a6b971c6b2024.jpg)
![[짘규/지코성규] Death Sentence(전 뱀파이어 짘규)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c/6/2c645e36a794c7bd6c6972acd2c0743d.jpg)
"무료하다."
그래, 지금의 느낌은 분명히 무료함이었다. 조용히 눈을 꿈벅이던 지호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벌써 몇 달째 깨져 있던 거울엔 이골이 났다. 언뜻 비친 모습은 잔뜩 흐트러져있었다. 칠흑같은 머리칼을 대충 손가락으로 쓸어내린 지호는 그제서야 정신없는 거실로 눈을 돌렸다. 널브러진 수건, 유리조각과 이불, 어젯밤의 여자와 피, 긴 머리카락,
어지러진 방과, 이지러진 나.
반쯤 젖은 발로 화장실을 나온 지호가 거실바닥의 이불을 털어내고 창고에 쳐박았다. 쓰레받기에 유리조각과 작은 휴지조각들을 담아 버리고, 차가운 여자를 창고 바닥에 뉘였다. 그리고 우지호는
"거울이나 사러 가자."
written by. F.L.
새벽 찬 바람에 꽁꽁 언 발이 시렸다. 너무 얼어서 감각조차 없어졌을 것만 같은 발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까 싶어 털장갑을 낀 제 손을 신발 위에 얹었다가,온기가 느껴질리 없는 발에 스스로가 너무 바보같아서 푸스스 웃음이 나왔다. 다시 손을 떼어서 잔뜩 웅크려 있는 제몸을 감쌌다. 차갑고, 차갑고, 차갑고도 날카로운 바람이 언제까지 저를 스쳐갈 참인지, 성규는 핸드폰을 열어 해가 뜨기까지 몇 시간이나 남았는지를 반복해서 찾았다. 모든 건 애초부터 국토대장정이니 뭐니, 아무 대책도 없이 산골로 찾아온 제 탓이었다.
"사람 안 사는 집인가... 깨끗한데."
하긴, 애초에 이렇게 깊은 산골에 이렇게 예쁜 집이, 그것도 딱 한 채만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했다. 그럼 돈 많은 사람 별장인가, 그래도 꼭 사람이 사는 것 처럼 생겼는데... 생각하던 성규가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키가 큰, 까만 머리의 사람이.
집으로 다가오던 지호가 제 집 문 앞의 인영을 보고 놀라 멈춰섰다. 누군가가 찾아올 일도 없을 뿐더러, 찾아와서는 안 될 집이었다. 냄새는 분명히 인간이었다. 한참을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서 인간을 지켜보던 지호가 조심스레 집 앞으로 다가섰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집 앞에 있는 건 사람이었다. 저를 쳐다보는 남자의 의아한 표정을 느낀 성규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혹시 집주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그러니까 혹시... 하룻밤만 재워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여행 다니고 있는데.. 잘 데가 없어서.."
모르는 인간을 집에 들인다는 데 대한 걱정이 한 순간 머리를 스쳐갔지만, 그래도 지호는 그 사람을 집에 들이기로 했다. 아무래도 밤바람은 너무 찼다.
들어오세요. 지호가 무미건조하게 말을 건네곤 성규를 지나쳐 가 도어락을 풀었다.그러고 나서, 지호는 문을 잡아주는 식의 호의도 보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버렸다. 순식간에 혼자 남게 된 성규가 당혹감에 젖어 그대로 서 있다가, 곧 닫히는 문에 도어락이 잠길까 재빨리 문을 열어젖혔다. 문을 너무 세게 열었던지 집으로 들어가려던 지호가 뒤를 돌아봤고, 마주친 눈에 성규가 어색하게 웃어보였다.
"저쪽 방에 남는 침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엌 옆의 작은 방을 가리킨 지호가 곧 시선을 거뒀다. 재효가 가끔 찾아올 때를 대비해 침구를 갖춰 놓은 방이었다.
말 수가 적은 사람이네, 하고 성규가 생각했다. 집 분위기는 그 남자의 무심한 표정만큼이나 차가웠지만,바깥처럼 찬 바람이 불지는 않는다는 데 만족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침대 옆의 조그만 탁자를 제외하면, 가구 하나 없는 방의 단색 벽지와 새하얀 침대가 그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혼자 여행을 다니며 이곳 저곳 웬만한 눈칫밥은 다 먹어봤다고 생각한 성규였지만, 이렇게 외진 집에서 말 수도 적어보이는 남자 한 명과 함께하는 얼음장같은 아침 식사는 도저히버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재빠르게 짐을 챙겼다. 을씨년스러운 집 분위기에 무서움에 떠느라 잠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성규는 제게 베풀어 준 호의가 감사해 그 남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 마디 정도는 전하고 싶었다. 짐가방을 둘러맨 성규는 그 남자의 방문 앞에 서서 단정하게 노크한 후 숨을 골랐다. 잠시간 인기척을 기다리던 성규는 꼭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께 불려간 아이마냥 긴장되는 마음에, 눈을 꼭 감고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조심스레 밀어젖힌 문 안쪽에는, 어제의 그 남자가 조용히 누워있었다.
"저기요.."
"저기요?"
아직 이른 아침이라 일어나지 않은 건지 움직이지 않는 남자에게 성규가 가까이 다가갔다. 처음엔 깨우던가, 정 안 되면 메모라도 하나 써놓고 나가야지, 하는 생각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남자는 점점 더 이상해보였다. 얼굴이 조금 빨간 것도 같고... 숨이 좀 거친 것도 같고...
혹시 이 사람, 아픈 거 아냐?
조금씩 고개를 드는 생각에 남자의 이마에 손을 얹은 성규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마가 지나치게 뜨거워서 손이 델 것만 같았다. 성규가 빠르게 침대 옆의 자그마한 스탠드 아래에 놓여있는 까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 남자의 핸드폰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거야 어쨋건 상관 없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는 딱 두 개였다. 딱딱하게 세 글자, 이름만으로 저장된 전화번호부가 집 분위기처럼 차가웠다.
안재효, 우지석
우지석이라는 이름을 먼저 눌러봤지만, 마음대로 숫자를 눌러 저장한 것처럼 번호가 너무 이상해서, 안재효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했다. 통화연결음이 다섯 번이나 울리고 난 후에야 안재효라는 사람은 전화를 받았다.
"웬 일로 우지호가 전화를 다 해?"
"저기요..."
"....네? 누구세요?"
"아니 저, 제가 이 핸드폰 주인 분 집에 하루 묵게 됐는데,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 네, 네!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성규가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재효가 전화를 끊었다. 어쩔 수 없네, 메모라도 남기고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방에서 메모지와 볼펜 한 개를 꺼낸 성규가 최대한 정갈한 글씨로 글을 써내려갔다. 어젯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인사라도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곤히 주무셔서 차마 깨우지도 못하고 갑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메모지를 떼어 스탠드 밑에 붙이려던 성규가 허리를 숙이자 그 남자의 벌건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고, 잠시 고민하던 성규는 이내 주먹을 쥐어 메모지를 구겨버렸다.
아무래도, 좀... 직접 전하는 게 낫겠지?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