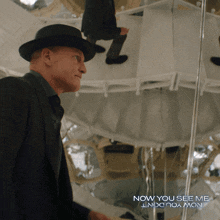톡, 톡. 빗방울이 이미 흠뻑 젖은 머리를 타고 떨어졌다.
슬슬 오한이 드는 걸 보니 오래도 서있었나보다.
내 부름을 뒤로 하고 등을 돌린 그 아이의 모습은 이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세훈아.
낮게 읊조린 그 이름에 괜시리 다시 눈 앞이 뿌옇게 변했다.
너에게 난,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뿌옇게 흐려진 시야가 답답해 눈을 다시 꾹 감았다.
톡, 톡. 빗방울의 소리가 다시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톡, 톡.
더러운 새끼. 저러고 살고 싶을까.
내 말이. 나 같으면 확 자살했겠다.
대놓고 킥킥대는 웃음이 귓가에 날아와 박혔지만 이미 수도 없이 내게 박혔던 화살들이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너덜너덜해진 나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말에는 개의치 않을 수 없었다.
친구들과 같이 씻고 온 거냐는 말에 옷에 베인 걸레 냄새가 더욱 심해지는 듯해 부릅뜨고 있던 눈이 파르르 떨렸다.
괴롭힘은 한순간일 줄로만 알았다.
그 생각이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했다.
발버둥을 쳤지만 그럴 수록 내 것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구겨진 날개마저 꺾이던 그날 도망가야겠단 생각조차 머리에 고여 썩어버렸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날 보는 눈 또한 바뀌었다.
좋아해.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내 귀가 잘못됐나 했고 마지막엔 이 지긋지긋한 환청 하며 귀를 틀어막았다.
그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다.
결국엔 받아들여야 했지만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 놓은 듯한 그 말은 이후에도 실감은 나지 않았다.
나도.
얼마만에 해 주는 대답인진 모르겠지만 족히 반년은 지난 것 같았다.
뜬금없는 나의 말에 순간 의아해하던 그 아이는 이내 답을 찾아내곤 지금까지 본 미소 중 제일 해사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날엔 비가 왔다.
그 아이는 비틀대는 날 꽉 잡고 한참을 걸었다.
한 쪽 팔만 축축해져 무겁기까지 해질 쯤 날 잡고 있던 온기가 사라지고 온 몸에 축축한 느낌이 감돌았다.
눈 앞에 까맣던 세상을 천천히 펼쳐보니 그 아이의 뒷모습만이 내 눈을 가득 채웠다.
처음으로 암흑 뿐이던 세계가 그리워졌다.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