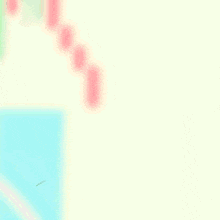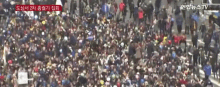마지막 달
우린, 달빛 아래에서 만나
달빛 아래에서 끝을 맺었다.
***
연한 먹색 벽지 위로 달빛이 내려 앉아 조각조각 흩어진다.
그 덕분에 먹색 벽지가 달빛으로 물들었다.
달빛은, 방안의 사물을 모두 찬란한 색으로 물들여 놓았다.
내 앞에 있는 백현도 예외는 아니었다.
백현은 이순간 달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려는 것 처럼.
"……"
"종인아."
적막을 깬건, 백현이의 무거운 목소리였다.
백현이의 목소리가 허공을 돌아다니다 다시 가라앉았다.
"…나."
"……"
"있잖아, 나…."
"……"
말줄임표 뒤에 무슨 말이 이어질지 알것 같아서,
왠지 그 말을 들으면 안됄것 같아서,
그리고 너가 말하려는 단어들이 입 밖으로 나오면 사그라질것 같아서.
그냥 그랬다.
백현이의 움직이려는 입술 위에 내 입술을 급하게 겹쳤다.
백현이의 가느다란 속눈썹이 떨리는게 느껴져
어쩐지 혀놀림을 멈칫하게 했다.
감았던 눈을 살짝 떠보니 너의 속눈썹 사이사이 공간으로 달빛이 스며든다.
달빛은 백현의 눈과 콧등 콧망울을 따라 입술에 내려앉아
우리 둘 사이를 채워고 있었다.
고요한 가운데 두 입술이 이어지는 소리만 흘렀다.
내가 특히 좋아했던 너의 바이올린 소리처럼.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다가
백현이의 발게진 볼을 쓰다듬으며 입술을 땠다.
예의 그 물기 머금은 눈이, 나를 쳐다본다.
"…종인아."
"……"
"우리 이렇게."
"……"
"우리 이렇게 그냥……."
백현이의 이어지는 물기 어린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 입술을 때는 순간,
깊은 나락에 아득히 묻혀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선을 나누었던 날. 2년전 그 날도 달이 이 세계의 것이 아닌것처럼 존재했다.
***
그 날, 여느때와 같이 칙칙한 공기로 가득 차있는 연습실에서 악기를 마무리 손질하고 있었다.
나는 그 무겁게 머리 위를 짓누르는 듯한 분위를 사랑했다. 활과 송진이 마찰하는 기이한 소리,
어찌 들으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만으로도 작은 연습실은 크게 울리며 채워져 갔다.
작은 연습실을 채우는데 도움을 주는 또다른 것은, 큰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었다. 달빛은
종인이 손끝에서 나는 소리와 더불어 방 안을 채워갔다.
시계의 덜 긴 바늘이 숫자 11을 넘어서고 있는데,
철컹-
하며 낯선 쇳소리가 얹어졌다.
적막이 깨진 기분에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며, 고개를 들어 소리의 근원지를 쳐다보았다.
그 곳엔, 달이 있었다. 같은 공간 안에 두개의 달이 떠있는 느낌.
그만큼 희고, 밝았다. 더 이상의 표현은 할 수 없었고 한 어절의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예뻤다.
"……"
"…안녕하세요."
그 여리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는 백현의 손에 들려있던 바이올린의 음색을 닮아있었다.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같은건 믿지 않았지만, 마치 질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해 놓은것처럼 이끌렸다. 흑과 백의 조화는 언제나 잘 어울리듯
외양 뿐이지만서도 흰 너와 어두운 나는 썩 잘 어울렸다. 그건 외적인 것 뿐만이 아니었고
질긴 인연의 실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이어놓고 있었다. 우린 그걸, 첫 만남부터, 깨달았다.
달빛 아래에서.
넌 바이올린을 다뤘다. 난 비올라를 다뤘다.
바이올린은 비올라의 축소판이고 비올라는 바이올린의 확대판이라 했다. 그도 그럴것이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우는 소리도 똑 닮아있었다. 너와 나는 서로의 축소판과 확대판처럼
꼭 맞물려 돌아갔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서로가 서로의 음색을 더해주며
하나의 선율로 만들어 가듯이, 우리도 점점 하나의 소리로 합쳐져 같아져갔다.
피어남이 있으면 짐이 있고, 오르막길 후엔 언제나 내리막길이 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기나 긴 합주곡은, 2년 3개월하고 몇일 만에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린 언제나 그렇듯 서로를 잘 알았기에, 서로가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이 무대의 앵콜은 없을 것이란 것도.
"종인아."
"…응?"
"나 할말 있는데."
여느때와 같이 연습실의 공기는 미적지근했다.
"밤이 가고 이 달이 지면."
"……"
"달이 지면,"
"…응."
갑자기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응어리가 올라와 목구멍을 막았다.
한 음절을 말하는데에도 숨이 차 겨우 소리를 내었고.
"다시 해가 뜨겠지?"
"그러겠지."
"근데, 만약에 말야."
"……"
"해가 안 뜨면 어떡해?"
쭉 어둠이면, 어떡해? 습기찬 그 목소리에 목을 막고 있던 응어리는 목구멍 뿐만아니라
날 잠식해갔다. 백현이와 나의 달이 지면 나에겐, 아니 우리에겐
영원히 빛이 없을 것 같단 생각이 현실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현실이 되고 있었다.
현실이었다.
달이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고 생각했다. 우린.
***
기억의 파편들은 거기까지 맞물리다 닿아오는 백현에 의해 다시 바스라졌다.
백현은 내가 어떤 기억에 잠겨있는지 모두 아는듯이, 긴 손가락으로 소리없이 내 손을 잡아왔다.
마디 마디 얇은 그 손은 내게 말하고 있는듯 했다. 이제 그 시간이야. 손가락 끝이 약하게 떨렸다.
네 손가락 말단의 진동이 퍼지고 퍼져 나에게 까지 옮겨오는 듯 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
"난 너가 무슨 생각 하는지 다 알아."
"……"
"……다 알아."
젖은 눈을 한 채로 태연한 척 말을 거는 백현을 차마 볼 수 없었다.
"…백현아."
"……"
"……"
"…종인아. 나 너한테 할 말있는데."
"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야돼."
"…응."
"잘못 들어서도 안되고,"
"………"
"잊어서도 안돼. 약속해."
약속하라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미는 백현의 손 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맞걸고 눈을 마주쳤다. 백현의 눈꼬리엔
"종인아."
눈물방울이 아슬하게 걸쳐져 있었다. 어룽어룽 맺혀있는 물방울이 위태로웠다.
금방이라도 흘러 넘칠듯 하던 눈물은
얼마간의 정적 후,
"사랑해."
하는 목소리와 함께 굴러 떨어졌다. 그 한 어절의 말에는 백현이의 온전한 진심, 그리고 떨어진 눈물이 담겨있었다.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한마디가 내 마음 한 켠을 적셔갔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한 줄기 흐르는가 싶던 눈물은 두 방울, 세 방울 흘렀고
마음 한 구석을 적시는가 싶던 그 말들은 백현의 눈물과 함께 두 번, 세 번 스며들어갔다.
결국 백현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울음을 터뜨리고, 눈물의 양만큼 내 마음도……
"…나도."
이 두 글자의 말이 너와 나의 마음을 다 표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글자에 진심을 얹어놓는 것 뿐이었다.
어찌보면 평범한, 그러나 평범하지만은 않은 짧은 대화는 우리를 표현하기에 충분했을까.
이젠 내 손 끝이 진동하고 있었다.
흰 시트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내며 백현이 일어섰다. 백현은 아직도 울고 있었다.
"백현아."
"……"
"울지마."
마지막이니까. 이 말은 차마 내뱉지 못했다. 마지막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이라는걸 인정하는것 같아서.
백현은,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드러지는 달빛을 온전히 받아 빛났다. 나에게서 너 이외의 모든 빛을 앗아가려는 것처럼.
빛은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백현의 모든것을 감싸고 돌아 널 나의 달로 만들었다. 백현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내 흐린 눈가에 어른거리는게 달빛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백현이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너가 떠나는걸, 내 달이 지는걸 그저 바라만 보고있다.
끝이 정말 코 앞에 있었다. 합주곡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이젠 진짜 막을 내릴 때였다.
……백현은 아직도 울고 있었다.
"잘 있을게."
"……"
"잘 있어."
"……"
"…잘 있어야돼."
약속, 지킬게. 내 대답과 동시에 문이 열리고 백현이 점점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내 흐린 눈에 어른거리던건 눈물이었고, 달빛이었다.
문이 닫힘과 동시에 후두둑,
하고 쌓여있던 눈물이 떨어졌고,
우리의 달도 떨어졌다.
8월, 창 밖은 달이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끝끝내 동은 트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 달이었기에.
이 시리즈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모든 시리즈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현재글 [카백/EXO] 마지막 달 5
13년 전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와… 정국 자컨에서 내내 한 쪽 팔 가렸대
와… 정국 자컨에서 내내 한 쪽 팔 가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