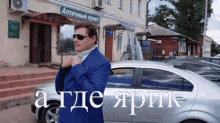-
"응, 여보세요"
"안자요?"
"나 자서 전화 안받으면 삐질거잖아요."
"어? 아닌데. 오늘은 재워주려고 전화한건데요?"
거짓말. 그쪽은 왜 부정부터 해요. 으아 내 쿠크다스.
크크 하고 낮게 키득거리는 소리가 방안에 깔렸다. 적당히 낮은 목소리가 귀를 감았다.
근데요, 맨날 이렇게 먼저 전화하고 그러면 안 귀찮아요? 그럼 그쪽은 나 귀찮아요? 아니요. 신기해요. 한마디 할때마다 나 정말 심장 떨어졌다가 막 기분좋아졌다가 그러는거 알아요? 나중에 이 기분 똑같이 느껴줬으면 좋겠네요.
치..아직은 모르겠네요.
투정부리듯 하는 말이 오히려 편안하게 들려와 조금 더 이불속으로 파고들었다. 커튼 사이로 푸른 밤하늘이 살짝 비쳤다.
그러니까 내 말은요...
감기약에 취해선지 목소리가 서서히 느려지고 멀어져만 갔다.
자요? 응..네..
잘자요. 그리고, 좋아해요
오늘도.
몇 번 알람이 울렸던 것도, 전화가 온 것도, 그리고 받아서 무어라 중얼거린 것도 같다. 밤에 기분좋게 잠에 빠져들었지만, 이미 한번 추위를 맛보았던 몸은 그 여파를 그대로 드러냈다. 입에선 연신 가쁜 숨이 나오고, 그 내뱉는 숨마저도 따가웠다. 차가운 것이 몸을 살짝 건드려 그 아찔함에 순간 머리가 아팠다. 무언가가 부드럽게 쓰다듬어 어린아이를 재우듯 토닥여왔다. 부들부들 떨리던 몸이 서서히 힘을 빼고, 찡그리던 미간이 편해졌다. 얼굴에 무언가 스쳐간 듯 했다.
눈을 뜨고 상체를 일으켰을 때 보이는 것은 막 나갔다 들어온 듯한 그의 모습이었다.
"일어났어요? 어제 쉴 것을 괜히 전화했나보네요."
"아니요.아니에요."
"아 목소리봐. 다른사람인데?"
서늘한 손이 다시 이마를 짚으면서,따듯한 물이 담긴 컵을 건네왔다. 사이드 테이블에 몸을 닦아 낸 듯한 수건이 있었다. 빤히 쳐다보자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윗옷만 갈아입힌거에요. 열 내려야 되니까."
"난 아무말도 안했어요."
"..내가 오늘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 "
말없이 웃곤 다시 물로 입을 축였다. 까끌한 입이 물도 텁텁하다 느끼게 했다.
"아침에 혹시나 해서 전화했더니, 뭐라고하는지 말은 잘 안들리는데 쌕쌕이는 소리만 크고."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젖은 머리칼을 이리저리 넘겨 정리해준다. 새삼 그 다정함이 크게 느껴져 속이 다시금 답답해져왔다.
작은 컵에 가져와 금새 다 마신 빈 물컵을 받아들곤 그가 물어왔다.
"배 안고파요? 죽 먹을래요? 지금 내가 안주면 또 안 먹을 것 같아. 그니까 그냥 먹어요."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는 그를 꼭 끌어안았다. 등에 얼굴을 묻자 귓가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심장소리가 그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내가 잡아온 손 위로 그의 손이 겹쳐졌다. 한참을 그렇게 등뒤에 붙어있다 그가 손을 들어 살짝 떼어내곤, 살짝 고개를 돌렸다. 여느 때완 다르게 맞춰주지 않는 눈에 내심 섭섭하다고도 느꼈다. 그리곤 그 생각에 내 자신도 놀랐다.
"당신때문에 맨날 떨려. 사귀기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
"항상 예측할 수 없어서 무서운 거 알아요?"
저번에 말했듯, 딱히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고 간결히 말해도 전해져 오는 그 진심에 덩달아 조금씩 떨려왔다.
손을 깍지 껴서 한번 꼭 잡았다 풀러졌다. 그와는 반대로, 미묘한 감정은 풀어졌다 조여오기 시작했다. 한 치의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서서히.
"죽 가져올게요."
몸을 돌려 살며시 안아주곤 그가 부엌이랄 것 없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울컥 무언가가 차올랐다. 알 수 없는 감정에 숨을 죽여 몸부림쳤다. 입술을 꼭 깨물고 참았지만, 그 새로 조금씩 새어나갔다.
"왜 또 울어요."
"윽..으..흐으.."
그 손길에 다시 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풀어져나갔다. 쟁반을 내려놓고 꼭 안아오는 어깨에 기대 한껏 답답함을 뱉어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 앞에 다시 비가 내렸다. 무지개 우산에 떨어져 반사된 물방울이 머릿속을 쥐어잡아왔다. 그리고 거기에 겁이나 무언가를 끌어안았을 때 조용히 덮어오는 따뜻함과 함께 비가 그치고 그 까만 하늘이 조금씩 바뀌어갔다. 큰 벽에 한껏 말라 비틀어졌을지도 모르는 내 감정을 토로했다.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요."
다시금 어깨를 잡은 그가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실컷 울고 난 후라 부어있을 눈에 고개를 숙였다. 말라가기 시작하는 눈가를 조심스레 만져오는 손이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 잠자코 있었다. 되려 꼭 껴안아 코를 묻고 부비적거렸다.
"다 울었어요?"
죽 다 식었겠다. 냄비 안에 있는 따뜻한걸로 바꿔올게요. 뒤돌았다고 또 울지 마요.
죽을 다 먹을 때 까지 옆에 앉아 지켜보던 그가 약까지 다 먹인 후에 날 침대에 도로 뉘이곤 옆에서 조곤조곤 말을 걸어왔다. 며칠간을 잠만 자고 보낸 것 같아 더 잠들고 싶진 않았다.
"되게 이러고 있으니까 애같은거 알아요? 딱 애기들 자기 전에."
"뭐에요 그게"
"그냥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니깐."
작게 웃고는 깍지를 껴 맞잡은 손을 꼼지락거렸다. 처음에 차갑다고 생각했던 손이 기분좋은 서늘함으로 다가왔다.
"근데 그쪽은 왜 맨날 나 재우려고 해요"
"그럼 아픈데 자야죠.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야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맨날 자기전에 전화하고.. 난 맨날 통화하다 자고."
"그게 어때서요. 귀엽잖아."
으 오글오글. 어디서 맨날 느끼한말만 주워들어와가지곤. 나 느끼해요? 아닌데? 나 안느끼해요. 충분히 오글거려요.
손을 꽉 쥐어 온몸으로 오글거림을 막 표현하다가 이불이 내려가자 다시 끌어올려준다.
"근데요, 진짜 안들어올거에요?"
"맨날 그소리야. 진짜"
"그냥 그렇잖아요. 나 맨날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몰라요."
"물어볼때마다 모른대."
스탠드 불빛이 은은하게 깔리고, 위에 더해진 목소리가 잠의 나락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져 깜빡이는 속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익숙한 한마디가 들렸다.
잘자요.
"그쪽은 일 안해요?"
"나 일하다 나온건데요?"
"빨리 들어가요. 하다가 막 나오면 어떡해요."
"우와, 애인을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거에요?"
밉지않게 살짝 흘기자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여왔다. 항상 능글맞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얄미워 손을 살짝 꼬집어주자 막 대한다며 입술을 쭈욱 내밀었다. 한손에 커피를 쥐어주곤 닿아오는 손을 빼지 않고 멈춰섰다.
"이따 봐요. 안녕!"
그가 가자마자 매니저 형님이 말을 걸어왔다. 이녀석이 요 근래 이상해졌다 했더니. 뭐야. 아형 깜짝이야!
무의식적으로 형님의 등짝을 내려치자 나 죽는다며 등을 배배 꼬았다. 잔뜩 심통난 눈으로 째려보나 싶더니 결국 내내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해댔다.
아 형 제발. 미안해요.
'어디에요?'
'작업실이요.'
'무슨일 하는지는 진짜 안알려줄거에요?'
'들어오면!'
'나빠. 언제끝나요?'
'내가 만족할때요'
'....'
'힌트에요!'
'나 알바 끝나고 같이 밥먹을래요? 오늘은 삼겹살!'
문자를 보내기가 무섭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나 이거 평생 저장감인거 알죠?"
"으잇, 그게 왜요!"
"그쪽 나한테 처음으로 그렇게 말 한거 알아요?"
으아 맨날 오그라드는 소리만 해!
-
저저번편에 신알신 오류났었나요.......어제 알았어요ㅋㅋㅋㅋ
그나저나 글이 안써지네요.. 진짜 글이랑 권태긴가봐요. 엉엉어어엉ㅇ엉엉엉엉TAT 맨날 짧아서 미안해요.
우와.. 눈이 정말 옆에서 내리는 것 같아요. 바람이 아주그냥.. 급하게 추워졌네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강친님 크림님 망가리님 마가레뜨님 순대친구님 헬리님 쌀알님 미네랄님 그리고 덧글주신 독자님들
사..사...좋아해요♥
아직 시리즈가 없어요
최신 글
위/아래글
공지사항
없음


 인스티즈앱
인스티즈앱  모택 3까지 나온 마당에 이나은은 진짜 불쌍하다
모택 3까지 나온 마당에 이나은은 진짜 불쌍하다